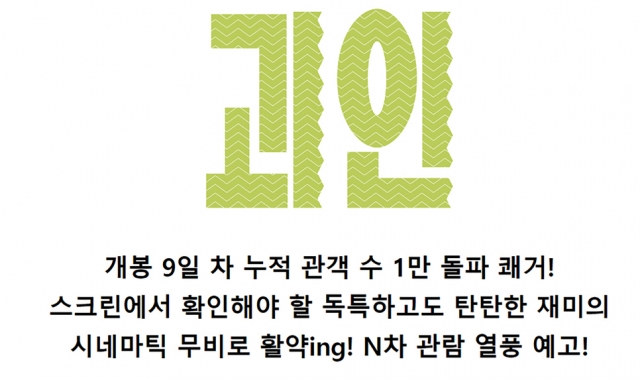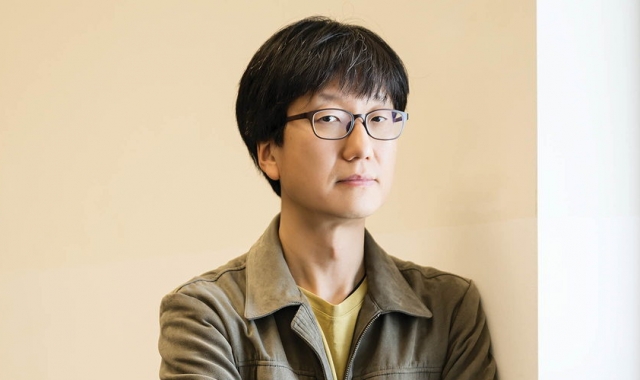요즘 열심히 보는 TV프로그램이 두개 있다. <거침없이 하이킥>과 <하얀거탑>. 두 프로가 다루는 세계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권력을 둘러싼 다툼을 하나는 가족코미디로, 다른 하나는 정치드라마로 풀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엉뚱한 상상을 할 때도 있다. <거침없이 하이킥>의 서민정 선생이 <하얀거탑>의 병원에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 같은. 서민정 선생이 장준혁 교수 앞에서 토끼옷 코스프레를 하고 이렇게 외친다. “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저 닳고 닳은 여자란 말이에요.” 아마 장준혁 교수는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반응하겠지. “서민정 선생은 당장 뇌수술이 필요한 환자이니 빨리 입원조치를 하죠.” 반대로 <하얀거탑>의 장준혁 교수를 <거침없이 하이킥>의 이순재 한방병원에 모시고 오면 어떨까. 장준혁 교수가 힘주어 말할 때마다 해미가 “오~케이, 거기까지”라고 말을 자르거나 이순재가 장준혁 교수한테 “내가 발로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라고 면박을 줄 것이다. 두 프로가 그리는 권력다툼의 양상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어느 한쪽만 현실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말하자면 <거침없이 하이킥>과 <하얀거탑>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두 얼굴, 지킬과 하이드다.
밖에서 보기에 <씨네21>의 모습이 <하얀거탑>의 세계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내부에서 보면 <거침없이 하이킥>에 가깝다. 나만 빼고 놀았다면 섭섭해하고 누구만 예뻐한다고 토라지는가 하면 왜 나만 매주 기획기사를 써야 하냐며 투덜거린다. 편집장이 되겠노라 경쟁하고 계파를 만들어 세를 과시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거꾸로, 떠밀려서 책임지는 일을 맡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작 우리 자신은 그러면서 영화계는 <하얀거탑>의 세계가 아닐까 상상하며 온갖 음모론과 파워게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그게 언론의 속성이긴 하다. 아마 <하얀거탑>의 언어를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곳은 신문 정치면일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면 <하얀거탑> 세트에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찍고 계신다는 느낌이 든다. 언론들이 그걸 다시 <하얀거탑>의 언어로 되받아치는 하이코미디가 연일 반복된다. <하얀거탑>인 줄 알았는데 <거침없이 하이킥>이거나, <거침없이 하이킥>인 줄 알았는데 <하얀거탑>인 세상의 양면성은 늘 우리를 혼란에 빠트린다. 그래도 <거침없이 하이킥>과 <하얀거탑>이 절대 불가침으로 나눠지던 시절보다 낫긴 하다. 정치든, 문화든 <하얀거탑>의 언어만 쓰도록 강요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다.
택하라면 나는 <거침없이 하이킥>의 세상에 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될 리가 없다. 싫어도 <하얀거탑>의 질서에 함께 속하게 마련이다. 언제나 둘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은 만만치 않다. <씨네21>을 만들면서도 이런 균형이 흔들릴까 고심하는 일이 많다. <씨네21> 편집차장인 이성욱 기자는 나의 이런 불안을 해결해주곤 했다. 내가 엉뚱한 데서 <거침없이 하이킥>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옆구리를 찔러주었고, <하얀거탑>의 언어를 남발할 때면 기꺼이 <거침없이 하이킥>의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오랫동안 <씨네21>의 균형을 조절해줬고 통찰력이 돋보이는 글로 독자들을 즐겁게 했던 그가 <씨네21>을 떠난다(이번호 오픈칼럼에 고별사를 썼다. <이성욱의 현장기행>도 도중하차하게 됐는데 당분간 공백이 있겠지만 곧 김현정 기자가 이어받기로 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했기에 더욱 아쉽고 안타깝지만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는 때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가 <씨네21> 밖에서 원하는 것을 얻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