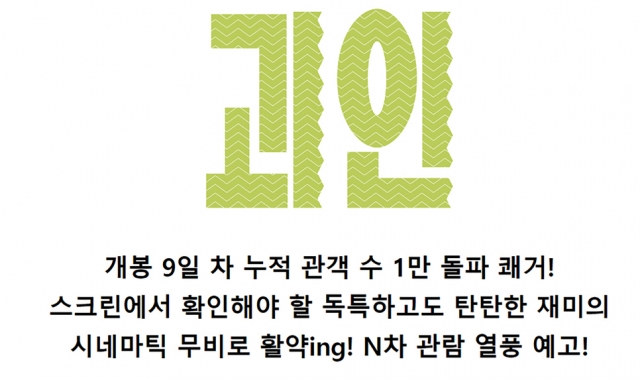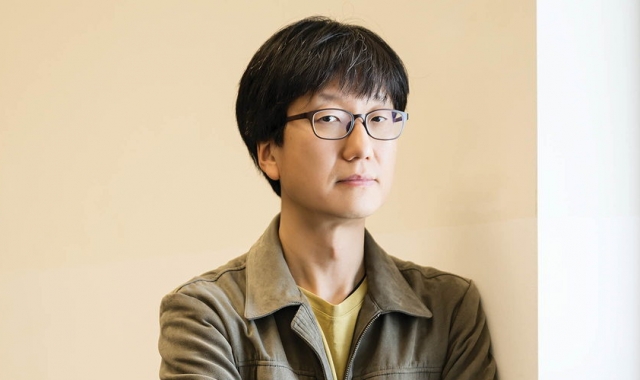이라크 전쟁은 현재진행형인 방 안의 코끼리다. 누구도 이라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주 봐서 지겨운데다 속시원한 해결방안도 없어서 골치 아프기 때문이다. 할리우드도 이라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관객이 찾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브라이언 드 팔마의 <리댁티드>, 폴 해기스의 <엘라의 계곡> 같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흥행에 참패했다. 이런 와중에 캐스린 비글로는 어쩌자고 <허트 로커>를 만들었나. 솔직히 말해 캐스린 비글로라는 이름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은 거의 없다. <니어 다크>(1987), <폭풍 속으로>(1991), <스트레인지 데이즈>(1995)를 통해 드문 여성 액션영화 감독으로 활약하던 그녀의 경력은 잠수함 블록버스터 <K-19>(2002)의 실패로 완전히 끝났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비글로는 재기에 성공했다. <허트 로커>는 비글로의 최대 걸작인 동시에 이라크전을 다룬 가장 훌륭한 상업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은 이라크 참전 중인 미군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탄제거팀) 팀원들이다. EOD는 세명의 군인으로 한팀이 구성된다. 폭탄 제거 기술을 지닌 하사관 팀장, 그리고 현장을 감독하고 사수하는 두명의 병사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샌본 병장(앤서니 매키)과 오언 상병(브라이언 제러티)은 폭탄을 제거하려던 팀장(가이 피어스)를 잃는다. 새롭게 이라크에 도착한 팀장 윌리엄 하사(제레미 레네)는 어딘가 좀 골치 아픈 인물이다. 과묵한 윌리엄은 위험한 폭탄을 제거하는 일에서 아드레날린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샌본과 오언은 윌리엄의 미치광이 같은 직업정신 때문에 언젠가 모두가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캐스린 비글로에게는 이라크전이라는 코끼리의 다리를 제대로 묘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다. 덕분에 <허트 로커>는 쓸모없는 정치적 자의식 없이 간결하고 분명하게 지금 이라크의 현재를 보여준다. 병사들은 영웅도 아니고 양민을 학살하는 얼굴 하얀 괴물도 아니다. 직업군인인 그들에게 이라크는 위험하지만 보수도 좋고 직업적인 성취도도 있는 출장지다. 하지만 매일매일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조금씩 뒤틀리고 지쳐간다. 비글로는 그들의 내면을 독백하기보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라크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건 돌려 말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대면하기에 가깝다.
물론 <허트 로커>는 비범한 액션영화이기도 하다. 영화는 로버트 하인라인 소설에 등장할 법한 강화 슈트를 입은 주인공이 다양한 폭탄을 제거하는 시퀀스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글로는 <블랙 호크 다운>의 리들리 스콧처럼 과도한 비주얼과 편집의 미학적 난동없이 조용하고 우아하게 서스펜스를 조율한다(<플라이트 93>의 천재적 촬영감독 배리 애크로이드의 공로 역시 잊어서는 안된다). 영화의 백미는 이라크와 미군 저격수들이 광활한 사막에서 망원경으로 서로를 조준하며 벌이는 총격전이다. 비글로는 속도가 아니라 총알이 날아드는 순간들 사이의 고요한 서스펜스로 관객의 심장을 움켜쥔다. 이런 말이 정치적으로 불공정하게 들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캐스린 비글로의 여성성은 분명히 <허트 로커>의 심장이다.
TIP/ 솔직히 말해보자.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 몇몇은 이미 어둠의 경로로 이 영화를 봤다. 절대 비난 안 한다. 왜냐하면 당신들 모두 <허트 로커>가 반드시 커다란 스크린으로 재감상해야 하는 영화라는 사실에 동의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