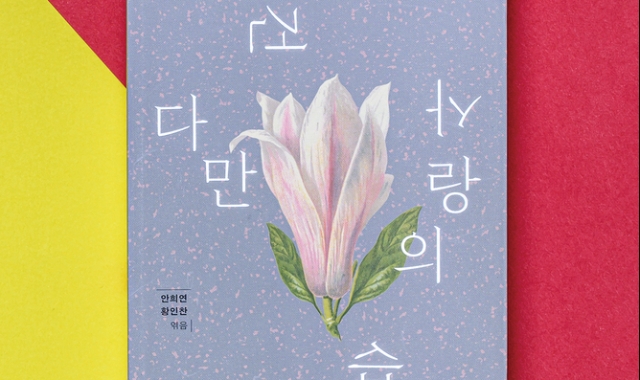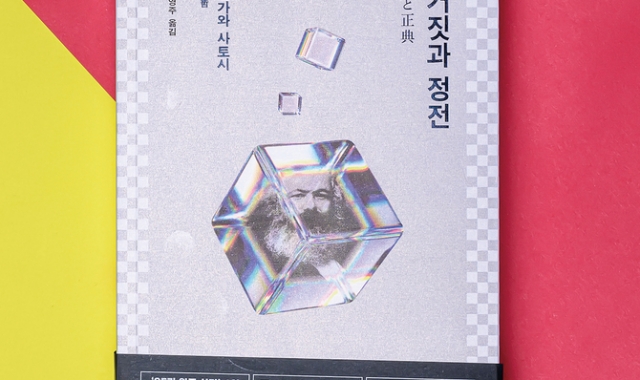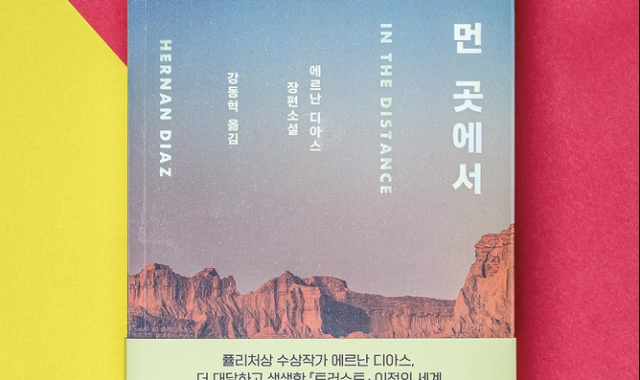1994년, 영화학도 세명이 메릴랜드주 버키츠빌 근처 숲에서 숲속 마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던 중 실종된다. 1년 후 그곳에서 그들이 촬영한 필름이 발견되고 유가족들에게 돌아간 필름은 영화화된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블레어 윗치>(1999)는 영리한 마케팅으로 흥행에 성공한 호러영화다. 이후 제작된 저예산 호러영화에 숱한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한 혁신적인 작품이었다. 2016년에 만들어진 <블레어 위치>는 죽은 영화학도 중 한명인 헤더의 동생 제임스(제임스 앨런 매퀸)가 당시 필름에서 “생존해 있는 누나의 모습을 본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한다. 어쩌면 헤더가 살아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제임스와 친구들은 버키츠빌로 떠난다. 전작 <블레어 윗치>와 마찬가지로 일행의 조난과 부상, 사위를 짐작할 수 없는 어두운 숲과 빼곡한 나무들, 영문 모를 괴성과 텐트 밖에 걸린 목각인형 등을 사용해 공포감을 조성한다. 제임스 일행이 사용하는 장비들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미니캠, 드론 등으로 다양해졌다. 모두 꽤 효과적인 장치들이지만 장비가 선진화됐다고 해서 영화가 더 흥미로워진 것은 아니다. 적당한 공포를 이끌어내기는 하지만 전작 포맷의 답습으로 인해 대개의 상황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상황을 기록하는 데 있어 비디오테이프보다 미니캠과 드론이 딱히 낫지도 않다. 호러영화 속 클리셰를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데도 별다른 고민이 엿보이지 않아 연출이 안일하다는 인상을 준다. 전작 <블레어 윗치>를 보지 않은 관객이라면 영화를 한층 무섭게 느낄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