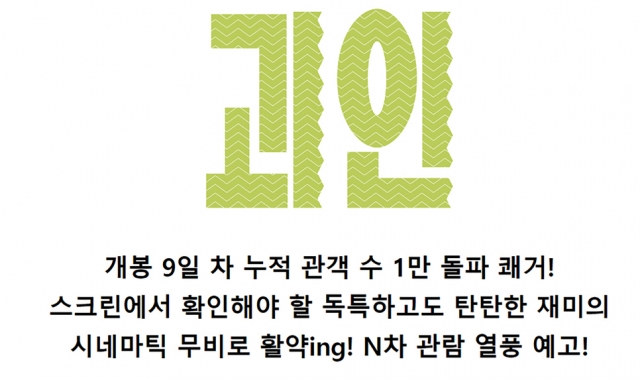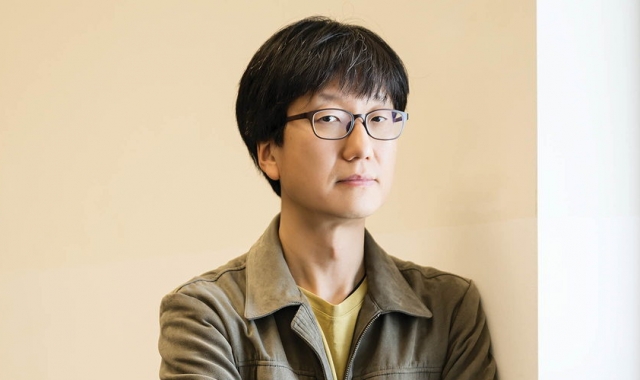인터넷에서 “원수한테라도 생리대는 빌려준다”는 말을 보았다. 생리대 무상배포 정책으로 설왕설래가 있던 중, 여성 동지에게 생리대를 안 빌려주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맥락이었다.
저 문장을 보고 떠오른 일이 있다. 나는 고등학생 때 집단따돌림을 당했었다. 따돌림을 당하면 교실이라는 공간을 시선과 거리를 중심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간단한 예로, 나는 맨 뒷자리나 맨 앞자리를 절대적으로 선호했다. 맨 뒷자리는 뒷문으로 들어가 바로 자기 자리에 앉으면 되어 부담이 적다. 맨 앞자리는 뒤에서 누가 나에 대한 말을 해도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잘 들리지 않으며, 정면의 선생님과 칠판만 보면 되어 시선 처리가 수월하다. 양쪽 다, 자기 얘기를 하니 내가 째려봤다느니 하는 뒷말을 들을 위험도 적다. 우리 반은 매달 자리를 바꿨는데, 나는 맨 앞줄이나 맨 뒷줄을 사수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
생리대 얘기로 돌아가, 여학생 반에는 “생리대 있는 사람 나 하나만 빌려줘”라고 말하는 학생도 심심찮게 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가 맨 뒤에 앉아 있던 줄 앞에서부터 시작해 좌우로 “생리대 있어?”를 물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가방에 손을 넣어 생리대를 찾았다. 내 앞까지 아무도 여분 생리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 친구는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게도 생리대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다음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그 친구에게 생리대를 빌려주었겠지. 가방 속을 더듬어 생리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혹시 나한테도 물어보면 바로 빌려줘야지 하고 꼭 쥐고 있었던 데까지만 생각이 난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걔가 나한테도 생리대가 있는지 물어봐줘서 너무 고마웠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생리대를 빌린 것도 아니고 남한테 빌려준 일을 기뻐하는 내가 가엾어 나중에 많이 우셨다고 한다. 사실 나는 어머니에게 이 일을 말한 기억도 없다.
그러나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교실에서 내가 사람으로 인지된 드문 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주던, 인공호흡을 받은 것 같던 안도감만은 지금까지도 선명하다. 누가 인사라도 하면 나도 인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집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몇 시간을 울던 때였다. 무엇이든 고마웠고 무엇에든 안도했다. 그러니 심지어 생리대를 빌려달라는 ‘콘텐츠’까지 있는 말을 들었다면, 그날 나는 분명 무척 기뻐하고, 안도하고, 아마 다른 날보다 조금 더 행복했을 것이고, 귀가해서는 오늘은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노라고 어머니에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앉은 줄에서 생리대를 찾던 학생1과 원수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혹은 그때의 나에게는 ‘사이’라는 말을 붙일 만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원수 사이라도 생리대는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보면, 어쩐지 그때의 그 중형 생리대의 비닐 포장과 손등에 쓸리던 가방 안감의 감촉이, 그리고 교실 맨 뒷줄에 앉아 저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이 나를 그냥 지나칠까봐 초조해하는 열여섯살 여자아이의 모습이 마치 남 일처럼, 그래도 충분히 선명하게, 떠오르고야 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