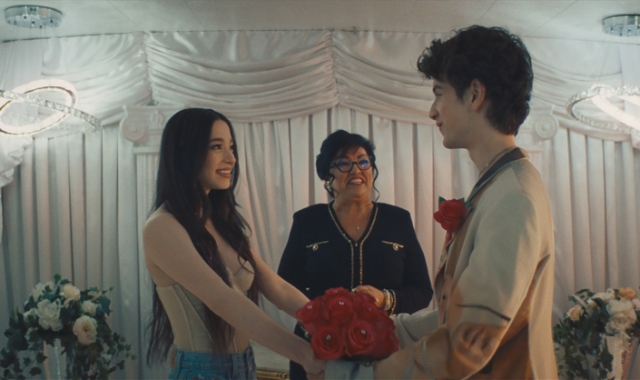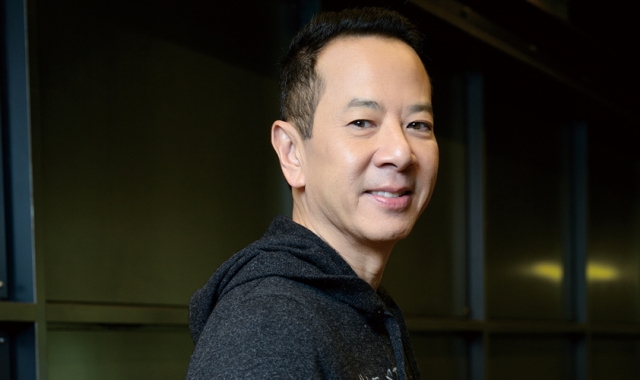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8개 부문을 수상했고, 오스카 시각효과상까지 거머쥔 <고질라 마이너스 원>은 결국 국내 극장에 걸리지 못했다. 물론 이는 괴수물이 꾸준히 국내 관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몬스터버스의 다섯 번째 영화 <고질라X콩: 뉴 엠파이어>는 북미에서의 성공과 달리 국내에선 51만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다. 앞선 세편의 몬스터버스 고질라 영화도 100만 관객 동원에 실패했다. 2016년 개봉 당시 일본 흥행 2위를 기록한 <신 고질라>는 국내 관객 7592명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봉준호의 <괴물>이나 심형래의 <디 워>, 혹은 피터 잭슨의 <킹콩>처럼 흥행에 성공한 괴수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흥행이 하나의 현상처럼 여겨졌음을, 나아가 <고질라> 시리즈와 같은 전통적인 ‘거대 괴수물’의 흥행이 없다시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고질라 마이너스 원>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 시키시마가 가미카제 특공대원이었다는 지점은 영화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수입사가 수입을 망설일 지점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와 쾌감 사이

이러한 한국의 맥락과 관계없이 지난 10년 동안 쏟아져 나온 고질라 관련 콘텐츠의 양은 미국과 일본이 거대 괴수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음을 증명한다. 2014년 개러스 에드워즈의 <고질라>를 시작으로 5편의 영화와 한편의 드라마를 내놓은 몬스터버스는 작품의 퀄리티를 둘러싼 팬들의 갑론을박 속에서도 순항 중이며, 일본에서는 이에 화답하듯 안노 히데아키와 히구치 신지의 <신 고질라>를 내놓았다. 판권을 가진 도호는 공격적으로 고질라 콘텐츠를 쏟아내는 중이다. 국내에선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3부작 애니메이션이 제작됐고, 2021년에는 SF 장르로 방향을 잡은 TV 애니메이션 <고질라: 싱귤러 포인트>가 공개됐다. 그리고 <고질라>의 70주년 기념작인 <고질라 마이너스 원>이 개봉했다. 무수한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에서 이 영화의 위치는 어디일까?
우리는 여기서 혼다 이시로의 첫 <고지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쓰부라야 에이지의 특수촬영을 통해 완성된 1954년의 <고지라>는 원폭 자체로서 일본인 앞에 나타났다. 다만 그 트라우마를 직접적인 원폭의 재현으로는 마주할 수 없었기에 고지라의 ‘방사열선’으로 대체됐다. 서브컬처 비평가 우노 쓰네히로는 <모성의 디스토피아>에서 ‘고지라의 명제’라는 하나의 기능을, 허구만이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현실을 파악하는 기능을 <고지라>에 부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지라>를 바라본다면, ‘고지라’라는 캐릭터는 단순히 도쿄를 부수는 자연재해적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전쟁의 문제를 허구적으로 재현하는 기제다. 다만 바로 다음해 개봉한 <고지라의 역습>에서 고지라는 안기라스와 맞붙는다. 무수한 ‘vs’ 시리즈 속에서 자연(혹은 일본)의 수호자라는 포지션을 맡게 된다. 이같은 변화는 쇼와 ‘고지라’의 걸작 중 하나인 <고질라 대 헤도라>(1971)에서 공해괴수 헤도라와 맞붙으며 정점을 찍는다.
혼다 이시로의 첫 <고지라>, 그리고 헤이세이 ‘고지라’의 첫 영화였던 1984년작 <고지라> 이후 처음으로 다른 괴수 없이 고지라만 등장한 영화 <신 고질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84년작 <고지라>는 냉전 말기라는 시대를 고지라라는 소재에 녹여낸 다소 단순한 기획이었다면, “현실 대 허구”를 홍보 카피로 내세운 <신 고질라>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대한 반응이자 1954년 <고지라>가 드러낸 ‘고지라의 명제’라는 기능을 부여받은 두 번째 고지라 영화였다. 원전 멜트다운이라는 사건은 현실 자체로 재현되지 못한 채 고지라라는 허구의 형상으로 일본인 앞에 등장했다. 방사열선을 내뿜으며 도쿄를 초토화시키고 총리가 탄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고지라의 모습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원전사고 앞에서 우왕좌왕하던 당시 일본 관료제에 대한 허구적 재현일 따름이다. 화면에 가득한 텍스트와 끝없는 회의 장면, 그리고 고지라를 ‘가동중지’시키는 작전이 미군과 자위대의 협동작전으로 전개된다는 지점에서, 고지라라는 영화적 허구와 정치적 현실 사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고질라 마이너스 원>이 당도했다. 롤랜드 에머리히의 어처구니없는 괴작을 제외한다면 이 영화는 고질라가 다른 괴수와 싸우지 않는 네 번째 영화다. 이는 할리우드 몬스터버스가 프로레슬링을 방불케 하는 거대 괴수들의 격투를 보여주며 쇼와 고질라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과 차이를 둔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1946년이라는 시간 설정이다. 일본 <고지라> 시리즈 중 초대 <고지라>의 직접적 후속작을 표방했던 영화들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1954년이라는 배경 이전으로 내려간 영화는 없었다. 두 영화 모두 전후 미국의 비키니섬 핵실험을 고지라를 깨운 사건으로 지목한다. 다만 <고지라>가 핵실험의 여파로 일본 어선 ‘제5 후쿠류마루’가 피폭된 사건을 간접적으로만 다룬다면 <고질라 마이너스 원>은 1946년 7월 비키니섬에서 진행된 핵실험 ‘크로스로드 작전’을 직접 묘사한다. 이 묘사는 이례적이다. 그간의 <고지라> 시리즈에서 원폭의 직접적 묘사는 기피됐으며, 방사열선 장면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를 묘사했을지언정 버섯구름, 낙진, 폭풍, 검은 비와 같은 묘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고지라>를 필두로 한 일본 괴수물은 그것이 단일 괴수에 의한 일방적 도시 파괴이건 괴수들의 싸움으로 인한 파괴이건 그것을 다분히 양면적으로 바라본다. 한쪽에는 초대 <고지라>부터 이어진 공습과 원폭, 패전의 트라우마가,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파괴의 현장을 바라보며 감각되는 경외와 쾌감이 놓인다. <고질라 마이너스 원>에 부여된 ‘시각효과상 수상’의 성취는 그 양면성에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는 여전히 ‘고지라’라는 허구를 그려내지만 그 재현은 점차 현실에 가까워진다. <신 고질라>에서의 ‘현실’이 관료제였다면, 이 영화에서의 ‘현실’은 패전 직후 ‘제로 상태’의 일본이다. 전장에서 돌아온 시키시마 앞에 펼쳐진 파괴된 도쿄의 형상은 그 현실을 묘사한다.
‘더 현실적’이며 ‘더 허구적’인 과거로

밀레니엄 <고지라> 시리즈의 <고지라·모스라·킹기도라 대괴수 총공격>을 참고하여 포악함 그 자체인 고질라를 만들고자 했다는 야마자키 다카시 감독의 말은 제로 상태로 일본을 되돌리고자 하는 선언일까? 여기서 시키시마와 동료들, 전쟁 이후 퇴역한 군인들이 힘을 합쳐 고질라를 무찌른다는 이야기와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휴머니즘적 플롯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폭 공격을 거부한 특공대원 시키시마는 현실에선 실전 투입되지 못한 전투기 신덴을 타고 (죽음이 제거된) 자폭 공격에 성공한다. 원폭과 냉전, 그 위에 자리 잡은 관료제에 관한 영화였던 <고지라>는 이 영화에서 ‘더 현실적’이며 ‘더 허구적’인 과거로 되돌아간다. 다시 말해, <고질라 마이너스 원>은 70년 만에 시리즈의 시작점을 재방문한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여행이 으레 그러하듯 그 시작점은 과거와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