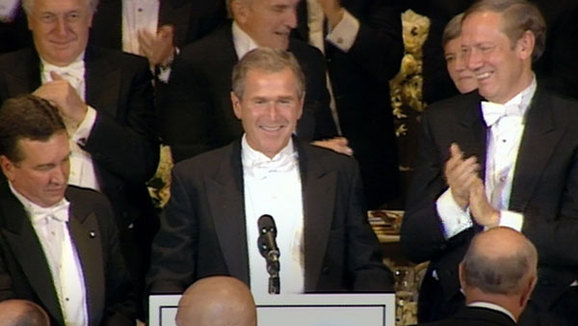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바뀌는 것인가. 법원은 31일 10·26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하라고 결정함으로써,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신청을 최초로 받아들였다. 앞서 실미도 북파 공작 훈련병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의 제작사를 상대로 냈던 똑같은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럼 기재된 광고문안을 삭제하라”고 했을 뿐, 영화의 특정 장면을 삭제하라는 결정은 하지 않았다.
최초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준’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떠받치는 논리는 정교하지 않고, 오히려 논리적 모순까지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재판부는 영화 <친구>를 패러디한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장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관객이라면, 블랙코미디 영화에서의 왜곡된 인물묘사를 그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장면을 왜 삭제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는 관객이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관객의 눈높이는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단되고 있다.
소송 제기된 장면 놔둔채 “다큐탓 사실 착각” 화살, 다큐삽입된 ‘JFK’등 해외영화 문제된 적 없어
특히 다큐멘터리 장면 삭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작 부분에 부마사태의 화면을 배치하고, 10·26사건이 극적으로 전개된 뒤, 다시 끝 부분에 장례식 다큐멘터리를 배치한 것은 마치 10·26사건의 실제 상황을 엿보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다큐멘터리→극영화→다큐멘터리’ 구조를 허용하면 관객들이 극영화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착각할 수 있으니, 앞뒤를 아예 들어 내라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관객들이 혼동할 수 있는 창작물과 실제 상황의 경계선은 오로지 ‘다큐멘터리’가 삽입되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셈이 된다.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다큐멘터리를 삽입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미국 할리우드의 경우, 올리버 스톤이 만든 영화 <닉슨>은 촬영이 끝난 뒤 닉슨 전 대통령이 숨지자 그의 장례식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추가해 개봉했고, 케네디 대통령을 소재로 한 <제이에프케이>나 <디데이13>은 실제 다큐멘터리 장면을 그대로 갖다 썼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법원이, 박지만씨 쪽의 가처분 신청 취지와 전혀 다른 대목을 문제 삼고 나선 것도 의외다. 박씨 쪽은 극영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성생활이나 ‘엔카’ 등 왜색 묘사를 문제 삼았을 뿐, 다큐멘터리 삭제는 청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큐멘터리가 ‘표적’이 된 것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박정희라는 정치적 쟁점을 끌어안고 고민하다 묘책이라고 찾아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극영화 내용에 직접 ‘칼’을 들이대 영화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론 정치권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일종의 ‘타협안’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발등에 떨어진 ‘뜨거운 감자’는 피했지만, ‘법원의 사전검열이 정당하냐’는 논란까지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영화계부터 “행정부가 하면 검열이고, 사법부가 하면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문의 논리에 동의할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