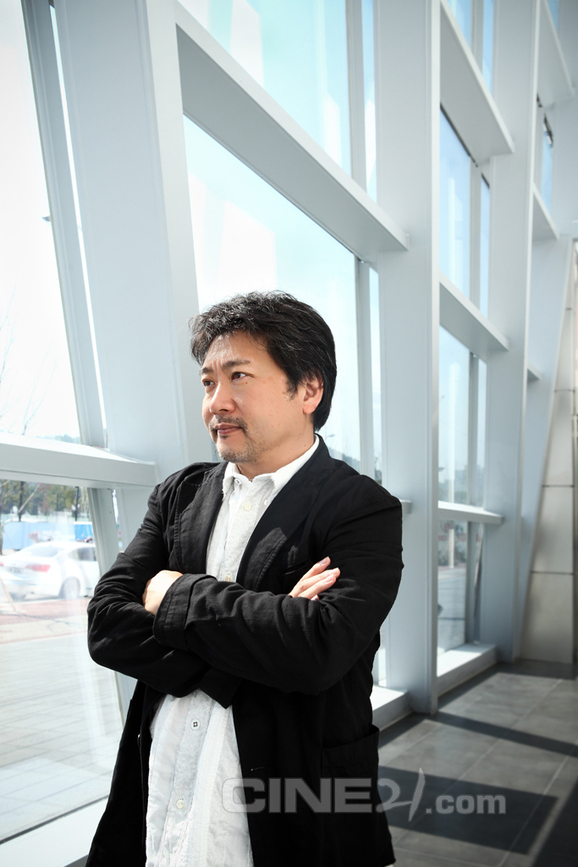
아이들의 세계는 수영복, 채소 씨앗, 거리에서 주운 동전, 체온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기적>은 아이들이 이러한 사소한 요소들로 채워진 세계를 깨닫는 성장영화다. <아무도 모른다>를 통해 어떤 비극에 놓여있든, 그 자체로 싱그러운 아이들의 세계를 그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기적>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잘 먹고 잘 자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적>의 모티브는 무엇이었나.
=원래는 <공기인형>을 끝낸 뒤 쉬고 싶었다.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했지만, 함께 했던 프로듀서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신칸센 쪽에서 기차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아무도 모른다> 이후 오랜만에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기차여행을 좋아했나?
=매우 좋아한다. 기타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는 동안 대부분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편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가 교차하는 순간의 에너지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상상도 경험에서 비롯된 거다. 기차에 타고 있으면 그 순간 ‘쿵’하고 소리가 나는데, 어른인 나에게도 충격의 강도가 상당히 셌다. 아이들은 얼마나 더 놀랄까 싶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았다.
-왜 가고시마를 이야기의 무대로 설정했나.
=처음 제안이 가고시마에 신칸센이 개통되니, 이걸 소재로 해달라는 거였다. 나에게는 증조할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다. 24살 때인가, 혼자 내 뿌리를 찾아보겠다며 처음으로 가고시마에 갔었다. 그때 ‘사쿠라지마’란 화산을 보고 정말 놀랐다. 화산재가 이렇게 날리는 데,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구나 싶더라. 영화의 첫 부분에서 형이 재를 청소하는 게 적응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게 있는데, 가고시마에 대한 내 첫인상을 담은 거다.
-아이들이 신칸센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들이 곧 모험을 시작할 것 같았다. 하지만 영화는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 동네 사람들이 사는 풍경을 넉넉하게 묘사한 후, 모험을 시작한다.
=생활의 모습을 중요하게 담은 건, 이 아이들이 돌아갈 장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그들 자신이 살아갈 장소로 선택한 곳이 된다. 말하자면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다. 나는 이야기가 끝나고, 인물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게 싫다. 관객과 함께 살아가는 인물들을 만들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진짜 기적은 뜻밖에 찾아오는 도움의 손길들인 것 같다. 모험의 위기인가 싶으면 다들 도와준다.
=내가 본 모험영화들은 대부분 비슷한 위기를 갖고 있었다. 나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뺏기고 어디에 갇히거나, 마법을 쓰는 할머니를 만난다던가. 그건 재미가 없었고, 일단 아이들을 돕는 어른이 있어야 할 텐데 누구일까를 생각했다.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면 도서관 사서나 양호선생님이 맞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그들은 성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학교의 틈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담임과 교감, 교장은 아이들과 수직관계에 있지만, 양호선생님은 아이들과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 사실 어렸을 때, 사서선생님과 양호선생님을 좋아한 적도 있다.(웃음)
-<걸어도 걸어도>를 보면서 영화 속의 음식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했다. <기적>에서는 당연히 ‘가루칸 떡’이 궁금하더라.
=그건 가고시마에 가면 할머니 집에 언제나 있는 과자였다. 진짜 맛이 밍밍해서 애들은 잘 먹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까 내가 24살 때 뿌리를 찾고자 가고시마를 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동네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다. (좌중 웃음) 그때 그 여자애가 준 선물이 가루칸 떡 세트였다. 결국 그 여자에게 차였는데, 그래서 언제나 그 떡은 쓴 음식으로 기억됐다. 20대 동안에는 그 떡을 먹을 때마다 그 여자를 생각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맛있게 먹는 편이다. 실연의 상처가 나아가나보다.(웃음)
-<공기인형>을 끝내고 쉬고 싶었다면, <기적>이 끝난 지금은 어떤가.
=안 쉴 거다. <기적>을 찍고 나니 기운이 남아도는 중이라 다음 작품을 준비 중이다. 아버지가 주인공인 가족의 이야기다. <걸어도 걸어도>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심술궂은 느낌이랄까? 그건 좀 비슷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