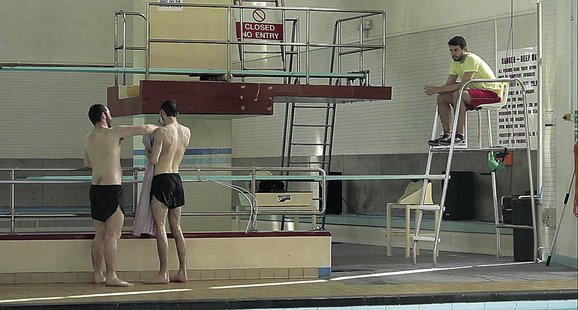

게이 시네마의 로맨스가 일반인에게 거리낌없이 받아들여지려면 <밀회>(1945) 정도의 작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몇년 전, 로우예의 <스프링 피버>를 보았다. 동양의 감수성으로 게이 시네마의 성지에 도착한 작품이 놀라웠다. 사랑과 절망과 망각이 봄비처럼 흘러내리는 영화였다. 이듬해쯤 알랭 기로디의 <도주왕>을 보았다. 기로디의 영화에는 항상 게이가 나오는데, 그가 묘사하는 게이의 생활은 평범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시간을 초월해 프랑스 전원의 삶을 즐긴다. 하긴 당연한 일이다. 그들을 별나게 대하는 스트레이트의 선입견이 이상하다면 이상한 거다. 그래서 질문했다. 왜 게이 시네마의 로맨스를 일반적인 로맨스와 비교하며 보는 걸까. 왜 게이 시네마가 정치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를 요구하는 걸까. <라잇 온 미>를 본 게이 커플에게 물었다. 오랜 관계를 유지한 두 주인공이 다소 특별할 뿐, 영화의 로맨스는 담담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특별함은 거기 있었다. 게이의 사랑을 과시하거나 대단한 말씀을 주장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캠피한 장난을 일삼는 것도 아니다. <추억>을 닮은 엔딩에서도 굳이 힘을 더하기보다 뺀 영화는 야박하리만큼 큰 표정을 짓지 않는다. 한 남자는 떠나고, 거리에 남은 남자도 이윽고 사라진다. 그 풍경이 별스럽지 않아 자연스럽게 이별의 정서를 받아들이게 된다. <위크엔드>도 일상의 풍경 속에 두 남자를 위치시키는 데 공을 들인 작품이다.
<라잇 온 미>가 단속적으로 9년 세월을 이어간 뉴욕의 두 남자를 다룬다면, 한해 먼저 나온 <위크엔드>의 두 노팅엄 남자는 금요일 밤에 만나 일요일 오전에 헤어진다(카렐 라이츠의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과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는 건 우연일까). <라잇 온 미>는 아서 러셀의 노래 <내 눈을 감아>와 <이렇게 달 위를 걷는 거야>로 시작하고 끝난다. 극을 오가는 두 노래는 1992년에 세상을 떠난 예술가의 성향을 반영함과 동시에 영화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도시인처럼 건조하면서도 섬세한 얼굴을 지녔다. <위크엔드>는 ‘짜르’의 리더 존 그랜트의 솔로앨범에서 두곡(<TC와 허니베어>와 <마즈>)을 가져왔다. 그의 깊이 울리는 목소리는 <위크엔드>의 소박한 외양에 촉촉한 감성을 부여한다. 두 남자는 클럽과 아파트뿐만 아니라 체육센터, 놀이공원, 주유소, 밤거리, 기차역 등 노팅엄의 곳곳을 배회한다. 그들이 쏟아내는 이야기가 게이 문화의 주요 담론과 연결되지만, 영화는 그것을 빌려 둘의 차이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16살까지 위탁가정을 전전한 러셀은 관계의 기억을 노트북에 기록하고, 16살에 집을 뛰쳐나온 글렌은 관계를 맺은 남자의 목소리를 녹음한다. 적극적인 글렌이 바에서 키스를 요구할 때, 러셀은 망설이는 남자였다. 헤어지는 순간, 러셀이 먼저 다가가 글렌의 입술에 키스한다. 순한 남자 러셀은 멀리서 휘파람을 불고 야유를 보내는 누군가를 성난 눈으로 바라본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거기에 더이상 글렌은 없다.
<라잇 온 미>와 <위크엔드>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관계의 본질’보다 ‘주어진 한계의 슬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끝내 부정하지 못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