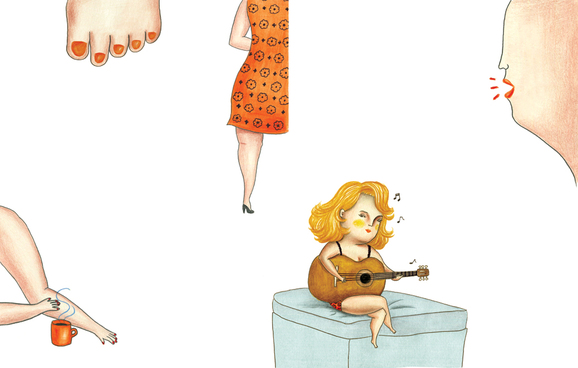
소설가 친구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극장에서 방금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그녀>(Her)를 보고 나왔는데, ‘바디무비’ 꼭지에 쓰면 좋을 영화라는 것이었다(이런 식의 제보 및 추천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나는 이미 <그녀>를 보았고, 나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원고에 쓸 만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우려낼 생각으로 ‘그래? 난 별로던데… 뭐가 재미있어?’라는, 천진난만한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한 (상대방은 이미 내 표정이 천진난만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답장을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곧장 새로운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목소리도 몸이라는 거지. 신음을 내뱉는다고 할 때 한자로 몸 신을 쓰나? 생각할 게 많아서 좋더라’라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내용을 좀더 뽑아내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이 지면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가득 채우면 참 좋았겠지만) 더이상의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소설가 친구가 영화 속에 등장한 (스칼렛 요한슨의) 신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더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영화 <그녀>를 보고 난 뒤에 내 머릿속에도 ‘목소리가 몸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영화에서는 단 한번도 스칼렛 요한슨이 등장하지 않지만 목소리만으로도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스칼렛 요한슨의 얼굴과 몸을 떠올렸다. 나는 이미 스칼렛 요한슨을 잘 알고 있다. 그녀가 (피트 욘과 함께) 부르는 노래도 좋아했고, 몸에 착 달라붙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적들과 싸우는 블랙 위도우도 좋아했고,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서의 천진하고 귀여운 캐릭터도 좋아했으므로 그녀를 떠올리는 건 쉬웠다. <그녀>를 보면서 스칼렛 요한슨의 몸과 얼굴을 계속 떠올리는 건 영화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싶다가도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노린 게 그것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곧 그녀의 몸이었다.
영화 <그녀>에는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 설정이 무척 많다. 주인공 테오도르는 ‘아름다운 손편지닷컴’의 편지 쓰는 직원이며 OS(운영체제) 사만다는 목소리로만 존재한다. 테오도르는 폰섹스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OS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 이후에는 단말기의 카메라를 통해 사만다에게 세상을 보여준다. 사만다는 남자친구 테오도르를 향해 자신이 만든 피아노곡을 들려주면서, 이 음악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없는 둘만을 위한 ‘사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한다. 테오도르는 그 음악을 들으며 사만다의 모습을 본다. OS와 사랑에 빠진 인간에게 대리 섹스 서비스를 해주는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인) 이사벨라는 말 한마디 없이 듣거나 보기만 한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일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일까,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일까, 영화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본능적인 사랑의 욕구가 ‘바라보는 행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1968년 S. 라크먼과 R. J. 호지슨이라는 두명의 연구자는 기이한 실험을 했다. 파블로프 실험으로 여자의 부츠에 대한 페티시를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한 것이었다. 두 연구자는 5명의 남자에게 ‘음경측정장치’를 달았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알몸 또는 도발적인 복장을 한 여자의 영상을 보여준 뒤 무릎 높이의 모피 부츠 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피험자 중 3명이 부츠만 보고도 페니스가 굵어지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자의 영상을 보았을 때와 같은 굵기였다고 한다(메리 로취의 책 <봉크: 성과 과학의 의미심장한 짝짓기>에서 재인용).
<그녀>의 주인공 테오도르가 사랑에 빠진 사만다에게는 얼굴이 없고, 몸이 없으며, 발가락도 없고, 입술도 없다(고 쓰면서도 나는 자꾸만 스칼렛 요한슨을 떠올린다). 테오도르는 그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고, 그녀를 듣고, 그녀를 경험하고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녀가 여성이라는 근거도 없다. OS를 설치할 때 여성 목소리와 남성 목소리 중 여성의 목소리를 고른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테오도르는 그녀를 만지고 싶어 한다. 머리에 손을 얹고 키스를 하며 목을 간지럽힌다. 그녀를 보지 않았는데 그녀를 상상한다. 테오도르는 사만다에게 키스를 할 때 어떤 얼굴을 떠올릴까. <그녀>는 기이한 페티시즘에 대한 영화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사물 포르노의 새로운 장르일지도 모르겠다.
사만다는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며, 몸 안에 갇혀 있지도 않아서 죽음 역시 뛰어넘는다. 말하자면 사만다는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념’이다. 테오도르는 누군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과 사랑에 빠진 것이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사랑과 사랑에 빠진 뒤 그 사랑을 떠나보내는 방법을 배운 것이며, 어쩌면 그냥 자신을 계속 사랑한 것이다.
<그녀>에서 가장 큰 불만은 영화의 결말이었다. 감독은 사만다가 하나의 주체로 우뚝 서는 것처럼 묘사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진화를 거듭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반면에 테오도르는 사만다를 잃고 난 뒤 전 부인이었던 캐서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친구(이자 OS와 사랑에 빠진 동지이기도 한) 에이미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먼 불빛을 바라본다. 에이미가 테오도르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면서 영화는 끝이 나는데, 이 이상한 감상주의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가 없었다. 테오도르는 전 부인 캐서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난 앞으로도 널 사랑할 거야. 우린 함께 자랐으니까. 넌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줬어.” 테오도르는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 뒤 뭘 깨달은 것일까. 헤어지고 나서 진정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것일까. 그는 여전히 자신만 사랑하는 것 같다. 영화에 등장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주체적이지만 테오도르는 여전히 그녀들을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영화 <그녀>는 수많은 she들을 끝내 her로만 여기는 테오도르의 이야기인 셈이다.
이 영화는 SF다. 근미래를 다루고 있고 미래의 사랑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영화의 결말이 미래의 사랑에 대한 감독의 생각이라면 더이상 할 말이 없지만, 사만다라는 거대한 진화의 인격체 앞에서 인간이 고작 깨달을 수 있는 게 가까이 있던 사람의 소중함이라면 굳이 사만다라는 존재가 필요했을까 싶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OS들에게 버림받은 인간 둘이 청승맞게 앉아 있는 마지막 장면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사만다와의 사랑을 통과한 테오도르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 가장 큰 이유는, 편지를 ‘입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어쩌면 테오도르는 OS 사만다를 인간으로 느낀 것처럼 인간 캐서린을 자신의 OS로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캐서린에게 보낼 때는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야 했던 게 아닐까. 한 문장 한 문장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를 보내야 했던 게 아닐까. 그랬다면 ‘이 세상 끝까지 너는 내 친구야’라는, 쓰나 마나한 문장은 빼지 않았을까? 그토록 자기중심적인 문장을 쓸 수는 없지 않았을까? 미래에는 손으로 직접 글 쓰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는 설정인가? 그럼 나도 입으로 소설을 써야 한다고? 에잇, 그럼 절필하고 말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