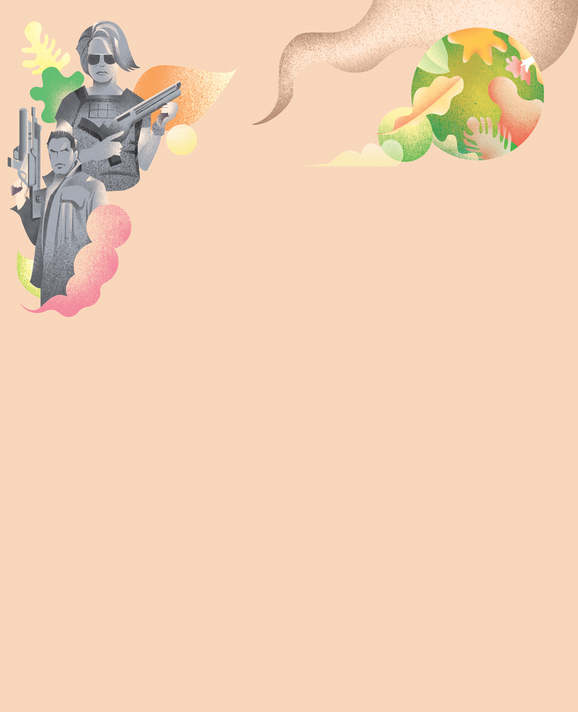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최첨단의 전쟁 기계를 만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전제로 두고 있지만, 동시에 어리석은 인간 종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이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스토리상 시리즈의 ‘적장자’로 보이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역시 그렇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이번에도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서 온 살인 기계를 상대로 싸움으로써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엿본다.
디스토피아는 그리 멀지 않았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이대로 2050년이 되면 해수면이 1m나 상승해 거주지를 잃는 사람이 1억5천만명이 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도, 빠른 속도로 유실되는 토지와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이미 식량 생산량을 위협하고 있다는 유엔의 경고도 모두 도래할지도 모르는 디스토피아를 예고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밥을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리고 집을 잃고 밥을 굶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끈질긴 성차별, 원하는 것만 믿고 싶어 하는 인간의 확증편향과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관성이 만나 얽히는 결과 역시 디스토피아로 가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사회, 환경, 경제, 정치, 그 어떤 경로를 택해 더듬어 봐도 찬란히 빛나는 황금빛 미래를 보기는 쉽지 않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려면 인류가 기아를 극복하고 병마와 싸우며 폭력을 줄여왔다는 밝은 면을 토템처럼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한다.
디스토피아를 막을 수 있을까?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디스토피아를 지배하는 기계 악당은 ‘스카이넷’에서 ‘리전’으로 바뀌었을 뿐, 어떻게든 디스토피아가 도래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한다. 미래에서 터미네이터를 보내기 전에, 기계가 터미네이터를 만들게 만든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금 똑바로 봐야 한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에 응답해야 하고, ‘더이상 시간이 없다’(Time’s Up*)는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도달하는 미래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터미네이터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지나서 되돌리려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매년 체감하지 않는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주어진 선택지는 그것 하나뿐이다.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작품은 그 작품의 세계가 현실을 일부분 반영하면서도 도저히 실현되지 않을 것같이 보일 때 비교적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 <이퀼리브리엄>도, <블레이드 러너>도 우리가 겪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작품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칠드런 오브 맨>과 드라마 <블랙미러>는 앞의 작품들보다는 조금 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디스토피아 장르를 그 누구보다 즐기는 한명의 관객 겸 독자로서 장르의 현실 고발적인 기능도 물론 사랑하지만, 이왕이면 고발할 현실도 우려할 미래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요즈음 부쩍 든다. 그것이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인 상상이라고 할지라도.
* Time’s Up: 성범죄와 성차별에 대항하는 미국의 운동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