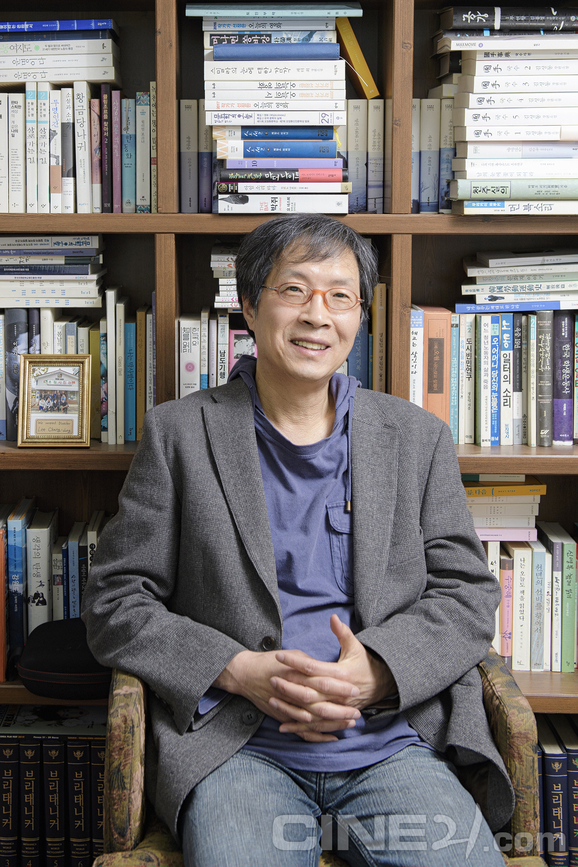
‘영화는 계속된다’는 선언과 함께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29일 막을 올렸다. 5월 8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는 전주시 내 네 개의 오프라인 상영관과 OTT 플랫폼 웨이브(wavve)를 통해 48개국 194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이중 142편을 온라인 상영관에서 만날 수 있다.
팬데믹 속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제의 활로를 뚫고 있는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눈길에 제일 앞서가며 발자국을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다”며 전주국제영화제만의 방향성과 노하우를 풀어놓았다. 개막을 앞둔 그를 만나 영화제 준비 과정과 각오를 들었다.
-최근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넘어섰다. 영화제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영화제를 크게 프로그래밍, 행사 진행, 방역으로 나눴을 때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게 방역이다. 전국 확진자 수보다도 영화제가 열리는 전북 상황이 관건이다. 전주는 하루에 5명 이하로 확진자 수가 나오는 상태다. 며칠 사이 추이가 안정되고는 있으나 영화제 관계자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해 이미 코로나19 국면에서 영화제를 치러봤다. 장장 4개월 동안 심사 상영, 장기 상영, 온라인 상영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예년대로 열흘 동안 온라인과 극장 상영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다.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작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전략도 없었고, 매뉴얼 자체가 아예 없었다. 방역 당국에서 관객을 부르지 말라고 해서 타협을 본 게 경쟁부문 작품에 한해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극장 상영을 하고 뒤풀이를 가진 거다. 당시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인들이 네트워킹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반면 올해는 관객을 상대로 상영은 할 수 있되 영화인들이 네트워킹을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주영화제를 사랑하는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감독, 배우를 만나는 것이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영화제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영화 예매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 현장 매표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좌석은 33%만 가동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매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년만한 좌석 확보가 안 된다. 100석짜리 극장의 30석 남짓밖에 못 연다. 방역 지침을 지키되 관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만나야한다는 것에 충실하려 한다. 관객이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영화제 본래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싶다. 대신 웨이브 온라인 상영관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 극장에 못 오는 분들도 전주가 선정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식 예매 오픈 전 전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유효 좌석의 20%를 사전 판매하기로 한 것도 인상적인데.
=원래 작년부터 이렇게 해보기로 했는데 무관중 영화제로 진행되는 바람에 올해 처음 시도하게 됐다. 지역과 영화제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는 영화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지역 밀착성을 강화하려 한다. ‘시네마 천국 인 전주’라는 이름으로 골목 담벼락에 영화를 틀기도 하고,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던 ‘지프지기’ 자원봉사에 지역 시니어들을 참가시키는 등 지역 주민들과 가까워지려 한다.

-이밖에도 전주시네마프로젝트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전주숏프로젝트를 강화하는 등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영화를 선보여온 전주영화제의 색깔을 좀 더 드러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점점 더 영화가 안전한 길을 가는 시절에 영화의 경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영화에 주목해 그런 영화를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전주영화제의 방향성이자 차별점이다. 그러한 영화제의 태도가 영화의 깊이와 넓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려 한다. 후원을 해주는 전주시와도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상영작 외에 컨퍼런스 및 포럼 섹션의 주제들도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영화제로서의 태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컨퍼런스 및 포럼 준비에 있어서는 위축된 영화 담론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금 어떤 환경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관객을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겠다는 거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휘발되지 않도록 기록해서 한국 영화산업의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하려 한다. 일례로 OTT 산업이 현재 영화 산업 판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OTT 논쟁은 너무 납작하다. 정부가 개입해서 토종 OTT를 키우는 것만이 답은 아니지 않나. 산업 관계자들,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이에 관련한 다양한 레이어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얘기해보고 싶다.
-‘영화는 계속된다’라는 올해의 슬로건에서 비장미가 느껴졌다. 어떤 메시지를 담은 영화제를 만들고 싶나.
=BTS의 <Life Goes On>을 들으며 이거다 싶었다. 비장하기도 하지만 경쾌한 슬로건이지 않나. (웃음)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시 극장에서 영화를 만난다는 것의 총체적인 의미를 지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주영화제가 앞장서서 신발 끈을 묶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모니터로 영화를 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기술과 산업 환경의 변화로 대체될 수 없는 영화만의 무언가가 과연 무엇인지 질문하려는 거다. 이건 단순한 질문을 넘어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선언이기도 하다. 어찌됐든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우리 영화제가 코로나19라는 눈길에 제일 앞서가며 발자국을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다. 다들 전주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으니 말이다. 올해는 4명 이하로 모일 수밖에 없으니 내가 영화의 거리를 열심히 돌아다니며 관객과 영화인들을 만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