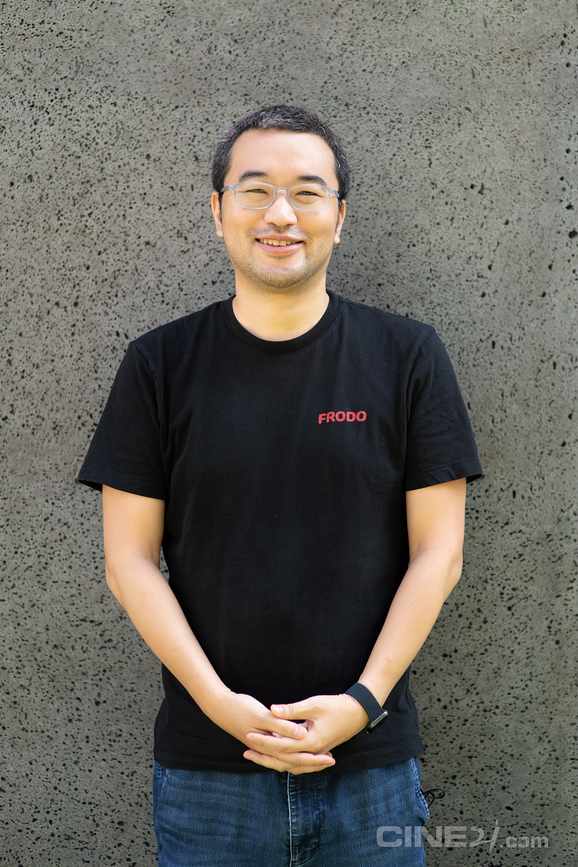
-팬데믹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극장과 영화 제작 상황은 어떤지 우선 궁금하다. 특히 작품 수급이 쉽지 않았을 듯도 한데.
=동남아시아 10개국 중 과반수 이상이 아직 극장 문을 못 열고 있다. 백신 보급이 조금 늦어지면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당연히 영화계 분위기도 좋지 않다. 신기한 건 그 와중에 작품 프로덕션은 계속 진행이 되더라. 규모가 큰 상업영화들은 집합 금지, 영업 중지 속에서 멈출 수 밖에 없는데 오히려 작가들의 독립영화나 예술 작업은 비옥해졌다. 작년을 거치며 올해 라인업이 풍성해지는 바람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선정 과정에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특히 해외 영화제 수상작들도 크게 늘어났다.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이후 자연을 메타포삼아 시적인 영화 세계를 펼쳐가는 젊은 작가들의 조류가 형성됐다. 최근의 새로운 흐름이라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
=태국이나 필리핀은 한국과 비슷하게 OTT로 넘어가는 영화 인력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태국 드라마 <그녀의 이름은 난노>같은 작품들이 확실히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 영화는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들이 많다. 다만 이를 직접적으로 풀어내기 보다는 정부 검열과 감시를 피해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약간의 진입 장벽을 느끼는 관객들도 많은 듯 하다. 예를 들어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찬란함의 무덤>은 왕정을 매우 날카롭게 비판한 작품이지만 그 방식으로 형이상학적, 초현실적 접근을 꾀했다.
-올해 상영작 중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메모리아>는 예매 전쟁이 치열했다. 위라세타쿤 영화 중 첫 해외 로케를 담는다고.
=위라세타쿤 영화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 될 것이다. 첫 해외 로케이션을 택한 영화라는 점, 헐리우드 스타 배우인 틸다 스윈튼이 주연을 맡은 점부터 우선 전작들과 무척 다르다. 감독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하필 남미 콜럼비아인지 물어보았다. 태국 사회를 비판하는 코드를 늘 영화에 담아내던 감독의 선택치고는 너무 비약적인 변화같아서 처음엔 좀 납득이 안 가더라. (웃음) 위라세타쿤 감독은 대항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남미 대륙에서 동남아시아로 전해진 음식이나 문화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에 매료된 듯 보였다. 태국에서 자주 발견되는 숲속 귀신이나 괴물에 관한 이야기는 힌두교, 중국 문화에서 영향받은 토착적인 요소들과 더불어서 남미 정글의 영향도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렇게 식민지 역사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역사까지 살피는 작품이 <메모리아>다.
-현지 영화인들과도 무척 활발히 교류하는 것으로 안다. 초청 과정에서 특별한 에피소드를 남긴 작품도 있나.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하게 된 <젠산 펀치>는 단연 올해의 추억을 만들어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의족 생활을 하는 일본인 권투 선수가 먼 필리핀까지 가서 국제선수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다. 일본에서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는 쇼겐은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으면, 워낙 활동 경력도 길고 마당발로 통하는 배우라 일본에선 인지도가 높다. 이 배우가 장애인 권투 선수의 실화에 꽂혀서 직접 감독을 찾아다니다가, 어차피 필리핀이 배경이니 필리핀 감독을 섭외해보자는 논리로 무턱대고 브리얀테 멘도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젠산 펀치>의 시작이다. 내 경험상 멘도자 감독은 전화도 세 번 정도해야 겨우 한 번 받는 자연인인데 이메일에 답장을 해 줄리가 없지 않나.(웃음) 멘도자가 부산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쇼겐이 부산을 직접 찾아 그에게 접선을 시도한 끝에 영화가 성사되었다. 공지된 게스트 리스트를 보고 멘도자가 정말 부산에 오는 게 맞느냐고 공식 계정으로 문의한 쇼겐의 메일이 아직도 기억난다. 영화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생한 사건이 아닌가 한다.
-아시아영화의 허브로서 부산은 귀한 만남의 장임이 분명하다.
=스리랑카 감독님이 네팔 편집자와 만나서 다음 작품을 같이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부산에서 만나서 작업의 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 칸, 베니스, 로카르노, 로테르담 영화제의 집행위원장들이 유럽 내에선 만날 일이 없는데 부산에서 동창회하듯 1년에 1번 만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같은 유럽 대륙 내에선 동선이 겹칠 일 없지만 부산에선 결국 다 얼굴 보게 된다는 이야기다.
-올해 상영되는 동남아시아 영화는 총 몇 편인가.=동남아시아 영화가 장편영화 기준 총 12편이다. 예년 기준으로 보통 17~18편, 많게는 20편 정도였는데 이번엔 상영작 수를 조금 줄이고 집약적으로 꾸렸다.
-2021년 초청작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은 무엇인가.
=캄보디아 영화 <화이트 빌딩>. 사회 문제를 사실주의로 정면돌파하는 경향이 동남아시아 영화에서 점차 도드라지고 있다. 우리에겐 지나간 흐름이지만, 동남아시아 영화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이 매력에 주목해주길 바란다. 특히 캄보디아는 신흥 국가 축에 속하다보니 창작물의 검열에 있어서도 관련 체계나 법제화가 덜 된 부분이 있고, 창작자들이 오히려 이 점을 잘 돌파하고 있다. <화이트 빌딩>은 수도 프놈펜의 근대화의 상징인 화이트 빌딩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싸우고 분노하고 안타깝게 쫓겨나는 과정을 그린다. 건물이 무너지는 동시에 주인공의 아버지가 쇠락해가는 과정을 영화가 병치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굉장히 매력적인 젊은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주거,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전세계적인 화두를 캄보디아 영화의 색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