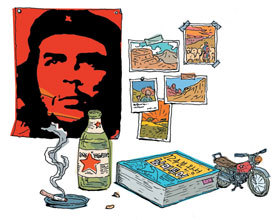
<모터싸이클 다이어리>의 종반부에서 게바라가 헤엄쳐 강을 건널 때, 목놓아 <공무도하가>라도 부르고 싶었다.
공무도하(公無渡河) 제발 임이시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하지만 우리의 게바라는, 아니 에르네스토는 기어이 그 강에 뛰어든다.
공경도하(公竟渡河) 임은 그예 건너시고 말았네.에르네스토 아니 푸세는 자유형, 접영 섞어가면서 강을 건너고야 만다.타하이사(墮河而死) 물에 빠져 죽으시니.다행히 푸세는 물에 빠져 돌아가시지는 않는다. 천식을 극복하고 도강에 성공한다.당내공하(當奈公何) 가신 임을 어이할꼬.푸세는 민중의 환호를 받지만, 어이할꼬, 인간 게바라는 가시고 영웅 게바라만 남는다.
월터 살레스의 <모터싸이클 다이어리>는 ‘체’(스페인어로 ‘아저씨’라는 애칭)가 되기 이전의 게바라, 청년 에르네스토 게바라(혹은 애칭인 푸세)를 다룬 영화로 알려져 있다. 영화는 초반부터 자막까지 써가며 “이건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지만, 정작 영화가 끝나면 영웅 체 게바라의 탄생설화를 읽은 느낌만 남는다. 혁명가 게바라는 탄생설화까지 지닌 완벽한 영웅으로 재탄생한다. <모터싸이클 다이어리>는 미화하지 않는 척하면서 온갖 미화는 다 하는 ‘내숭 떠는’ 영화다. 다만 그 미화의 색깔이 옅어서 눈치채기 어려울 뿐이다.
미화하지 않는 척 미화하는 영화
23살 의대생 푸세와 29살 생화학자 그라나도의 대장정, 12425km의 길이 멀어질수록 나의 마음도 영화에서 멀어졌다. 게바라 역을 맡은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은 짐짓 비장한 표정으로 “또 다른 인류”에 가까워져 간다고 되뇌지만, 나는 “또 다른 인류”에 다가가는 게바라를 느낄 수가 없었다. <모터싸이클 다이어리>에는 의식화되는 게바라는 있지만, 고뇌하는 게바라는 없었기 때문이다. 영화의 자잘한 에피소드를 발라내면 영화의 뼈대는 대충 이러하다.
게바라는 길에서 만난 민중으로 인해 서서히 의식화된다. 칠레에서 혼자 몸져누운 독거 할머니를 치료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아타카마사막에서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 즉 민중(공산당원 부부)을 만나면서 분노가 치민다. 이번에는 게바라 차례다. 민중에게 감화받은 게바라는 민중을 감화시킨다. 페루에서는 수술을 거부하던 나환자촌의 아가씨를 감화시켜 수술을 받게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편의 가장 낮은 민중인 나환자들과 자신의 생일파티를 함께하기 위해 맨몸으로 강을 건넌다. 어느 누구도 감히 건너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분열의 강을 건넌다. 그리고 나환자들은 집회의 군중신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하며 게바라 주변으로 모여든다. 그리하여 영웅의 탄생설화는 완성된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도식이다. 무력감에서 분노를 거쳐 행동으로 나아가는 흐름은 낯설지도 새롭지도 않다. 영화 내내 게바라는 언제나 민중을 위해 헌신할 각오를 하고 있고, 민중은 항상 순박한 얼굴로 감화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토록 순수한 사랑과 일치는 ‘신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게바라도 민중도 결코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다.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때때로 배신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란 없다고 나는 믿는다. 혁명도 그러하다. 게바라는 차치하고라도, 민중에 대한 미화는 민중에 대한 타자화일 뿐이다. 민중은 게바라의 각성을 위한 텍스트일 뿐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모터싸이클 다이어리>는 인종적 편견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영화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대개 백인 지식인이고, 감화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디오 민중이다. 물론 현실이 그러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영화 내내 도통 감독의 자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전형적인 백인 미남인 게바라가 여행의 교훈을 말하며 “단일한 메스티소 민족, 하나된 아메리카”를 장황하게 읊어대지만, 영화는 왜 ‘메스티소’(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지를 설득하지 못한다. 영화는 남미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로 녹여내지 못하고, 게바라의 다짐과 인디오들의 증언을 통해 ‘강변’할 뿐이다. 인디오의 피해자 ‘인터뷰’는 남미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상투적인 선동을 반복한다. 그래서 게바라가 “총 없는 혁명, 절대 성공 못해”라고 내뱉을 때, 그 깨달음은 뜬금없는 선언으로 느껴진다. 서구의 백인 감독이라면 모를까, 남미 감독이 만든 영화치고는 수세기에 걸친 남미 민중의 저항의 역사를 응집한 ‘통찰’이 느껴지지 않는다.
월터 살레스의 시선은 ‘도식화된’ 민중을 응시할 뿐(주로 흑백으로), 민중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 못된 아줌마가 착한 민중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역시 로드무비 형식으로 보여주었던 <중앙역>에서도 월터 살레스의 시선은 언제나 외부자의 시선이었다. 물론 그 시선에는 한없는 동정과 연민이 묻어 있지만, 딱 거기까지뿐이다. <중앙역>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가톨릭이 남미의 토착신앙과 어떻게 결합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학적 풍경뿐이고, <모터싸이클 다이어리>를 보고 나면 쿠스코와 마추픽추 유적지, 광활한 남미의 대자연으로 여행가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복고풍의 옛 노래를 흥얼거리기 위해 상투적인 구조도 반복된다. 게바라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라나도는 온갖 통속을 뒤집어쓴다. 그라나도는 끝없이 투덜거리고, 촐랑댄다. 그래야 한없이 투명하고 솔직한 게바라가 빛난다. 그라나도의 ‘구라’가 ‘구릴수록’ 게바라의 정직은 투명해진다. 정직한 주인공, 까부는 친구. 지겨운 도식이다. 상류층 여성과의 로맨스도 동원된다. 게바라는 길 위에서 이별 통고를 받지만, 길을 가기 위해 슬픔을 감수한다. 그 길은 곧 혁명의 길이다. 혁명을 위해서 사랑도 포기한다. 얼마나 감상적인가? 아, 게바라의 천식은 왜 그렇게 강조되는가? 게바라는 길 위에서도 헐떡거리고, 배 위에서도 헐떡거린다. 게바라의 고난의 행군을 강조하기 위해서 숨이 끊어질 듯한 호흡 곤란은 강조되고 강조된다. 영화는 이래도 게바라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여행을 마친 게바라가 “길에서 지내는 동안 무슨 일인가 일어났어… 많은 게 불공평해”라고 말할 때, 마음은 아리지만 불만은 지워지지 않는다.
게바라는 이미 너무 많다
아무리 ‘사실’에 기초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모터싸이클 다이어리>의 게바라 묘사는 지나치게 도식적이다. 게바라가 혁명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너무 혁명가라서 지루하다. 그것도 낭만적인, 너무나 낭만적인, 그래서 상투적인. <모터싸이클 다이어리>의 게바라는 남미의 백인 지식인에 의한, 서구의 리버럴을 위한 게바라일 뿐이다. 그런 게바라는 이미 넘쳐나고 있다. 아까운 돈 들여서 또 만들 필요까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