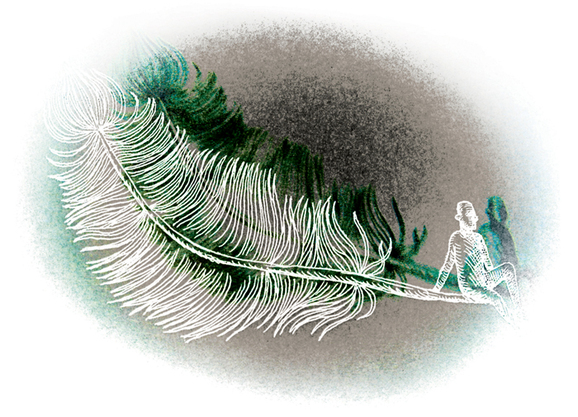
<깃>은 기다림에 관한 영화다. 현성(장현성)은 첫사랑을 기다리고, 소연(이소연)은 불안한 미래를 기다리고, 소연의 삼촌(조성하)은 떠나간 아내를 기다린다. 삼촌은 기다림에 지쳐 말문을 닫아버렸지만, 현성과 소연의 기다림은 그처럼 간절하지는 않다. 현성은 첫사랑이 오지 않을 것을 안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기다리는 건 좋은 일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무한다.
‘적당히’의 미덕을 아는 영화
그렇다. ‘기다림의 자세’가 문제다.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유유자적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애끓는 기다림은 기다리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깃털처럼 가볍게 기다려야 한다. <깃>은 기다림에 관한 영화지만 너무 외롭다고 절규하지 않고, 적당히 외롭다고 웅얼거린다. 그리고 ‘적당히’ 기다리다보면, 기다리는 사랑은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랑이 다가온다고 말한다. ‘적당히’는 <깃>의 가장 큰 미덕이다.
현성은 ‘적당히’ 상처받은 사람이다. 누구나처럼 첫사랑을 미처 지우지 못해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생긴 어쩌면 ‘평범한 상처’다. “변변치 않은 영화 하나를 막 끝낸” 현성은 5월 광주에 관한 시나리오를 쓰다가 갑자기 10년 전 약속을 떠올린다. 첫사랑과 10년 뒤 우도(비양도)에서 만나자는 약속이다. 현성은 우도를 찾아간다. 첫사랑을 만나러 간 우도에서 다가올 사랑을 만난다. 집 나간 아내 때문에 넋나간 삼촌을 대신해 우도의 모텔을 지키고 있는 소연이다. 제주의 풀빛을 닮은 소연의 해맑은 미소는 도회지 아저씨의 ‘평범한 상처’를 어루만져준다. 제주도의 푸른 밤과 푸른 바다, 적당히 굽은 길과 완만한 경사도 지친 서울 아저씨를 보듬어준다.
치유와 신뢰와 이해가 있는 풍경
<깃>은 치유의 영화다. 현성의 상처뿐 아니라 관객의 상처까지 어루만져준다. 무엇보다 <깃>의 풍경이 상처를 치유한다. 우도를 다녀온 사람이면, 우도의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값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바다가 보이고, 풀밭이 있고, 굽은 길이 있고, 자전거가 있는데, 위무받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소연의 순진무구함은 우도의 생명력을 압도한다. 20살 무렵 여성의 생기를 뿜어내는 소연은 생명력 그 자체다. 소연의 때묻지 않은 행동이 때묻은 정신을 위로한다. 조랑말들의 이름을 “까매서 ‘카페’, 하얘서 ‘오레’, 얼룩무늬여서 ‘마일드’”로 지은 아가씨를, 눈에 숟가락을 갖다대고 밥먹는 아저씨를 유심히 관찰하다 “아저씨 혹시 현상수배범 아니에요?”라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처녀를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외롭지만 외로운 티를 내지 않는 속깊은 아가씨는 쉽게 외롭다고 투정부리는 방정맞은 정신들을 나지막이 나무라고 위로한다.
<깃>은 믿음을 믿는 착한 영화다. 우도에 첫사랑은 오지 않았지만, 첫사랑의 분신인 피아노가 배달된다. 피아노는 풀밭 위에 방치된다. 비바람 속에 젖는 피아노는 애증에 흔들리는 현성을 상징한다. 현성이 방치한 피아노에 소연이 다가간다. 소연은 건반을 두드리고 피아노는 공명한다. 소연은 탱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피아노에 담긴 편지를 읽고 현성은 첫사랑을 잊을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편지를 태운다. 피아노를 소연에게 준다. 이제 치유가 시작된다. 소연이 들려준 전설에 따라, 문지방을 긁어먹은 현성은 막혔던 글을 다시 써내려간다. 삼촌이 던진 낚싯대에 도미가 낚이자 삼촌의 아내가 돌아온다. 삼촌은 돌아온 아내를 조용히 안아주고, 아내가 밥을 해주자 “맛있다”고 닫았던 말문을 연다. 그 모든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감정은 왠지 용서라기보다는 이해에 가깝다. 절박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이해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해하면 용감해진다. 현성은 섬을 떠나면서 1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말한다. 소연은 그러자고 약속하지 못한다. “저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라고 말한다. 아직 소연에게 기다림은 절박해서 두려운 무엇이다. 삼촌의 지독한 상실이 그녀에게 두려움을 가르쳤을지 모른다. 현성이 배를 타러 떠나고, 소연은 모텔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 그 순간에도 ‘제발 두 사람이 만났으면’ 하는 마음은 들지 않는다. 영화는 그런 마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만나면 좋고’라고 느끼게 한다. 역시 ‘적당히’ 간절하기 때문이다. 둘이 다시 만나는 순간에도 눈물을 짜내지 않는다. 대신 미소가 번진다. <깃>은 그렇게 사랑에 대한 냉소와 열정 사이에 난 좁은 길을 흘러간다.
지친 남자와 달래주는 여자라는 판타지
<깃>은 어쩔 수 없는 아저씨 영화다. 남성감독의 ‘자전적 영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내 안의 하이드씨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34살 아저씨가 22살 띠동갑 처녀를 만났는데, 어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깃>은 ‘꿈도 야무진’ 아저씨들의 ‘빤따지’를 100% 만족시켜준다. 더구나 성별분업도 너무 확실하다. 생기발랄한 처녀가 늙수그레 아저씨에게 밥을 챙겨주고, 자전거를 내주고, 춤을 가르쳐준다. 황송하게도 띠동갑 아저씨를 좋아해주기까지 한다. 영화 찍느라 세파에 찌들고, 5월 광주를 생각하느라 역사의 무게에 짓눌린 아저씨를 달래주고, 보듬어준다. 그것도 제주의 푸른 바다와 검은 돌담처럼 포근하게. 아저씨가 더 바랄 게 무어란 말인가. 지나간 사랑을 잊고, 막혔던 글이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 의심하기 시작하니 한 장면이 떠올랐다. 탱고를 추던 장면. 소연이 혼자 추는 탱고는 외로움을 상징한다. 소연은 “혼자 추기 힘든 춤”이라며 현성에게 탱고를 가르쳐준다.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진다. 탱고를 가르치던 소연은 “탱고는 남자가 리드하는 춤”이라고 말한다. 탱고는 사랑을 은유한다. 그렇다면 사랑은 남자가 리드한다?
알고 보니, 나도 남자였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아저씨 판타지에 열심히 위로받고 있었다. 마침 현성과 나는 동갑이었고, 나도 그처럼 지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친 남자와 달래주는 여성이라는 구도는 상처받은 여성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하지 않던가. 역사와 노동의 무게에 지친 여성을 순진무구한 남성이 달래주는 영화는 귀하디 귀하지 않던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기에는 세상이 아직은 무겁다. 지루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