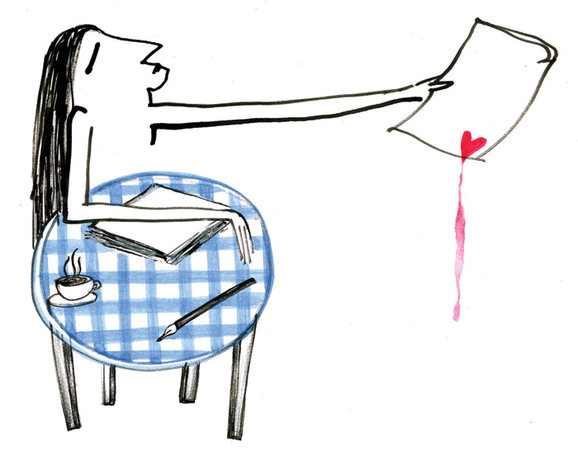
가부장제에 의한 억압은 계급 억압 등에 비해 훨씬 미시적이고 일상적이고 개인적으로 작동한다. 개인을 그리는 영역인 문학, 예술은 가부장적 억압을 내재하고 있는데, ‘남성-작가’ 와 ‘여성-뮤즈/모델’의 짝이 그것이다. 남성이 발화 주체이고, 여성이 대상이라는 도그마를 허무는 것은 여성 작가의 존재이다. 버지니아 울프, 카미유 클로델, 프리다 칼로, 실비아 플라스 같은 여성 작가들은 ‘스스로 말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녀들은 자살하거나, 미치거나 극심한 고통 속에 살다 갔다. 한마디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였던 그녀들의 생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녀들을 둘러싼 의식적/무의식적 현실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을 다룬 <디 아워스> <까미유 끌로델> <프리다> <실비아> 같은 영화가 여성주의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디 아워스>의 그녀는 유일하게, 남편 때문에 죽거나 미치지 않는다. 감독은 그녀의 불안하고 우울한 표정과 내면의 (살)풍경을 예민하게 잡아내며, 그녀의 불가해한 자살을 소설 <델러웨이 부인>의 이후 독자들의 삶과 병치시킨다. 그녀가 왜 자살을 택했는지, 또는 자살이 옳았는지, 관객이 모두 수긍하지 못하더라도, 남편의 근심을 뒤로하고 기꺼이 강물로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고민의 최종 심급으로 자살을 선택했음을 인정케 하며, 그녀의 작품세계에 대한 어렴풋한 이해와 더불어 ‘초극의 의지’마저 느끼게 해준다.
<까미유 끌로델>은 열정적인 여성 예술가가 남성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자아와 정신을 잠식당하는지 보여주는 영화이다. 그녀는 로댕을 사랑했지만, 사랑은 그녀를 집어삼킨다. 그녀의 아버지에 의해 지적되고, 그녀에 의해 성토되듯, 그녀는 로댕의 제자, 모델, 연인이기만 할 뿐,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삶은 몰수된다. 영화는 이 참혹한 과정과 여기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필사의 노력을 보여주며, 끝내 ‘그래도 사랑했다’는 식으로 논지를 흐리지 않는다.
<프리다>는 여성 감독이 만들었지만, 남성 화가를 사랑한 여성 화가의 고통을 <까미유 끌로델>만큼 정치하게 그리지 못한다. 그녀는 남편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는 동안, 작품을 하지 않지만 이를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오직 남편의 바람기이며, 이에 맞서 동성애를 즐기거나 트로츠키와 사귀기도 한다. 그녀의 고통은 이름을 잃고 재능을 소진해버린 여성 예술가의 고통이 아니라, 난봉꾼 남편을 둔 유부녀의 고통이다. 건강이 악화된 뒤 그녀의 그림들에서 여성 혹은 장애 여성으로서의 실존적 자아에 대한 탐색이 보이지만, 그러한 그림들이 영화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기 어려우며, “그와의 만남은 사고이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말로 흡사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식의 물타기를 감행한다.
‘사랑밖에 난 몰라’서 죽었다고?
여성 감독이 만든 또 다른 영화 <실비아>는 단연 최악이다. 막 등단한 그녀는 유명한 남성 시인에게 반해 결혼한다. 그녀는 강의하랴 남편의 원고 타자 치랴 살림하랴, 시를 쓰지 못한다. 왜 시를 안 쓰냐는 남편의 질책에 “시가 잘 안 써지니 빵이라도 굽는다”고 하다가 “시 쓸 시간이 어디 있냐?”고 반문한다. 이는 가사노동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무늬만 시인’인 여자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 그러다가 그녀는 의부증에 미쳐간다. 남편과 별거를 하자 시가 써진다고 하다가(잠깐 원 나이트 스탠드도 암시된다) 남편을 유혹하여 섹스하며,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리다, 거절당하자 자살한다.
영화 속 그녀는 고학력 여성이었지만, 연애를 신봉하여 결혼하고, 생계와 가사를 짊어지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죽은 여자이다. 우리 영화 <그대안의 블루>가 이미 연애와 가사는 여성의 자아실현에 쥐약임을 주지시켰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영선은 자기 시나리오로 감독 만든 남편이 바람피우자, 의부증으로 자살하는 꼴을 이미 보여주었다. <실비아>는 그녀가 언제 시를 썼으며, 무슨 시를 썼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게 그리면서, 그녀가 ‘사랑 밖에 난 몰라서’ 죽었다고 서술하는 것은 진부할 뿐 아니라 악의적 왜곡이다.
실제 그녀는 글쓰기에 천착하여 결혼생활 도중에도 꾸준히 시를 썼고, 별거 뒤 썼던, 아버지를 파시스트에 비유해 “아빠, 아빠, 이 개자식 이젠 끝났어” 등의 시구에는 남성 중심의 역사에 대한 영민한 자의식이 환상적으로 녹아 있다. 영화는 이 모든 것을 백안시하며, 부부싸움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흡사 유명인의 사생활을 가십으로 좇는 파파라치의 눈이거나, 누구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가사조정실의 입장이다. 심지어 카메라는 기네스 팰트로의 얼굴이나 나체를 관음증적으로 잡는다. 말하는 주체인 여성 작가를 여성 감독이 그렸건만, 여성 시인과 여배우를 한갓 볼거리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데 분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