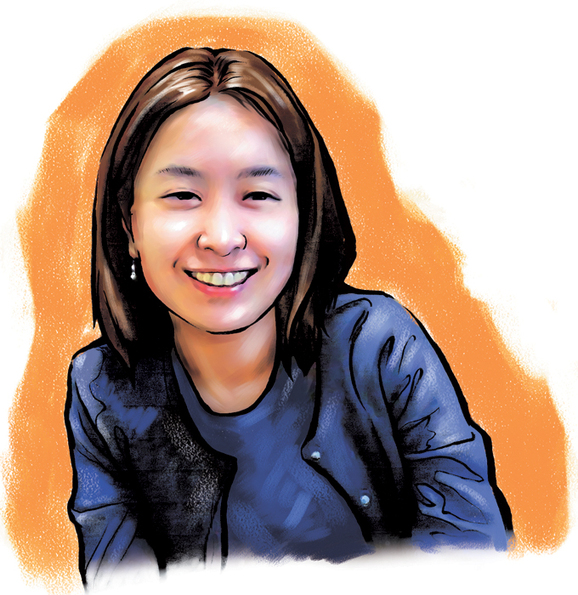
9·11에 관한 영화 두편을 봤다. <플라이트93>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WTC)에 비행기 두대가 꽂히고 펜타곤이 폭파당하는 와중에 UA 93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테러리스트들과 승객들 간의 처절한 난투극이다. 폴 그린그래스 감독은 영화를 100% 핸드헬드로 찍어 현장감을 내세우고 있다. 올리버 스톤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WTC의 구조작업에 뛰어들었다가 건물에 묻혀 극적으로 구조받은 두 소방수의 이야기다. 인물들의 심정적 맥락을 절실하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이 영화는 결국 일반적인 재난영화의 틀 안에서 극적인 감동으로 끝을 맺는다. 소재와 스토리텔링 방식은 대조적이되 두편 모두 강한 재현 욕구에서 비롯된 재현드라마다. 어느 빈틈을 뚫어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할 것인가 하는 고민.
내게는 재현된 것이 없었다. <플라이트93>. 무명배우들의 대거 투입, 관제탑과 관제소와 기내를 숨가쁘게 오가는 밀착된 핸드헬드 촬영은, 현장을 날렵하게 쫓는 카메라의 기동성을 지나치게 닮아서 오히려 내가 보는 것들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저것이 진짜일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기적의 이야기는 점점 익숙하고 닳아빠진 화면을 따라 게으른 휴머니즘의 외침으로 끝났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 소방수들을 발견한 남자가 미 해병대 출신이고, 하필이면 그 남자가 2년 뒤 이라크로 떠났다고 했다(자막으로 굳이 밝혔다!). 이런 것들이 진실을 완성하고 나자 영화의 휴머니즘은 더욱 편협해졌다. 반면 이야기 자체는 사실이므로 미국식 이상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는 힘은 그 어떤 픽션 정치영화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강력했다.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무섭게 느껴졌다. 저것만이 진짜일까.
영화는 삶과 세상을 들여다보고 재현하는 창이지만, 두 영화는 그런 속성 때문에 거짓말이 진실에 포함되거나, 진실의 일부분이 진실의 전체인 것처럼 확대된 경우라고 생각했다. 둘 중 어느 관점과 소재가 9·11에 더 가까운 위치를 점했느냐는 무의미한 논쟁일 것이다. 9·11에 관한 500시간짜리 다큐가 나온다고 해도 진실은 저 너머에 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소재와 방법을 택할 것이라면 비미국인 관객 쪽에서 볼 때 두편의 영화는 오락물 이상을 자처하지 말았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