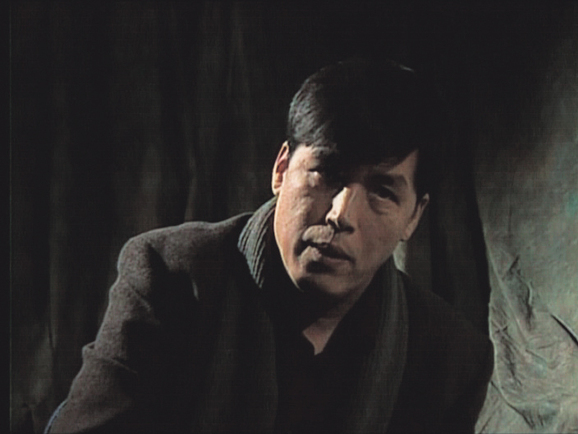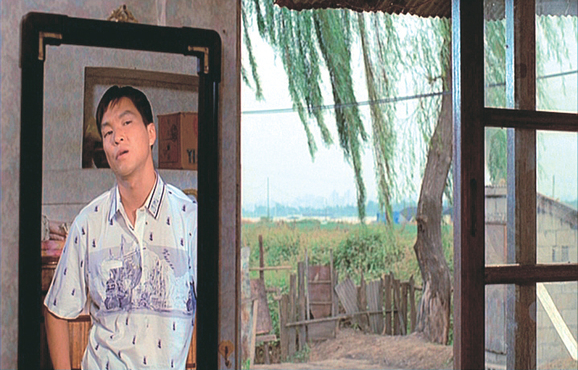
필자 같은 사람은 꿈만 꾸는 걸 다 해본, 그래서 부러운 사람이 이창동이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소설을 썼으며, 영화를 만든다(그리고 이건 별로 부럽지 않은데, 장관의 명예도 누렸다). 데뷔 10주년인 올해, 그가 영화로 복귀해 만든 <밀양>의 칸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칸의 정치적 행보를 볼 때 그의 수상 여부는 익히 짐작된다)을 기념하듯, 전작 세편의 DVD 박스세트가 출시됐다. 그의 영화는 별다른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고 어쩌면 문학적 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같아 밋밋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밀양>을 본 건 이창동 영화의 매력이 딱히 무언지 헤아리던 중이었다. <밀양>은 스크린을 가득 채운 하늘을 앞서 세번 보여준다. 세상의 하늘이 다 똑같다지만, 한눈에 한국의 하늘임이 느껴졌다. 그 아래 놓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일진대, 그게 일산 신도시가 되었건(<초록물고기>), 1980년 5월의 광주가 되었건(<박하사탕>), 의정부의 낡아빠진 아파트가 되었건(<오아시스>), 우리는 그 공간 하나하나가 시간이 부여한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임을 재인식하게 된다. 그의 영화처럼 너무나 익숙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인 것이다. 다시 <밀양>으로 돌아가, 주인공 신애가 부릅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한 때부터 더이상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아니면 필자가 보지 못한 걸까). 그 순간 이창동의 영화는 공간에서 사람 이야기로 이동한다. 죽은 남편의 고향에 문득 찾아가기로 한 신애에게서 보듯, 이창동의 인물들은 번번이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삶의 목적이 부재한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곤경에 처하며, 마침내 그런 상황은 한국사회의 정체성 상실, 한국의 현대사가 개인에게 남긴 상처라는 주제로 확장된다. 그간의 한국영화가 좀체 다루지 않았던 영역으로의 진입과 전개, 그게 바로 이창동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한다.
2003년에 기출시된 <이창동 컬렉션>은 당시 공직에 있던 감독의 사정상 음성해설을 수록하지 못해 미완성이란 평가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새로 나온 박스세트의 자랑거리는 당연히 감독의 음성해설이다. “쑥스럽다”라고 인사한 감독은 일단 음성해설에 들어가자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밀도 높은 질문에 청산유수로 답변을 들려줌은 물론, 영화에 대한 실로 충실한 해석들을 덧붙인다(하긴 선생과 소설가와 장관을 거친 사람이 말을 못한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그중, 세편 영화의 수용과정에서 감독의 의도와 다르게 읽힌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인상적이다. 예를 들면, <초록물고기>의 주제는 ‘가족의 복구’라기보다 ‘정체성을 모색하는 청춘과 변화하는 한국의 공간에 대한 탐구’라고 말하며, <박하사탕>은 ‘폭력과 가해자에 대한 어떤 합리화’가 결코 아니라 ‘현대사와 맞물린 한 인간의 시간을 되돌려 현실 결과의 원인을 찾는 실존적 작업’이라고 강조하고, <오아시스>의 일부 설정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실 그대로의 경계를 드러냄으로써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라고 반박한다. 듣기 어려웠던 그의 진지한 고백을 듣노라면 이창동 영화의 촘촘한 조직과 빈틈없이 세공된 이야기 그리고 함부로 쓰이지 않은 이미지가 그냥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애연가인지 수시로 라이터를 켜고 연기를 내뿜는 소리가 음성해설 당시의 현장감을 더한다). DVD의 영상은, 근작 <오아시스>의 화질이 안 좋은 반면, HD 마스터링을 거친 이전 두 작품의 화질은 기대 이상이다. 부록의 경우, 두장의 디스크에 수록됐던 예전 박스세트의 부록이 한장으로 축소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영화별로 40분 내외의 메이킹필름 등 전부 합쳐 171분에 이르는 특별영상은 영화제작 시점의 환경을 감안했을 때 충실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