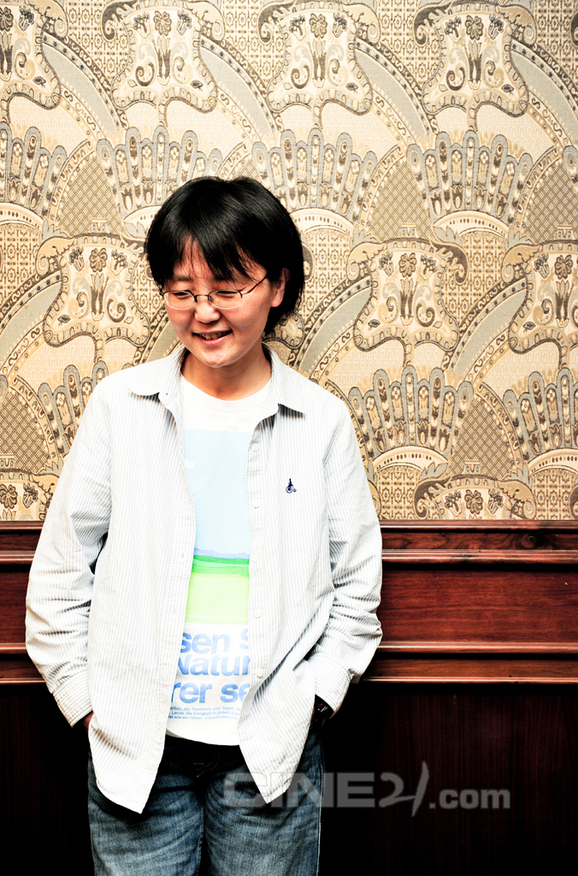
<오늘>의 송혜교보다 이정향이 더 궁금했다. <집으로>가 개봉한 2001년부터 <오늘>이 공개되기까지 약 10년이란 시간동안, 그녀는 아예 사라진 것처럼 모습을 감추고 살았다. 당연히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평범한 안부인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장르로 규정하자면 로맨틱 코미디와 가족드라마였던 전작과 달리 세 번째 작품인 <오늘>에 이르러 ‘용서’라는 주제에 몰입한 이유도 물었다. 이정향이 돌아왔다.
-<집으로...>를 끝내고 바로 <오늘>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니었나?
=아니었다. <집으로...> 개봉 당시 일이 많았다. 할머니의 가족들과 오해가 생겼고, 매스컴은 매스컴대로 왜곡하고, 나중에 제작사가 망하기도 했다.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더라. 2, 3년은 놀았고 2005년부터 정신 차리고 시나리오를 썼다. 그런데 이게 5년씩이나 걸릴 줄은 몰랐다.(웃음)
-그래도 시나리오만 쓰면서 살지는 않았을 텐데.
=잠깐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를 도와준 적은 있다. 일본에서 한 3년 정도 지내기도 했다. 한국에 있으면 사람들이 술 먹자고 불러내고, 인터넷 서핑하느라, TV보느라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 일본에 있는 친구집에서는 인터넷도 안 되고, 잡지나 TV를 봐도 모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일만 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과거를 세탁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웃음) 어떤 영화의 감독이라고 누가 말 걸고 알아보는 게 너무 불편해서 지난 10년 동안 사진 한 장도 어딘가에 오르내린 적이 없다. 정말 조용히 살았고,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었다. (웃음)
-쉬는 도중,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린 계기는 무엇이었나.
=<오늘>은 이미 데뷔 전부터 3번째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며 구성을 해놓은 영화였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미국인이 쓴 칼럼 하나를 읽었다. 콜럼바인 총기난사사건에 관한 글이었는데, 사건 바로 다음 날 학생들이 ’We forgive Mike’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사진이 있었다. 칼럼니스트는 이들은 친구들을 죽인 것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만 용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은 그들이 받은 상처라는 건 정말 미약하지 않겠나. 크게 공감했고 언젠가는 이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때 책에서 오려낸 칼럼은 지금도 갖고 있다.
-<오늘>은 준비하는 동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밀양>등이 사형제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오늘>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가.
=내가 헤드카피를 뽑는다면, ‘남의 상처에 대해서 함부로 용서를 말하지 맙시다’일 거다. 또 하나는 모든 범죄자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극중의 지민이(남지현)와 소년범은 사실상 이란성 쌍둥이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다. 지민이처럼 자기 안에서 풀거나, 소년범이 되어 다른 이를 해치거나, 아니면 아예 부모에게 풀거나. 마지막에 다혜(송혜교)가 “너가 받고 싶은 사랑을 너 스스로에게 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
-내용으로나, 분위기로나 <오늘>은 전작 두 편과 다른 영화다. 하지만 연작으로 치자면, 동거 3부작의 세 번째 작품이다.
=하하. <오늘>도 또 결국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싶더라. 특별한 집착은 아닌데, 아무래도 주인공들이 부대끼고 사건을 만들고, 화해하는 게 편한 상황이라 쓰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주인공의 부모나 형제들을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
-10년 만에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차이를 느꼈을 것 같다. 무엇이 가장 달라졌던가.
=스탭과 창작자는 여전히 영화에 대한 열망으로 만들지만, 돈 가진 자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라.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체력으로나 정신력으로나 많이 약해진 걸 느꼈다. 예전에는 영화를 찍고 있으면 밥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어지러웠다. 스탭들에게 4번째 영화는 도저히 못 만들겠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다. (웃음)
-어쨌든 세 번째 작품이 나왔다. 다음 영화는 몇 년이 걸릴까?
=<오늘>은 마지막 작품이라는 각오로 만들었다. 만약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영화는 <오늘> 만큼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2, 3년에 한 편씩 만들지 않을까? 문제는 내가 50살이 되더라도 20대가 어떤 영화를 좋아할지를 살피면서 영화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 사회에 필요할 것 같은 이야기, 무엇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