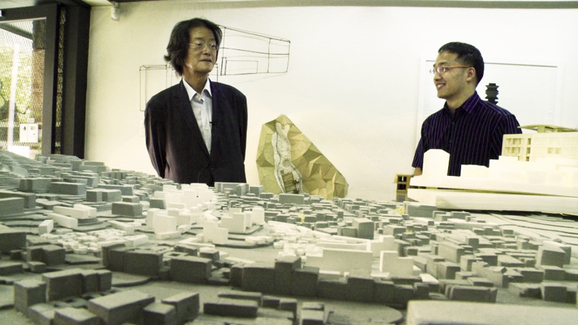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업 중 ‘다양성영화 전문 투자조합’(이하 조합) 출자가 있다. ‘다양성영화의 투자 확대를 통해 제작을 활성화하고 배급/상영 생태계 조성과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진위는 아마도 다양성영화 유통망 ‘아트플러스 시네마 네트워크’(이하 아트플러스)가 구축되었고 다양성영화 마케팅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활동하면 선순환 구조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 듯하다.
영진위의 기대대로라면 조합의 투자로 제작된 영화가 아트플러스 등을 통해 적잖이 유통되고, 적당한 수익도 보고 있어야 한다. 아니 최소한 손익분기를 맞추는 영화들이 매년 한두편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아트플러스를 통해 유통된 조합 투자영화는 많지 않다. 성공한 독립영화로 꼽히는 <워낭소리> <똥파리>나 올해 많은 관객이 본 <말하는 건축가> <두 개의 문> 등은 조합과 별 상관이 없다. 2개의 조합이 여전히 9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작 다양성영화 유통망으로 투자받는 영화는 많지 않다? 뭔가 조금 이상하다.
투자조합은 기본적으로 가능성있는 곳에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활동이다. 다양성조합도 당연히 수익발생 가능성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제작비 2억원의 영화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배급을 위해 순제작비의 25% 정도를 투자하면 총제작비는 2억5천만원, 같은 금액의 총수익을 올려야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한국영화시장은 상영시장과 부가시장의 매출이 대충 7:3 정도이니, 상영시장에서 70%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만여명의 관객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이 가정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조합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은 어떨까? 아트플러스를 중심으로 유통된 다양성영화 중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영화의 관객 수는 1만~2만명 선. 2만명이면 상영시장 수익은 대략 7천여만원, 부가시장에서 동일한 수준의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해도 총수익은 1억5천만원 정도다. 이것이 현재 아트플러스 중심의 유통에서 성공한 영화의 기대수익이다. 앞의 가정과 현실의 괴리가 꽤 큰 셈이다.
다양성영화 유통망이 (수익은 둘째치고)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수익률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다양성영화 유통망에 다양성조합이 투자한 영화가 없는 것이 되레 자연스러울 정도다.
다양성영화 진흥을 공유하는 투자조합 사업과 유통망 사업간의 이런 괴리는 현재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정책이 섬세하게 설계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양성조합의 투자영화든, 독립영화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아트플러스를 통해 개봉하는 영화들은 애초에 수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러니 “저예산영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영진위가 구축한 다양성영화 유통망에 기대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2011년 영진위가 발표한 ‘영화진흥사업 중장기 계획’에는 ‘다양성영화 지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창한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내용은 빈약하다. 실제 현장에 기대와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소한 저예산영화가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닐까?
현재 운영 중인 다양성영화 전문 투자조합에는 2008년 결성된 40억원 규모의 소빅다양성영화전문투자조합과 2010년 결성된 50억원 규모의 캐피탈원다양성영화전문투자조합이 있다. 소빅은 2013년이 만기이며, 캐피털원은 2015년까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