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lmography
<소원>(2013), <건축학개론>(2012) 각색, <우리 이웃의 범죄>(2010) 윤색, <우리집에 왜왔니>(2009), <헨젤과 그레텔>(2007) 각색, <안녕! 유에프오>(2004), <MBC 베스트극장-눈물보다 아름다운 유산>(2002), <인디안 썸머>(2001)
“왜 다시 이 얘길 끄집어내 상처를 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 말의 행간을 살피자면, 분명 우리 혹은 누군가가 당사자에게 한번 상처를 줬으니 두번은 상처받게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닐까. 그럼 두번 상처주지 않는 걸로 답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 존재했던,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비극을 스크린으로 옮겨오기까지 작가에겐 분명 많은 고뇌와 한숨이 있었으리라. 김지혜 작가가 처음 <소원>의 각색을 맡게 됐을 때 <소원>은 아빠(설경구)의 영화였다. 작가는 왜 아무도 당사자인 소원이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는지 의문이었다고 한다. “주체는 소원이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려 했던 아이의 선의가 짓밟힌 데서 출발했고, 그렇기에 아이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허공에 둥둥 떠다니던 시나리오”가 결국 김지혜 작가의 손에 안착한 건 “시나리오가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 “확신”한 사람이 그이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작가는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던 때를 떠올렸다. <소원>의 각색 역시 “완벽하지 못해도, 누군가는 해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연명 치료를 하실 때 사람들이 연명 치료의 의미에 대해 너무 쉽게 말을 뱉는 게 불편했다. 각색 도중엔 심장수술 뒤 회복 중이던 아버지가 느닷없이 돌아가셨다. 영화 속 소원 엄마(엄지원)의 마음처럼 괜찮냐는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았다. 우리에게 오는 모양만 다를 뿐 사람이 받는 상처는 비슷한 걸 수도 있겠다 싶었다.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지 않나. 소원이 가족에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나.” 작가는 <소원>을 통해 ‘말의 의도’에 관해 말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 결국 차곡차곡 상황을 겹쳐 “행간에 숨은 의도”를 최대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오랫동안 지켜온 그의 테마다. “영화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앞에 쌓아온 잔상의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원이가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중요하다. 그 한 장면을 위해 다른 모든 상황들이 그 순간까지 잘 와줘야 했다. 계산에 계산을 거듭한 결과다.”
데뷔 이후 십여년간 꾸준히 시나리오를 써온 작가의 처음 꿈은 <MBC 베스트 극장> 작가였다. 책을 사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는 밤마다 챙겨보는 <MBC 베스트극장>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단다. 책은 한권도 낸 적 없지만 출판사 ‘행렬이 생기는 주식회사’도 꾸리고 있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재능기부로 책을 만들어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낼 생각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잠정 보류됐다. 내려던 책은 일종의 매뉴얼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안을 불안이라고, 행복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작가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그런 ‘사전’인 것 같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작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속내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김지혜 작가는 말한다. “이 분노와 복수는 어디에서 온 거지? 이건 원래 왜 있었지? 질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 질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순간이 필요하다. 소원이가 스스로 충격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입을 열게 되기까지, 그 마음에 도달해야 하는 거다.” 소원이에게 머물렀다 떠난 작가의 다음 작품이 무엇이 될진 아직 모르겠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그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만큼 그의 마음이 닿게 되리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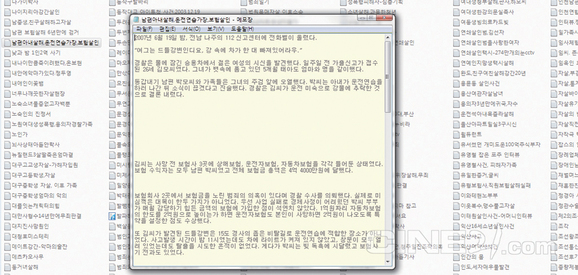
스크랩과 메모장
김지혜 작가의 컴퓨터는 지난 몇년간 벌어진 사건, 사고 기사의 스크랩으로 빼곡하다. 그는 “기사에 나타나지 않은 행간을 읽어내는 일”이 작가로서 자신이 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