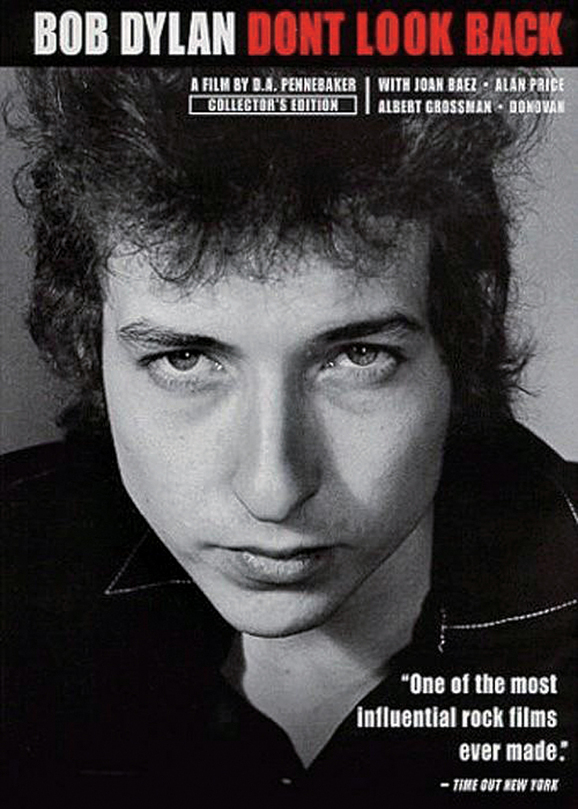
여러모로 놀라운 결과다. 올해 노벨문학상은 바로 미국의 가수이자 작곡가 밥 딜런이 수상했다. 1960~70년대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이면서도 시적인 가사의 포크 음악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는 미국 포크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수이자, 세계 대중음악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마틴 스코시즈 감독은 <BBC>의 의뢰로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 <노 디렉션 홈: 밥 딜런>(2005)을 만들었고, 토드 헤인즈 감독은 밥 딜런 특유의 시적인 가사를 줄기 삼아 그의 7가지 서로 다른 자아를 등장시킨 <아임 낫 데어>(2007)를 만들기도 했다. 그처럼 그는 음악을 넘어 당대 대중문화의 거대한 아이콘이었다. 음악평론가 배순탁이 그의 수상을 축하하며 글을 보내왔다.

과연, 예상 그대로였다. 이 글이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만났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역시 밥 딜런답다’ 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듯하다. 노벨문학상 수상이 언급된 이후 열광에 빠진 건, 언제나 그래왔듯이 밥 딜런 자신이 아니었다. 그를 둘러싼 대중과 평단이 먼저 연호했다. 수상 소식과 함께 그의 앨범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며 3일 만에 1년치 판매량을 달성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핵심은 정작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사는 이미 널려 있을 정도로 많고, 따라서 동어반복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한다. 밥 딜런은 자신의 주변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광적인 반응을 어떤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까.
대중음악의 역사는 곧 페르소나의 역사였다. 팝 역사상 수많은 스타들이 나타났다 사라졌고, 그들은 모두 제각각의 페르소나를 등에 업고 대중으로부터 녹을 받았다. 일반적으로는 프로페셔널한 능숙함이 대부분이었고, 이외에도 존 레넌이 지녔던 시니컬한 유머라든지, 프랭크 시내트라의 냉담한 태도 같은 것이 대표적인 페르소나로 손꼽힐 만한다. 그러나 단 한명, 예외적인 인물에게는 페르소나라는 게 없었다. 바로 밥 딜런이었다. 물론 우디 거스리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페르소나 비슷한 것이 있었다. 추측건대 ‘민중의 대변자’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밥 딜런은 곧 이 사실에 염증을 느끼고는 페르소나 자체를 두르지 않는 길을 택했다. 그의 자서전 <바람만이 아는 대답>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를 말해주는 증거다.
“<에스콰이어>는 나와 말콤 X, 케네디, 카스트로의 얼굴을 합친 뒤 괴물을 만들어 표지를 장식했다. (중략) 나는 세상 끝에 있는 것 같았다. (중략) 내가 반군의 리더, 저항운동의 대사제 등으로 공식 선정된 것에 진저리가 났다. (중략) 아무튼 사람들은 끔찍한 호칭들을 붙이고 싶어 한다.”
나는 영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말할 것이 별로 없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영화 <아임 낫 데어>(2007)가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람들은 밥 딜런이라는 행성에 가닿기 위해 그에게 수많은 왕관을 선사했지만 정작 밥 딜런 자신은 “나는 거기에 없다”며 행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가 쓴 문장으로 대신 설명하자면 “뭔가 일이 벌어졌는데, 넌 그게 뭔지를 모르지”(Something is happening here but you don’t know what it is)라고 노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밥 딜런의 걸작 《Highway 61 Revisited》(1965)의 수록곡 <Ballad of a Thin Man>의 가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순간에도 확정된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즉 그는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진실의 수호자라기보다는 ‘진실을 의심하는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런 그에게 정답 따위, 있을 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비평가 밥 스탠리의 말마따나 그는 “전적으로 친근하지 않은 목소리로 팬들과 평론가들의 마음속에서 빈둥거리면서 그들이 구축해놓은 자신에 대한 신화를 방해하는 걸 즐겼다.” 생각해보라. 이런 그가 노벨문학상 수상에 아주 그냥 감격하면서 “가문의 영광으로 삼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힐 것 같나?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그는 변절자인가?
밥 딜런이 자신의 음악을 통해 들려준 이야기는 무엇보다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노래하지 않는 가수들의 수호성인이라 할 그는 일체의 여과 없는 목소리로 십대의 사랑이나 사치와는 거리가 한참 먼, 진짜 위트가 살아 있는 가사들을 쓰고 노래했다. 이런 그의 노랫말은 당대의 동료들에게도 큰 충격을 던졌다. 일찍이 캐롤 킹과 함께 <Will You Love Me Tomorrow> <Up on the Roof> <Some of Your Lovin’> 등의 명곡을 쓴 작사가 제리 고핀은 밥 딜런의 음악을 듣고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렸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쓴 곡들이 얄팍하고 값어치가 없다는 자괴감 속에 갖고 있던 테이프와 바이닐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밥 딜런이 기획한 결과이기도 했다. 솔직히 밥 딜런이 가져온 급진적인 충격은 다소 위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는 일부러 곡의 의미를 모호하게 처리했고, 이게 아주 잘 먹힌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대중의 관심과 보상이라는 달콤한 열매였다. 그러나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마치 그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며 배신자의 낙인을 찍었던 1960년대 초•중반의 포크 신이 그랬다.
밥 딜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영리했다. 그는 자신을 유다라고 몰아붙였던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다. 대신 아예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그렇다. 맞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저 유명한 <Like a Rolling Stone>의 에피소드를 다시금 회상해봐야 한다.
그전에 먼저 밝혀둬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기실 그를 향한 비난은 <Like a Rolling Stone> 이전에도 움트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너무 유명해져서였다.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 <Blowin’ in the Wind>(1963)가 큰 성공을 거두자 밥 딜런은 질투심에 휩싸인 동시대의 동료들이 자신을 변절자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질투심을 가리기 위해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그가 정치적으로 너무 순진하다는 거였다. 하긴 일리는 있는 얘기였다. 당시 피트 시거가 공산주의자로까지 몰렸던 것에서 알 수 있듯, 극단적 프로파간다가 득실댔던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포크 신에서 ‘대답은 바람 속에’라는 노랫말은 좀 나이브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로큰롤에 대한 애정
그러나 더이상 밥 딜런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이 공산주의든, 매카시즘이든, 사랑과 평화의 히피 운동이든, 1960년대 미국 사회를 지배한 진영 논리에 혐오를 느끼고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꿨던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비틀스 광풍이었다. 로큰롤이 새 시대의 문법임을 깨닫게 된 그는 ‘포크 록’의 실험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갔다. 1964년 제목부터 의미심장한 《Another Side of Bob Dylan》으로 정치색을 버리더니, 1년 뒤인 1965년 <Like a Rolling Stone>을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그런데 밥 딜런의 로큰롤에 대한 애정은 그의 과거 앨범에도 힌트처럼 숨어 있었다. 예를 들어 1집에 실려 있던 <Highway 61>에는 로큰롤 클래식인 <Wake Up Little Susie>의 리프가 차용되어 있었고, 오로지 싱글로만 발표된 <Mixed Up Confusion>(1963)은 제법 괜찮은 일렉트릭 곡이었다. 비록 반응을 얻지 못한 채 시장에서 사라졌지만 말이다.
여하튼 1965년 7월25일 밥 딜런이 폴 버터필드 블루스 밴드를 대동하고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전기기타를 치기 위해 플러그를 꽂았을 때 그가 맞이한 건 관객의 야유 세례였다. 당시 포크 팬들에게 로큰롤은 멍청하고 생각 없는 뮤지션이나 하는 상업적 장르였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포크의 적자라 불렸던 밥 딜런이 로큰롤을 연주한다고? 이날 밥 딜런은 <Like a Rolling Stone>을 비롯해 세곡의 록 넘버를 연주했지만, 그사이 지난 2년 동안 같은 무대에 선 그를 민중의 영웅으로 환대했던 관객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소수의 포크 관중이 아닌 대중과 시간은 밥 딜런의 편을 택했다. 페스티벌을 며칠 앞두고 싱글로 발매되었던 <Like a Rolling Stone>은 그로부터 몇주 후 빌보드 2위, 영국 4위에 오르며 높게 비상했다. 이제 록은 더이상 청소년들이나 듣는 풋내기 음악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술적인 작업 도구였다. 해외 평단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로 밥 딜런을 비틀스와 동등한 위치에 놓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65년으로부터 40여년이 지난 후 <Like a Rolling Stone>은 <롤링 스톤>이 선정한 ‘500 Greatest Songs of All Time’ 리스트에서 당당 1위에 올랐다.
이후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1966년 밥 딜런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의문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밥 딜런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고, 앰뷸런스 역시 현장에 보이질 않았다고 한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밥 딜런만이 알고 있겠지만, 이 덕분에 그가 자신을 억누르던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했다. 그래서였을까. 다시 나타났을 때의 밥 딜런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Oh me oh my love that country pie”(1969)와 같은, 과거의 그였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사를 들려줬던 것이다. 당시 인근에 살고 있던 더 밴드와 함께 내슈빌 사운드를 추구하기도 했던 이 시기의 밥 딜런은 컨트리의 목가적인 분위기에 빠져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음악을 들려줬다. 그의 최고작 중 하나로 거론되는 <New Morning>(1970)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음반은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 베트남전에 무기력해진 나머지 공동체를 떠나 개인으로 돌아간, 당시 미국 사회의 어떤 풍경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외에 또 다른 정점으로 꼽히는 앨범이자 아내와의 별거로 인한 아픔을 당대의 미국으로 확장해서 스케치한 《Blood on the Tracks》(1975), 휘몰아치는 첼로 연주로 압도적인 청취 경험을 선사하는 곡 <Hurricane>과 한국인이 사랑하는 <One More Cup of Coffee> 등이 수록되어 있는 《Desire》(1976), 무엇보다 <Knockin’ on Heaven’s Door>를 통해 지금도 회자되는 영화 <관계의 종말> 사운드트랙 《Pat Garrett & Billy the Kid》 (1973) 등을 보면 1970년대에도 밥 딜런의 명반 퍼레이드에는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정말이지 놀라운 사실은 그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음악들을 창조해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혼돈과 거짓말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의 미래를 경멸적으로 노래한 <Time Out of Mind>(1997)와 9•11과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그의 성찰이 녹아 있는 《Modern Times》(2006) 등은 ‘귀로 듣는 시’라는, 노벨상 위원회의 선정 이유가 무색하지 않은 곡들이다.

현대의 미국 그 자체
밥 딜런은 최신작 《Fallen Angels》(2016)에서 오랫동안 미국에서 사랑받아온 12곡을 커버해 실었다. 그 어느 때보다 느긋하고 편안한 기조의, 그러나 적어도 도입부는 지나야 원곡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음악들과 과거 명곡들을 두루 감상해보면, “훌륭한 미국 음악 전통 안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라는 찬사가 어떤 의미인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밥 딜런을 선지자로 여기며 세계의 의미에 대해 알려달라고 질문했지만 애초에 그것은 대답 불가능한 질문이었다. 밥 딜런은 대신 미국이라는 나라(더 나아가서는 당신과 내)가 저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지닐 수 있게 도와줬다. 단일한 페르소나를 거부하고, 기존의 역사를 부정하며, 새로운 의미를 개척해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다.
즉 밥 딜런은 말론 브랜도의 저 유명한 대사 한줄을 빌려 “(세계의 의미를 묻기 전에) 당신은 뭘 갖고 있지?”라는 질문을 평생 동안 던져왔고, 이 질문의 수신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나라였다. 그리고 미국은, 밥 딜런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서서히 깨달을 수 있었다. 고로 비틀스가 현대의 영국이라면 밥 딜런은 현대의 미국 그 자체다. 어떤가. 노벨문학상? 줄 만하지 않은가. 자기라는 수수께끼를 풀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길 원하는 예술가답게 수신인은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