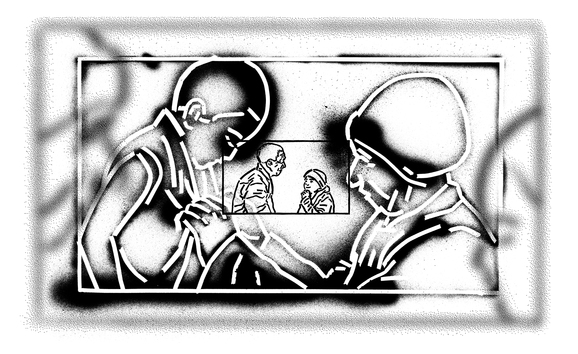
나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친다. 사람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학생들은 ‘교수님’이라고 부른다. 한자로 ‘선생’은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지만, 대개 학생을 ‘가르치는’ 이를 일컫는다. ‘교수’는 아예 ‘가르쳐준다’는 뜻을 일차적으로 품고 있는 말이다. 선생과 교수는 공히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를 가리키므로, 이 반대편에는 학생, 제자, 후학, 곧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지식을 배우는 이들이 위치해 있다. 이항대립으로서의 언어는 언제나 이 두 존재를 명확히 가른다.
과연 그럴까? 문창용 감독의 다큐멘터리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영화에는 앙뚜와 우르갼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9살 난 앙뚜는 1400년 전 티베트 캄의 수도승이 환생한 ‘린포체’, 곧 살아 있는 부처이고, 70이 넘은 우르갼은 린포체인 앙뚜의 스승이자 그를 수발하는 노승이다. 영화는 전반부에서 앙뚜와 우르갼의 인도 생활을 그리다가, 후반부에서는 린포체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티베트로 넘어가는 앙뚜와 우르갼의 여정을 담는다. 이 영화는 다양한 주제를 품고 있지만, 내게는 노승인 우르갼이 크게 다가왔다. 우르갼과 앙뚜의 관계는 겉으로는 자명해 보인다. 스승과 제자, 어른과 아이, 상징적인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이 자명해 보이는 관계는 앙뚜가 린포체라는 지점에서 달라진다. 우르갼은 9살 어린이 앙뚜를 보호하고 그에게 조언하는 어른이자 스승이자 상징적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린포체를 보필하는 안내자이자 수발 드는 하인이며, 살아 있는 부처 앞에서의 평범한 노승인 것이다.
앙뚜와 우르갼의 이 복합적 관계를 보며 나는 선생은 그저 선생인 게 아니라 학생일 때에만 진정한 선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우르갼은 어른이고 스승이고 선생이지만, 앙뚜를 존경하고 그의 고통에 동참하며, 린포체로서 앙뚜가 가진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독일어로 ‘교육’을 뜻하는 ‘erziehen’은 ‘끌어낸다’는 뜻인데, 이 영화에서 우르갼은 9살 앙뚜에게서 린포체의 신성함을 끌어내고, 앙뚜는 우르갼에게서 살아 있는 부처에 대한 경외감과 헌신을 끌어낸다. 이 둘은 모두 서로에게서 뭔가를 끌어내고 상대에게서 뭔가를 배운다는 점에서 공히 선생이자 학생이고, 어른이자 아이이며, 아버지이자 아들인 셈이다.
눈 덮인 산을 함께 넘어 앙뚜를 큰 사원에 맡기고 떠나는 우르갼을 보며 나는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건 선생과 학생의 관계라는 게 언제나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즉 학생과 선생은 새로운 가르침과 배움을 만나기 위해 기존의 선생과 학생을 떠나고 떠나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가르치고 배우고, 만나고 떠나는 이 선생과 학생, 어른과 아이,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이분법을 초월한 후 결국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될 뿐이다. 내게 이 영화의 감동은 바로 이 ‘우리’라는 말에 담긴 깊은 의미와 울림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휴머니즘적이라기보다는 ‘불교적’인 감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듯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