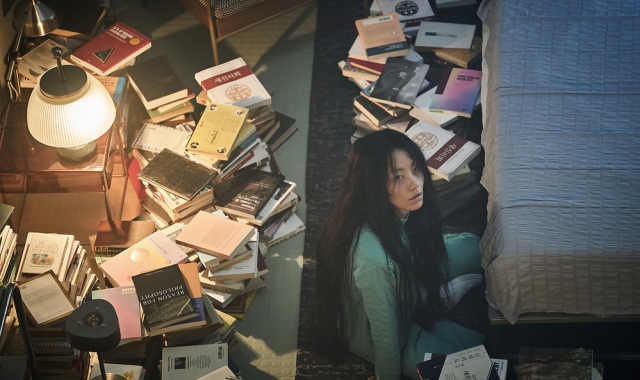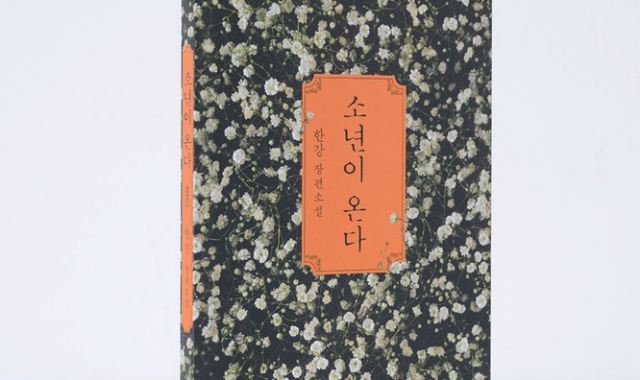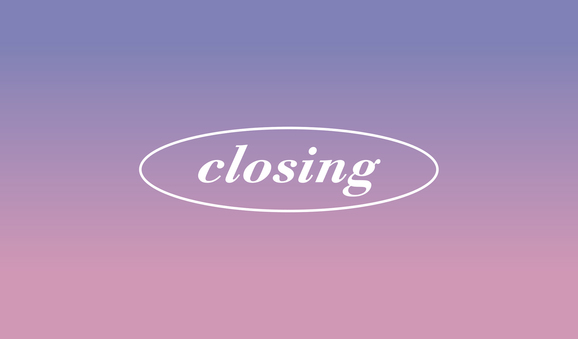
우리 일상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주기성’이다. 아침 해가 뜬다. 일어난다. 양치질을 한다. 옷을 차려입는다. 지하철을 탄다. 책상에 앉는다. 점심을 먹는다. 다시 책상에 앉는다. 지하철을 탄다. 저녁을 먹는다. 텔레비전을 틀거나 휴대폰 혹은 태블릿을 연다. 졸음이 쏟아진다. 양치질을 한다. 침대에 눕는다. 다음날 아침에도 다시 또 해가 뜰거라 믿으며, 잠 속에 빠져든다.
특정 시간대에 비슷한 모양으로 반복되는 이런 일상은 지겹고 따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삶에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주기적이지 않은 것들은 대체로 비일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주기성을 깨는 활동이나 사건은 주로 대단히 비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것들은 종종 유쾌함을 주기도 한다. 일상이 멈춰 선 그곳에 아주 가끔 시쳇말로 ‘깜놀할’ 즐거움이 끼어들 때도 있기는 하나, 대개의 유쾌함이란, 마치 오랫동안 기획하고 준비했던 여행처럼 일상의 주기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결과로서 얻어진다.
아주 가끔 찾아오는 (또는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한) 비일상적 유쾌함을 기약하며, 반복되는 일상의 고통과 지겨움을 이겨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혹은 지루하고 덤덤하게 회전하는 일상이 쌓이고 쌓인 덕분에 소중한 즐거움이 얻어질 수 있는 거라며 감사해하는 이도 있을 테다.
내 경우엔 그런 반복 자체를 기꺼워하는 편이 다. 월화수목금토 각각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일요일은 그런 일들을 위해 따로 떼어둔 일종의 여분(스페어)이자 완충판으로 받아들인다. 누군가의 일상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되지만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아니 달리하려 노력한다. 대단한 비일상을 기획하고 준비하기에 마땅치 않은 삶을 살다 보니 스스로 만들어낸 자디잔 파격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덜 고통스럽고 덜 무료하면서 원하기만 한다면 나름의 주관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는 종류의 주기적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맞다. 내가 잘해내서라기보단 그나마 그럴 수 있는 조건 덕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무 래도 옳은 것 같다.
약간 먼 길을 오가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한 심리학자의 행복론을 들었는데, 이런 나의 대처에 나름의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근거가 있었던가 보다. 아주 가끔 주어지는 높은 강도의 비일상적 즐거움에 의존하기보다, 주기적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낮은 강도의 충족을 찾아 이름표를 붙여두고 그것을 기억하여 반복하는게 행복(감)의 총량을 높이는 더 낫고 현명한 길이라고 한다.
마침 그날은 피하고 싶은 의무를 행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그 길 끝에는 도무지 유쾌하달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돌아올 때쯤이면 그래도 의무라는 이름의 달력 한장을 뜯어낼 수 있었을 테다. 오가는 길의 산이 싱그럽고, 하늘은 파랬다. 비가 왔다 해도 그건 또 그대로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