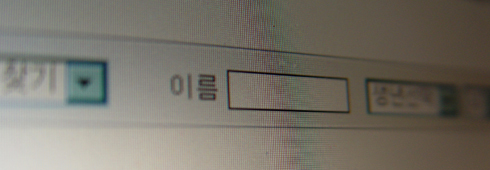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부인은 예쁠까?. 아이는 있을까?.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시집은 갔겠지?. 남편은 뭐하나?. 여전히 예쁠까?. 궁금해서 뭐하겠냐 만은 우리는 가끔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지나간 사랑의 소식이, 끝나버린 관계의 잔해들이, 한때는 만개했지만 지금은 부서져버린 꽃들의 자취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보다 비생산적인 궁금증이 있을까 만은, 우리는 그런 소득 없는 것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참 실없는 동물들이다.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이 궁금증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인터넷이란 친구는 이런 무형의 궁금증을 너무나 손쉽게 유형의 뉴스로 둔갑시키고야 만다. 몇 번의 클릭을 거치면 눈 앞에 그녀의 현재사진이, 그의 일기장이 펼쳐지는 세상에 살면서 누군들 이 ‘스토킹’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옛 연인을 찾아떠나다

그러나 오랜만에 장편 극영화를 선보인 짐 자무쉬의 <망가진 꽃들> (Broken Flowers)의 주인공 돈(빌 머레이)은 컴퓨터사업으로 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관한 호기심은 도통 없는 남자다. 아니, 지난 사랑은커녕 세상만사 궁금한 게 없는 무기력한 상태다. 그는 첫 장면부터 여자친구(줄리 델피)가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멍하니 서서 이별을 받아들이고 삭막한 거실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다가 결국 잠이 들고야 만다. (물론 이 남자의 모습 뒤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서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 중년남자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최근 빌 머레이는 웨스 앤더슨의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생활>에서도 ‘중년의 위기’라는 바다에 빠져있다가 가까스로 구출된 남자를 연기한 바 있다. 세월이 갈수록 무표정 속에 만가지 표정을 짓는 법을 알아가는 그를 보고 있자면 배우 스스로가 여러 작품을 걸쳐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바로 이 날, 돈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한다. 분홍색 편지지에 타자기로 곱게 쓰여진 이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당신과 20년 전 이별 할 때 임신을 했었고 몰래 아이를 키워왔다. 그 아들이 19살이 되었고 얼마 전 무작정 집을 나갔다. 아마 아버지를 찾아 떠난 것 같다”는 것.
그러나 이 충격적인 편지에는 발신인이 없다. 물론 이 남자가 그 발신인을 궁금해 할 리도 없다. 오히려 이 의문의 편지에 신이 난 건 옆 집 남자 윈스턴이다. 다섯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각종직업에 종사하는 와중에도 남의 사생활까지 간섭할 시간이 남아도는 이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은 친구 덕분에, 남자는 내키지 않는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분홍 편지지를 썼으니까 찾아가는 모든 여자들에게 분홍 꽃을 선물해. 그리고 그녀들의 반응을 체크해 보는 거야” 라며 윈스턴은 ‘엄마 후보’에 오른 여자들의 주소와 자료를 건넨다. 비행기를 타고, 렌트카를 몰아, 지도를 뒤져가며 찾아간 옛 여자들 앞에서 정작 이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저 그녀들의 주변에서 아들의 흔적을 슬며시 확인하거나, 타자기를 쓰는지를 무심히 확인해보는 정도가 다다. 20년이란 긴 세월은 “그때 왜 나를 떠났어?” 나 “내가 뭐가 문제였지?”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같은 질문의 유통기한 역시 만료시켜버렸다.
그렇게 분홍 꽃이 안내하는 가운데 돈은 지난 연애의 흔적을 찾아가지만 그 꽃들은 지금 거기에 없다. 어떤 꽃은 시들었고, 어떤 꽃은 향기를 잃었으며, 어떤 꽃은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발견한다. 벌을 유혹하지도, 꽃씨를 날릴 의지도 없는 조화가 되어버린 것은 정작 중년의 자신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가끔 무덤 앞에서 운다. 무덤 앞에서 그리워한다.
한 때 같은 궤도를 따라 함께 돌던 사람들도 이별을 하면 각자 다른 궤도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 우연히도 그 두 궤도가 부딪힌다. ‘인연’ 일수도’ ‘우연’일 수도 혹은 ‘사고’ 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의 현재를 확인하고 난 이후는 상상보다 로맨틱하지 못하다. 그가 여전히 결혼을 안 했다 해도, 부인이 박색이라 해도, 아직 아이가 없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 것인가. 그녀가 노처녀로 늙고 있어서, 남편이 무직이라서, 예전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다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냔 말이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혹은 많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대단한 용기가 있지 않고서야 추억은 현실을 지탱하는 양식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무덤을 판다고 해도 나오는 것은 썩어버린 살갗과 영혼 없는 뼈다귀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무덤 앞에서 운다. 무덤 앞에서 그리워한다. 그러나 정작 되돌리고 싶은 것은 그 무덤 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절의 자신 일지도 모른다. 대학시절의 첫사랑이 아니라 그 눈부신 시절의 생기를, 미치게 사랑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열정 속에 기꺼이 빠져있을 수 있었던 그 무모한 용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는지 모른다.
어느 잠 못 드는 밤, 웹사이트 작은 검색 창에 그들의 이름을 치고 조심스럽게 검색 버튼을 누르고 있는 우리의 손가락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토록 위대한 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있는 한 이 못 말리는 고질병엔 약도 없다. 그러나 지금은 없는 꽃들을 찾아가는 여행은 그쯤으로 충분하다. 이제, 컴퓨터를 끌 시간이다. 그리고 돌아본 등 뒤에 활짝 피어있는 바로 그 꽃에 물을 줄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