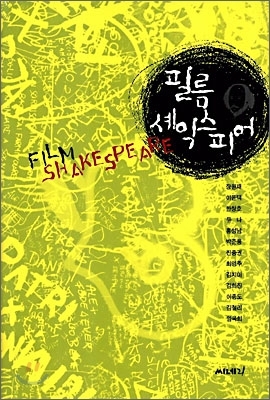
이윤택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셰익스피어가 살아 있다면 틀림없이 영화 시나리오를 썼을 것이고, 스스로 영화 감독, 제작자 역할까지 도맡았을 것이다.” 실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글 뿐 아니라 극단을 경영하거나 시대의 취향을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확연히 셰익스피어의 생명력은 여전하고, 21세기 영화 또한 그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않다. 셰익스피어극 가운데 <존 왕>(영국)이 1899년 처음 영화화 된 이래 지난해 <베니스의 상인>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많은 시나리오를 제공한 작가로 기네스북에 실려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필름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뿌리 둔 세계 명화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듯한 열셋 필자의 글로 묶었다. 짐작할 수 있는 건, 대가의 원작이 갖는 완벽함과 권위에 새로운 영상 언어로 맞서는 일의 어려움이다. 그 반역의 전거는 오손 웰즈의 <오셀로>가 마련한 듯 하다. 영화평론가 홍성택은 이 영화를 두고 “인물의 대사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착하는 카메라가 주도적인 통제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하는데, 주인공의 뒷모습, 그림자를 담거나, 공간적 미장센으로 심리를 그려낸 영상 언어가 셰익스피어의 화려한 수사를 대신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영화를 겨냥한 ‘형식주의적 데카당스’란 비난만큼 되레 이후의 셰익스피어극의 영화적 활용과 향유의 가능성을 잘 빗댄 말도 없단 설명이다.
미미한 반역의 파장은 이렇다. 진중권은 <프로스페로의 서재>(피터 그리너웨이 감독)를 분석하며, 영화에서 펼쳐지는 마술적 사실주의, 이성과 환상이 공존을 의미하는 ‘마니에리스모’의 영화적 실현이 이미 <템페스트>에서 구해짐을 확인시키고, 이종도 씨네21 기자는 <아이다호>(구스 반 산트 감독)에서 <헨리 4세>의 그림자를 건져내기도 한다. 극단적 형식미로 삶의 리얼리티를 구가한 구로사와 아키라의 ‘동양판 <맥베스>’라 할 <거미집의 성>과 폭력, 에로티시즘으로 포장한 로만 폴란스키의 ‘서양판’ <맥베스>의 차이(이윤택 감독)는 또한 어떤가. 영화평론가 한창호, 연극연출가 김철리 등도 저마다 셰익스피어의 영화 속 또 다른 얼굴을 들추며, 파장의 범주를 가늠함은 물론이다.
셰익스피어극은 끝없이 잉태되고 교배 되어 왔다. 셰익스피어를 규정하는 단 한 마디일 것이다. 한 여인을 내세워 셰익스피어의 감춰진 삶이 제 원작의 모티브가 됐다고 유쾌하게 상상하고 비유하며, 그야말로 할리우드식(대중상업적)으로 셰익스피어를 ‘구해냈다’는 김희진의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 대한 고찰도 그런 점에서 즐겁다. 씨네21이 내놓은 두번째 단행본이다. 1만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