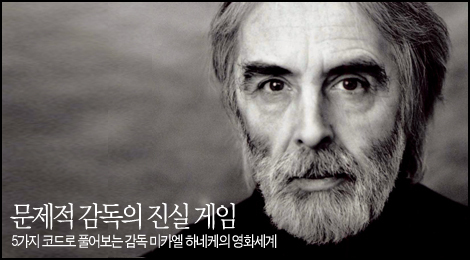
현대 유럽 영화계의 가장 논쟁적인 작가. 미카엘 하네케의 신작 <히든>이 3월30일 개봉한다. 프랑스 중산층 지식인의 위선을 파헤치는 매서운 스릴러 <히든>은 하네케 세계의 종합이자 미학적 절정에 달해 있는 작품이다. 하네케는 언제나처럼 흔들리지 않는 카메라로 멈추어선 채 주인공들을 쥐고 흔들며, 동시에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에게도 고통스럽지만 지적인 게임을 제안한다. 데뷔작인 <일곱 번째 대륙>으로부터 <히든>에 이르기까지, 지난 17년간 하네케가 만들어온 모든 작품들로부터 5개의 코드를 뽑아 그의 세계를 되짚었다. 함께 실린 서면인터뷰는 폭력과 선동의 작가로만 알려진 하네케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켜본다. 숨어서 지켜본다. 카메라는 파리의 한 골목에 있는 중산층 가정집의 정면을 지켜본다.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지켜본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관객은 깨닫는다. 그들이 지켜보는 이미지는 주인공인 조르주와 안느가 지켜보는 비디오 테이프 속 이미지라는 사실을. 테이프에 담긴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통상적인 스릴러영화라면 조르주와 안느는 비디오를 보낸 자를 찾아내고, 관객은 안도감을 느끼며 극장을 나설 것이다. 하지만 하네케는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는다.
<히든>은 전형적인 미카엘 하네케의 영화다. 그는 언제나 온화한 중산층 가정으로 침입해 들어가고, 가정은 외부의 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내부로부터 자멸해들어간다. <히든>의 주인공들도 똑같은 운명을 겪는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은 조르주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기억을 거슬러 오르도록 만들고, 어린 시절에 자신의 계략에 의해 쫓겨난 알제리인 입양아 마지드의 복수극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마지드를 찾아가서 협박을 늘어놓지만 테이프는 계속해서 보내진다. 조르주는 마지드와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 무혐의로 풀려난 마지드는 조르주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고, 조르주의 눈앞에서 죽는다(이 대목을 스포일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네케의 영화는 스포일러의 의미가 희박하다). 그러나 테이프는 여전히 보내진다. <히든>은 하네케가 조르주와 관객에게 동시에 건네는 지적인 게임이다.


그간 하네케는 <피아니스트>와 <퍼니 게임>으로 인해 영화 역사상 가장 사디스틱한 작가 중 한명으로 지칭되어왔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오해에 가깝다. <히든>이 비록 무시무시한 충격 효과를 딱 한번 관객에게 전해주기는 하지만 그보다 불편한 영상 폭력을 가하는 감독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를 사디스틱한 작가라고 일컫는다면, 하네케의 영화가 끊임없이 관객의 윤리적 취약함을 두들긴 뒤에 해결방도도 주지 않은 채 극장 밖으로 떠나보내는 탓이다. 사실 이같은 하네케의 영화적 소통방식은 데뷔작인 <일곱 번째 대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미카엘 하네케는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성장했다. 대학에서 정신분석과 철학을 공부한 그는 1967년에 극작가로 경력을 시작했고, 1970년에 오스트리아 TV와 극단에서 프리랜서 감독으로 일했다. 재능있는 TV연출가로 이름을 날리던 그의 스크린 데뷔작은 <일곱 번째 대륙>(1989)이었다. 여기서부터 하네케의 경력은 손쉽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데뷔작으로부터 <베니의 비디오>(1992)와 <우연의 연대기에 관한 71개의 단편>(1994)을 거쳐 <퍼니 게임>(1997)에 이르는 오스트리아 시절, 그리고 <미지의 코드>(2000)로 막을 열고 <피아니스트>(2001)와 <늑대의 시간>(2003)을 거쳐 <히든>까지 도달한 국제적 작가 시절이다. 이른바 ‘결빙 삼부작’(Glaciation Trilogy)이라 불리는 초기작들은 <히든>과 마찬가지로 미시적인 ‘가족’을 파고들어 결국 중산층 가족의 허위를 벗겨낸다. 국제적인 악명을 안겨준 <퍼니 게임> 이후, 하네케는 오스트리아를 떠나 프랑스 영화계에 정착했다. “이전작들이 ‘내전’영화들이라면, 프랑스로 건너온 이후에 내가 만든 영화는 ‘세계대전’ 영화”라는 하네케의 말처럼, 그는 유럽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지평을 넓힌다.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처음으로 데뷔했던 <미지의 코드>는 당시 통합의 시대를 맞이한 유럽사회를 괴롭히는 계층간의 소통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늑대의 시간>과 <히든>은 9·11 사태 이후 서구사회의 윤리적 붕괴를 다루는 일종의 재난영화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의 작품군 중에서 예외적이라 할 만한 <피아니스트>를 제외한다면 하네케의 영화들은 일정한 공통의 코드를 지니고 있으며, 연대기를 따라 몇 가지 반복되는 코드를 짚어내는 순간 하네케가 던지는 질문은 더욱 또렷해진다.
코드1 - 반(反)정신분석학/ 하네케는 설명하지 않는다

하네케의 데뷔작인 <일곱 번째 대륙>은 일가족의 집단 자살을 그리는 영화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예고도 없이 자살을 결심한다.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수고 자르고 찢은 뒤 그들은 독극물을 마시고 죽는다. 하네케는 자살을 결심하고 행하는 가족의 정신상태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가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일상과 자살의 과정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다. 두 번째 작품 <베니의 비디오>는 한 소년의 살인행각을 보여준다. 소년 베니는 중산층 부모의 근사한 아파트에서 매일 비디오 장비를 매만지며 소일한다. 그는 우연히 만난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돼지 잡는 총으로 죽이고 모든 과정을 캠코더에 기록한다. <우연의…>는 한 소년이 권총을 들고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학살을 벌이는 시간까지, 학생과 희생자들의 일상을 71개의 시퀀스에 별다른 첨언없이 담아낸다. ‘결빙 삼부작’이라 불리는 초기작들에서 드러나는 하네케의 고유한 특징은 파국으로 치닫는 인물의 내면에 전혀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캐릭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각본으로 쓴다. 그 이상은 쓰지 않는다. 이것이 왜 내가 나의 영화들을 반(反)정신분석학 영화라고 일컫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정신분석학적인 설명은 관객을 안심시킨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는 인물들이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시도는 감독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를 스스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감독의 역할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코드2 - 폭력/ 하네케는 선동하지 않는다
하네케에게 선동가(Provocatuer)라는 악명을 씌운 것은 논쟁적인 스릴러 <퍼니 게임>이다. 1997년에 칸영화제서 열린 <퍼니 게임>의 시사회는 야유와 박수가 오갔다. 빔 벤더스를 포함한 수많은 관객이 영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상영 중에 자리를 떴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하네케에게는 처음으로 맛보는 국제적 주목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객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폭력적인 영상이 아니라 관객에게 야유를 퍼붓는 듯한 영화의 어조였을 것이다. <퍼니 게임>은 당시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르던 할리우드영화들(<내츄럴 본 킬러>나 타란티노 계열의 작품들)처럼 폭력을 탐구하는 장르영화들과 닮아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반(反)장르, 반(反)스릴러영화다. 실상 <퍼니 게임>에서 폭력의 사용은 극도로 자제되어 있다. 여러모로 <퍼니 게임>과 비슷한 초기작 <베니의 비디오>도 마찬가지다(두 작품 속 살인마는 모두 오스트리아 배우 아르노 프리츠가 연기하고 있다). 베니가 소녀를 죽이는 장면은 캠코더 화면을 통해 어슴푸레 보여질 뿐이다. 하네케 작품 속의 폭력은 대부분 카메라 밖에서 일어난다. 예외적인 <히든>의 자살장면은 카메라 안에서 벌어질지언정 희생자는 카메라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사실 하네케는 폭력의 직접적인 삽입을 불편해하는 감독이다. “질문은 ‘어떻게 폭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객이 폭력을 마주하고 있는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게 만들 것인가’다”라는 말에서도 보이듯, 그가 폭력적인 소재를 끌어쓰는 이유는 관객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다. 하네케는 관객을 폭력적인 장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세우고, 그래서 하네케의 영화는 폭력에 대한 매혹없이도 폭력에 대해 사유할 자유를 쟁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