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어린 시절 읽었던 소설의 희미한 기억으로, 혹은 한물간 옛날영화에 대한 추억 정도로 존재하던 해적이 다시금 스크린을 장악하게 될 줄이야. 디즈니랜드의 라이드를 모태로 탄생한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는 십중팔구 실패할 것이라는 항간의 예측을 뒤엎으며 6억5천만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전편의 성공에 힙입어 제작된 속편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은 1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기록하며 흥행 성적을 경신했다. 10여년 전 <컷스로트 아일랜드>의 재앙에 가까운 흥행 참패 이후 사실상 고사 상태에 이르렀던 해적영화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시점에, 놀랄 정도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대체 왜, 어떤 점이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일까. 5월24일 3부작의 마지막 편인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가 개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무엇이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그 수수께끼의 배후를 추적해보았다.
조롱 혹은 냉소, 시리즈의 시작은 그러했다. 해적영화라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장르를 끌어오는 것도 모자라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를 영화화한다니. “왜, 아예 매직 마운틴(디즈니랜드의 롤러코스터)을 영화로 만들지 그러냐”는 식의 비아냥거림부터 “대체 <컷스로트 아일랜드>를 보고도 배운 것이 없냐”는 싸늘한 냉소까지, <캐리비안의 해적>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실패할 것이 뻔한 무모하고 어리석은 기획으로 취급받았다. 디즈니는 곧장 흥행의 귀재라는 제리 브룩하이머를 제작자로 영입했지만, 먹구름은 쉬이 걷히지 않았다. 브룩하이머가 감독 자리에 앉힌 고어 버빈스키는 광고계에선 알아주는 재원이었으나, 할리우드에 진출한 뒤엔 <마우스 헌트> <멕시칸> 등의 범작을 거쳐 <링>으로 한번의 안타를 날린, 가능성이 보이는 정도의 감독이었고, 조니 뎁은 연기적 재능과는 별개로 블록버스터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배우였다. 캐스팅 당시만 해도 올랜도 블룸은 <반지의 제왕>으로 스타덤에 오르기 전 무명에 가까운 신인이었고, 키라 나이틀리는 <슈팅 라이크 베컴>의 귀여운 여자아이 정도로 소소한 지명도를 얻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캐리비안의 해적>에 승선한 선원들은 “최후의 해적영화를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슴에 안은 채 항해를 시작했다. 악천후 속에 작동하지 않는 나침반을 지침 삼아 항해를 시작한 블랙펄처럼, 위태로운 출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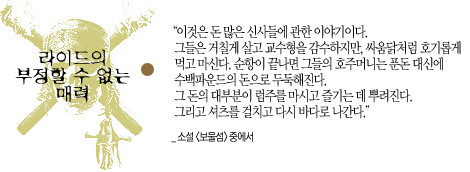
일찍이 <보물섬> <피터팬> 등 소설의 책장을 넘나들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해적은 본래 할리우드가 사랑한 악당이었다. 무성영화 시대, 당대의 스타 더글러스 페어뱅크스가 출연한 <검은 해적>(1926)은 대히트를 기록했고, <블러드 선장>(1935)으로 스타덤에 오른 미남 배우 에롤 플린은 <씨호크>(1940)로 해적영화의 성공을 견인했다. 역사상 해적들의 전성기가 17세기였다면, 해적영화의 전성기는 50~60년대에 도래했다. 에롤 플린 주연의 <파비안 선장의 모험>(1951) <모든 깃발을 향하여>(1952), 버트 랭커스터가 출연한 <진홍의 도적>(1952) 등을 비롯해 해마다 해적영화들은 지침 없이 쏟아져 나왔고, 블랙 비어드, 윌리엄 키드 등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해적들이 앞다투어 스크린을 방문했다. 우후죽순 3~4편의 속편을 토해내며 번성하던 해적영화는 그러나, 진부한 자기 복제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80년대 이후 특수효과를 동원한 SF영화들이 극장가를 점령하면서부터는 더이상 찾아보기가 힘든, 낡은 장르가 됐다. 물론,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존재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신통치 않았다. 로만 폴란스키는 <대해적>(1986)으로 흥행에 참패했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후크>(1991)로 본전을 살짝 상회하는 미지근한 성과를 올렸다. 무엇보다도 재앙에 가까운 참패를 기록한 것은 지나 데이비스가 여성 해적으로 등장한 <컷스로트 아일랜드>(1995)였다. 1억달러에 가까운 제작비를 퍼부어 고작 1천만달러의 수입을 올린 <컷스로트 아일랜드>는 제작사를 파산 상태로 내몰았고, ‘사상 최악의 실패작’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치욕마저 겪어야 했다. 자연스레, 해적은 할리우드에서 금기에 가까운 존재가 됐다.

스크린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한 해적은 그러나, 놀이공원이라는 공간 속에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였다. 월트 디즈니가 생전 마지막으로 기획해 1967년 오픈한 디즈니랜드의 라이드 ‘캐리비안의 해적’은 40년 이상 장수하며 전세계적으로 5억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오디오 애니메트로닉스’(Audio-Animatronics)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한 ‘캐리비안의 해적’은 녹음된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실물 크기의 인형을 선보였고,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말하는 해적들의 세계를 유람했다. 40년 전에는 혁신적이었으되, 이제 더이상 새롭지도 짜릿하지도 않은 낡은 놀이기구가 되었건만, 라이드에는 변함없는 애정이 쏟아졌고 팬층은 두터워졌다. 라이드에 헌정된 홈페이지들도 무수히 생겨났다. 여기에는 분명 부정할 수 없는 매력이, 그리고 무엇보다 상품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왜 사람들은 이 케케묵은 라이드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라이드에서 영화로
① 노래: 라이드의 테마송인 <A Pirate’s Life for Me>가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에 세번 등장한다. 영화의 첫 장면 엘리자베스가 어린 시절에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잭과 엘리자베스가 무인도에 갇혔을 때,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잭이 나침반을 닫을 때.
② 장면: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열쇠를 문 개를 향해 뼈다귀를 흔드는 장면, 잭의 심복 깁스가 술에 취해 돼지우리에서 자고 있는 장면은 라이드에서 인기를 끌던 상황극을 고스란히 옮긴 것이다.
영화에서 라이드로
① 캐릭터: 디즈니랜드는 2006년 시리즈 2편 개봉 시기에 맞춰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추가로 선보였다. 잭 스패로우와 바르보사, 데비 존스가 오디오 애니메트로닉스 인형으로 만들어졌고, 조니 뎁과 제프리 러시, 빌 나이가 직접 녹음한 목소리가 대사로 흘러나온다.
② 소품: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에서 저주받은 아즈텍의 금화를 담았던 상자,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에서 유령처럼 선상을 떠돌았던 엘리자베스 스완의 드레스가 영화 속 소품 그대로 라이드 무대에 놓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