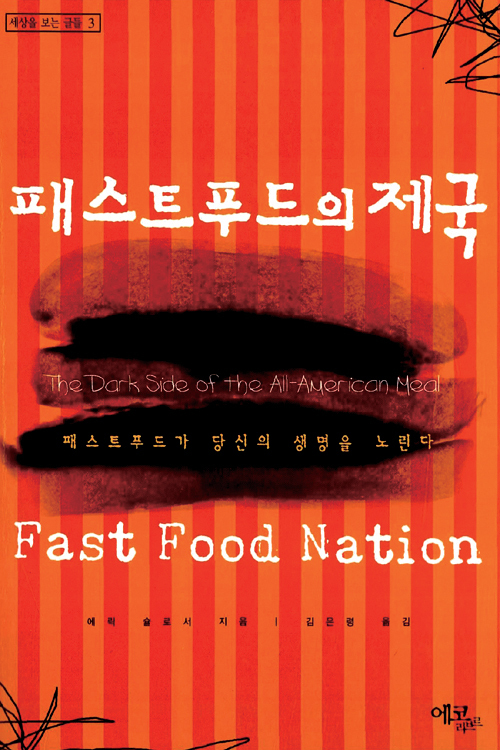
1. 신문에 삽지로 들어 있는 동네 슈퍼마켓 할인 광고지를 읽는 엄마의 눈매는 ‘몰입’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세상 모든 할인 안내 전단에 대해 다 그렇다. 어디서 뭘 싸게 팔고 있다는 화제는 지치지도 않고 입에 오른다. 당연하게도 얼마 전에는 통큰 치킨이 화제에 올랐다. 할인폭이 큰 곳은 거의 대형 할인매장이다. 뭐든 싸야 팔린다. 마트나 패스트푸드점에서 ‘1+1’이라는 문구, 선물 증정 이벤트를 볼 때면 자동으로 시선이 가는 건 나 역시 마찬가지다.
2. 7년쯤 전이었나, 뉴욕 여행을 갔던 때 맥도널드 매장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혼자 하는 여행이라 번듯한 레스토랑에 자리잡기도 애매했고, 무엇보다 먹을 돈으로 보거나 사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다리가 아플 때면 늘 타임스 스퀘어 맥도널드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변방예의지국에서 온 단벌 여행객에게 맥도널드는 꿈이요 희망이요 집이자 구원이었던 셈이다. 어디서도 그 가격에 테이블까지 차지하고 끼니를 때울 수는 없었다.
3. 문제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과연 지금도 통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맛이 없다면 맥도널드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사먹고 탈이 나기 일쑤라면 1+1이나 할인 광고를 보고도 혹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싸고도 맛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드는 의문점은, 그래서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거창하게 지구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솔직하게는 내 몸을 위해 옳은가, 그리고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 정도를 벗어난 인력운용이 가해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에 마음이 쓰인다.
한때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푸드의 제국>을 이번 연휴 동안 독서로 정한 건 그런 고민 때문이었다. 모건 스펄록 감독의 자가 생체실험 다큐(?) <슈퍼사이즈 미>를 본 사람이라면 패스트푸드에 관한 비판적 논픽션이라는 말에 영양 불균형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패스트푸드의 제국>은 그보다는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극영화 <패스트푸드 네이션>에 가깝다. 패스트푸드 산업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몰락하는 목축업자들과 자살하는 카우보이들, 대를 이어 가난을 물려받고 패스트푸드를 컴포트 푸드(comfort food)로 삼게 되는 십대들, 패스트푸드점 카운터 일을 전전하며 숙련공이 될 기회를 평생 갖지 못하는 사람들, 기계처럼 도축하며 (지나치게 자주) 기계의 희생양이 되고야 마는 도축 공장의 이민 노동자들. 남들 다 읽은 책을 뒤늦게 읽고 뒷북을 치고 있는 기분이기는 하지만, 가격 경쟁은 이 책이 처음 선보였던 때보다 더욱 심해졌고… 아직 읽지 않은 분이라면 꼭 일독하시길.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문석 편집장이 곁들여 권하는 책은 <잡식동물의 딜레마>와 <식품 주식회사>이고 나는 빈부격차에 따른 식단 운용의 현실에 관해서라면 <죽음의 밥상>을 재미있게 읽었으니 참고하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