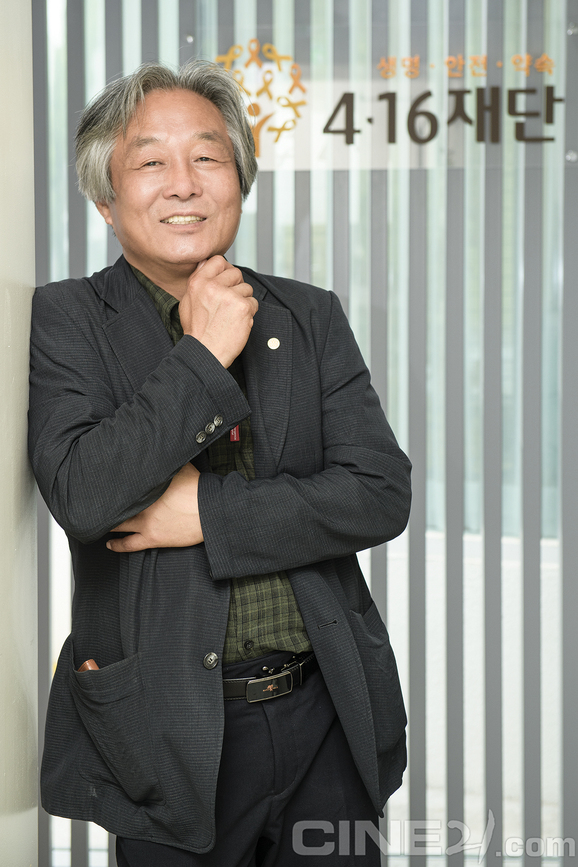
- 지난해 공모전 다큐멘터리 수상작 <장기자랑>이 편집 막바지에 들어갔다. 시나리오를 심사할 때 어떤 점이 눈에 띄었나.
=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작품이다. 유가족이 모여 노래하고 연극하는 풍경 자체가 새롭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유가족이라고 매일 울고 살 순 없다. <장기자랑>은 이야기 자체로 재미있으면서 아프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 잘 담아냈다.
- 올해부터 공모 장르에 단막극이 추가됐고, 지난해 3천만원이었던 대상 상금도 4천만원으로 상향했다.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관객이 극장뿐 아니라 OTT 플랫폼을 통해서도 다양한 작품을 만나는데 이런 추세에 맞추고자 했다.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다. 심재명 명필름 이사도 계시고 <씨네21>도 후원하는 공모전이잖나.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많은 관객을 만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이 그 시작이다.
- 창작자들이 소재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는데, 실제로 심사해보니 어떤가.
= 격차가 크다. 좋은 작품은 좋고, 소재만 맞춘 억지스러운 이야기도 있다. 세월호나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재난 참사, 유가족에 관한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하다. 쉽게 접근하는 건 좋지만 문제의식은 필요하다.
-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응모작이 줄까 걱정되지는 않나.
= 걱정된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고 차차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 거다. 우리나라에서 재난 참사를 대하는 방식은 빨리 덮어버리고 빨리 잊고 지우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립되고 소외되는 양상이 반복된다. 기억하는 건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 4·16재단은 ‘이 기억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까?’ , ‘안전에 관한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
- 지금 이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 2014년의 참사지만, 세월호는 멈춰 있지 않다. 어떤 재난이든 참사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다. 피해자와 타자간의 정서적인 일체감이 형성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고 방관자가 늘어난다. 공격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기록이 필요하다. 참사 당시의 기억과 지금의 기억이 달라졌고, 20년 뒤에는 또 다르게 기억될 것이다. 이런 게 기록돼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풍부해진다. 세월호뿐 아니라 다른 재난 참사도 마찬가지다. 변화 양상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이야기해야 박제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건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