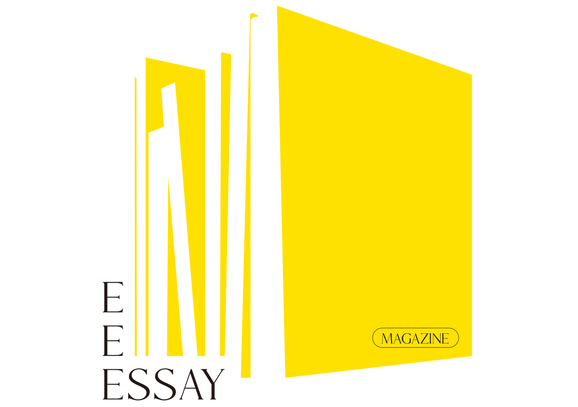
“그는 패배했다. 그리고 그 어떤 위대함도 없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삶이 패배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삶이라고 부르는 이 피할 수 없는 패배에 직면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패배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 밀란 쿤데라, <커튼> 중
쿤데라가 죽었다. 부고 소식을 접했을 때 텅 빈 서점에서 오래도록 휴간 중인 잡지를 읽고 있던 차였다. 그가 만든 세상에 빠져 친구들과 쿤데라 전집 읽기를 했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 쿤데라도, 그의 글을 함께 읽던 동료들도 이젠 기억 속에 너무 멀어져 있다. 과거에 분명 밀란 쿤데라가 쓴 모든 책을, 심지어 외국 잡지에 기고한 단편이나 인터뷰까지, 찾아 읽었던 적도 있다. 마치 눈을 가린 사람처럼. 그때는 영영 그 순간이 영원하리라 믿었다. “우리는 눈을 가린 채 현재를 지나간다. 기껏해야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것을 얼핏 느끼거나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나중에야, 눈을 가렸던 붕대가 풀리고 과거를 살펴볼 때가 돼서야 우리는 우리가 겪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1) 그렇게 붕대를 풀고 나서 떠올려보면 읽었던 문장 하나 기억하지 못 한다. 아무것도 읽지 않은 사람처럼 모든 내용은 잊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사랑들이다.
현재에 멈춰 있는 채로 쿤데라와 그의 추종자였던 과거를 방황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과거를 헤매고 다니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서점은 아무도 오지 않은 채로 잡지와 나뿐이었다. 읽고 있던 잡지만이 손에 덩그러니 쥐어져 있었다. 하필이면 더이상 나오지 않는 잡지의 주제는 ‘시발점’이었다. 그해에 데뷔한 작가들이 자기들의 의지나 소감, 다짐 같은 것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실려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영하는 인스타그램도, 홈페이지도 찾아 들어가보았는데 모든 소식은 2019년에 멈춰 있었다. 따져보니 꼬박 4년 동안 어떤 소식도 없이 잡지는 멈춰 있다 혹은 죽어 있다. 다음 호가 영영 나오지 않는 잡지도 생이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잡지는 정말 생애가 존재한다. 독자들은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결말이 있음을 생각하며 읽지만, 잡지를 읽을 때는 항상 끝이 아닌 그다음을 생각한다. <씨네21>은 다음 호에 무슨 글이 실릴까, <릿터>에는 누구 인터뷰가 실릴까 하면서. 그렇기에 잡지의 죽음은 인간의 그것과 비슷하다. 신경 써서 지켜보지 않으면 그들은 징조도 징후도 없이 혹은 이 세상에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유언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애도하고, 슬퍼할 새도 없이.
다 읽은 잡지는 제자리에 꽂아두었다. 이제는 만들어지지 않고 멈춰 있는 잡지들을 모아놓은 섹션이다. 이 서가에 꽂혀 있는 잡지들을 다시 호명해본다. <토이박스> <모티프> <비릿> <아트콜렉티브 소격>. 이들 말고도 한참 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는 잡지는 이 자리에 잠들어 있다. 여기는 어찌 보면 잡지의 묘지, 매거진의 부고란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서가에 꽂혀 있는 잡지를 읽는 일을 좋아한다. 한 작가의 부고를 듣고 과거의 조각이 건져 올라온 것처럼 이미 멈춰버린 흔적을 집을 때면 또 한 순간순간들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처음 입고하겠다며 찾아온 편집부의 생생한 눈초리, 무탈하게 다음 호를 내라는 저주 같은 안부에도 기뻐하는 모습. 독자라는 행성에 무사히 착륙해 성공하는 순간. 교감에 성공한 독자가 잡지를 손에 들고 집에 돌아가는 풍경.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불멸일 것이다. “물론 불멸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2) 하지만 어떤 불멸은 우리를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어떤 기억은 그 순간을 불멸하게 만든다. 한 예술가의 육신이 죽었을 때 그의 작품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기를 시작할 때, 더이상 아무 소식도 없이 죽어 있는 잡지를 다시 집어 들고 읽을 때. 그때만큼은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숨 쉬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난해 이맘때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다음날 그 소식을 접하고 나와 내 주변이 무탈하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그다음에 안도의 감정은 죄책감으로 이어졌다. 죄책감으로 몸과 마음을 한참 앓았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처럼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망각된고 변색된다는 게 착잡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관계의 이별도, 육체의 죽음도 거스를 수 없지만 기억의 망각만은 조금씩 거스를 수 있다. 우리는 시에서, 소설에서, 사진에서, 영화에서, 잡지에서 잊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그 흔적은 수많은 일상에 변색된 채로 고통의 감각을 덜어내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그들을 떠올리고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다. 그 행위는 얼핏 단순히 살아 있는 우리가 사라진 것들을 떠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라진 것들이 살아 있는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 및 인용1) 밀란 쿤데라, <우스운 사랑들> 2) 밀란 쿤데라, <불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