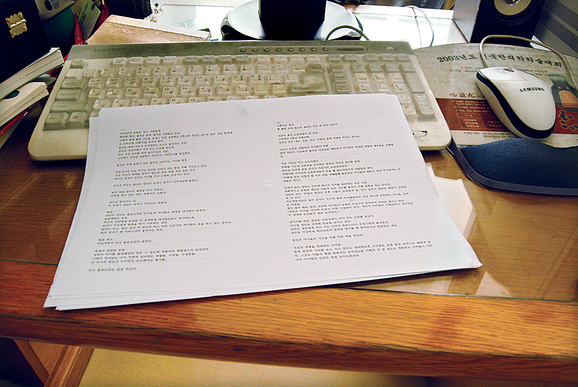
작업 중인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보여주러 간다. 보여주러 가는 길, 지하철에서 다시 읽어본다. 개인적으로 내 마음엔 좀 드는 것 같다. 뭔가 새로운 것 같고 뭔가 재밌는 것 같다. 자신이 생긴다. 모니터를 받는다. 그런데 상대방은 읽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다. 다 읽고나서 내 얼굴을 쳐다본다. 뭔가 나름 순화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같이 치명타다. 거기에 듣고 보니 다 맞는 말 같아서 어지럽다. 그래놓고 마지막엔 애써 좋은 점을 하나 말해주며 마무리한다. 그거 찾느라 꽤 힘들었을 것 같다.
상대는 이게 시나리오라서 잘 모르겠다고, 막상 영화로 나오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다. 나는 진짜 그럴 거라고 믿으면서도 입으론 영화로 나와도 재미없을 거라고 얘기한다. 말은 안 하지만 상대는 거기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렇게 몇번 내 생각을 상대방이 대신 말해주고, 상대방 생각을 내가 대신 말해주고 나면 헤어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본다. 진짜 별로다. 민망할 정도다. 새롭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너무 새로워서인지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외 부분들은 다 대충인 것 같아 창피하다. 갑자기 인터넷에서 본 힙통령 동영상이 생각난다. 나도 내 소개 영상이 있었다면 “대한민국 영화들 너무 뻔한 거 같아요. 재미도 없고요”라고 야심차게 시작했겠지. 그렇지만 불합격. 그래도 그 친구는 계속 당당한 것 같던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무엇일까. 가는 길엔 항상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다가도, 오는 길엔 늘 헷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