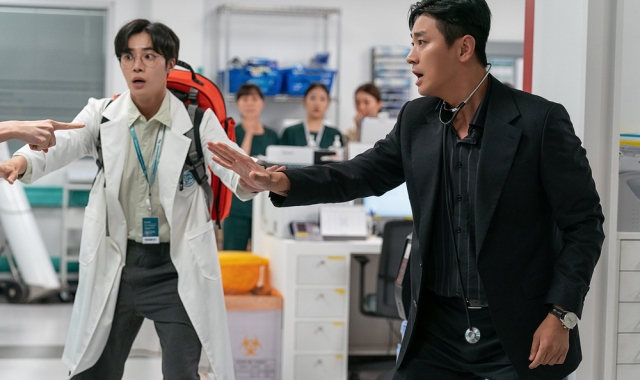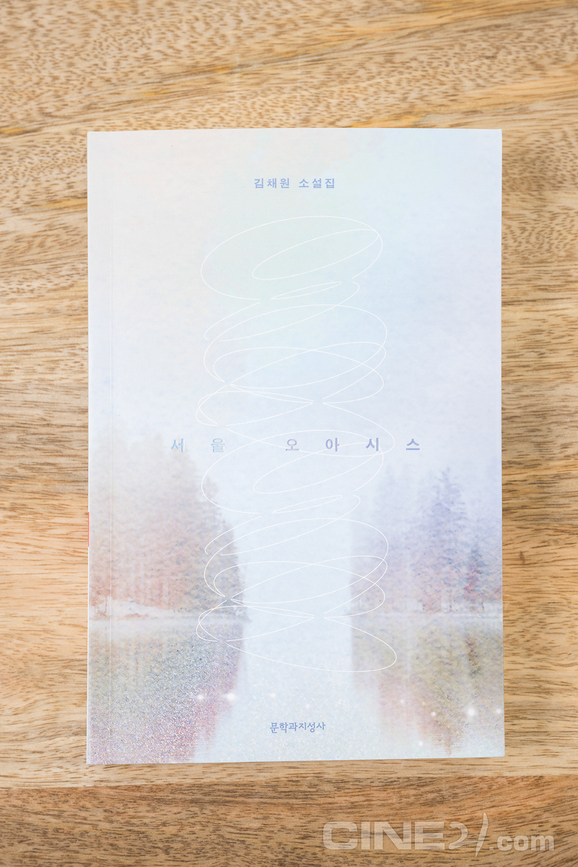
소설집을 덮으면서 그림자들이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소설 속 인물의 명확한 생김새가 아니라 희미한 그림자 발소리다. 다행히 그림자는 혼자가 아니라 그 옆과 뒤를 다른 이가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수런수런대기도 한다. 김채원 소설집 <서울 오아시스>에는 여덟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등단작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와 표제작 <서울 오아시스>를 비롯해 <빛 가운데 걷기> <럭키 클로버> <외출> 등이다. 당연히 별도의 소설들이고 인물들에는 모두 이름이 별도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들은 이름이 있음에도 자기만의 개성을 갖기보다는 상실감을 가장 중요한 고유성으로 지닌다. 이상하다. 현재는 상실된 것이 자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니.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의 동우, 석용, 성아는 얼마 전 유림을 잃었다. 이들의 친구 유림은 자살했다. 이들은 정처 없이 함께 걷는다. 이들의 대화는 딱히 유림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시시콜콜한, 유림과는 관련 없는 선문답 같은 대화를 이어간다. 유림은 소설집에 실린 또 다른 소설 <쓸 수 있는 대답>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소설에서도 유림의 마음속 어둠이 무엇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뾰족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빛 가운데 걷기>의 노인은 딸이 남기고 간 아이를 키운다. 또래에 비해 느린 아이를 보며 과거 교사였던 노인은 속으로 주기율표를 세며 생을 견딘다. 이 아이는 뒤에 <외출>이라는 소설에 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불면증으로 잠을 쉬이 이루지 못하는 ‘나’는 과거에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던 기억을 끄집어내고 슬픈 기억 대신 애써 ‘기쁜 일을 적’어 내려간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현실 속에서 위안이 되는 일을 찾는다. 원치 않은 이별 후, 죽음으로 인한 상실 혹은 탄생 때부터 가지지 못한 결핍으로 인해 삶이 이토록 고통스럽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이어나가야 할까. 사는 일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끝내 살아내야만 한다면 그 상실 후 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버텨야 좋을까. 김채원의 소설은 그런 질문을 한다. 이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도 그럭저럭 살아내는 모습은 작은 위안을 준다. 나도 그렇게 살아내도 되겠구나 하는.
“나는 매일 계속되는 꿈이야. 그러면 어떤 것도 더는 꿈이 아니게 돼.” /1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