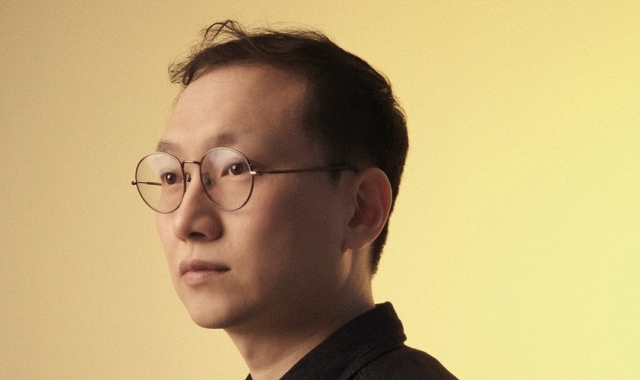내전(Civil War)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다. 한반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심각한 내전을 겪었고, 그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냉전적 내전’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치 다른 국가인 양 살아온 지 너무 오래다 보니, 하루빨리 이 내전을 끝내고 하나의 국가를 복구해야 한다는 당위도 그럴 수 있다는 희망도 엷어져버렸다. 내전의 종식은 고사하고, 그냥 외국으로서 맞대어 살 뿐, 전쟁만 안 났으면 좋겠다는 (실은 설마 전쟁이 날까 하는) 생각으로 산다.
한국전쟁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제하고, 근대적 의미에서의 내전을 겪어본 적이 없는 우리의 집단기억은 그래서 다소 어리벙벙한 감각으로 내전을 대하곤 한다. 그런데 내전은 의외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단히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이다. 민족, 인종, 종교, 기타 이해관계 등에 의한 가파른 대립을 경험했던 나라들이 내전 상태에 처했던 경험은 대단히 흔하며,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내전이 진행 중이거나 내전 발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 시리아, 예멘, 리비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등등이 그러한데, 그럼에도 우리는 필경 이런 내전이 정치·경제적 저개발국가의 전유물이라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국내 상황에 맞춰(?) 최근 개봉한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는 트럼프의 집권과 재집권에 따른 미국적 공포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그래서 남다르다. 내전은 민주주의가 안착되고 장기간 경제적 성장을 지속해온 국가에서는 여간해선 발발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상당 부분 안이한 것이었음을 자각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다. 총과 대포의 끝이 외부로 향하건 내부로 향하건, 그것이 이른바 ‘고도의 정치 행위’의 일환이건 아니건, 군대가 동원되는 무력 행위의 결말은 참혹하며, 그간의 문명이 이룩했던 모든 것이 삽시간에 무너져버린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준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세력과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집단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그마저도 ‘정쟁’의 프레임을 갖다 대는 기성 언론들의 행태는 안이하다 못해 자기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그들은 내란을 기도했고, 내란범으로 처단되지 않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치 우리 공화정의 한축을 구성하는 유력한 정치 분파의 일부인 양 취급해준다. 내란을 기도하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건 그들이지만, 그것이 결국 내전적 상태로 향하게끔 만드는 건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언론들이다. 내란이 신속히 종식되지 않고 급기야 내전으로 화한다면, 그것은 지난 한달간 언론들이 보여준 행위의 결과물이다.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에서 분투하는 종군기자 같은 배포조차 우리 언론이 갖고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끝엔 ‘Press’ 헬멧을 쓰고 방탄조끼를 입어도 아무렇게나 쏘는 총에 맞아죽는 언론인과 무참히 학살당하는 시민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