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만 주목하지 말라!
조연배우와 스탭에게 상대적 박탈감 안기는 <씨네21>의 균형감각을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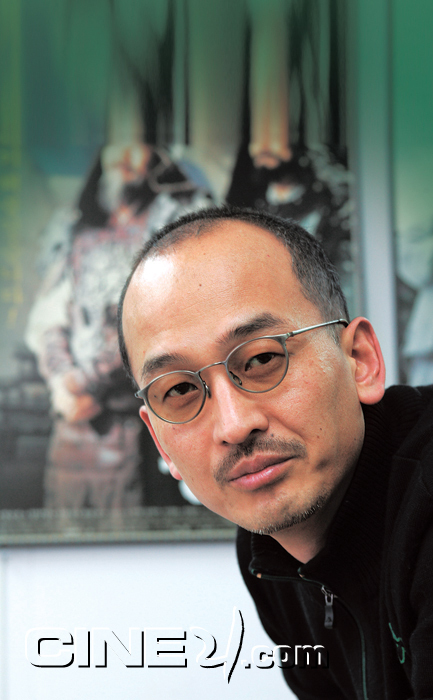
<씨네21>은 건강한 잡지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 영화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사명의식을 밑에 깔고 나아가고 있다. 흥미를 추구하면서도, 선정주의보다는 영화 판도 전체를 뜯어보면서 하는, 그러면서 충무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지다. 다만 맹점은 있다.
먼저 영화예술 지향이 너무 크다는 것. 영화가 지니는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두루 균형있게 아울러야 하나 문화쪽에 20%가량 치우쳐 있다. 예술영화를 우상화한달까. 그리고 너무 감독 중심으로 가는 나머지 지나치게 감독을 미화한다는 느낌도 있다.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감독의 철학과 감각을 디테일하게 다뤄보고 대변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이런 와중에 과대평가된 감독도 적지 않게 만들어냈다. 감독 말고도 함께하는 스탭이 많고,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명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쪽짜리나마 스탭25시 같은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쉽다. 특정 감독과 배우, 제작자 중심으로 가다보니 잡지의 권위는 올라갔는지 모르겠으나 이로 인해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조연배우와 스탭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10년을 맞기까지 <씨네21>의 포지셔닝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여유를 갖고 특정 영화에 대한 반복적 소비에 치중할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영화들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잘 만든 영화는 누구나 깃발 들고 따라가는 것 아닌가. 누구나 이기는 전쟁에 병사로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잘 나가는 기존의 감독들 앞에서 줄을 서는 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것밖에 더 되는가. 영화는 새로운 신인의 각축장이다. 그들의 성과에 박수쳐주고 그 성과를 되짚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실패자와 루저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 잠재력과 가능성과 미덕을 찾아내 기록하는, 한국영화 전체 판도를 아우르는 시선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싶다. 성공작의 미화는 쉽다. 기대가 컸으나 실패한 작품에 대해서도 좀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
결국 영화의 문제는 Why와 What의 문제다. 왜 찍는가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이다. <씨네21>은 잘 만든 영화를 말할 때 How에 대한 언급에 치중한다. 가령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신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건 재밋거리를 준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시대에 이 영화가 왜 나왔나에 대한 심도 있는 서술이 있어야 한다. 업과 다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인데, 아무리 실패한 영화라 하더라도 그건 How에 대한 실패일 뿐이다. What과 Why까지 실패는 아닌 것이다. 두루 짚어줘야 다음 영화를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성공작의 경우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감독에게만 간다는 게 불만이다. 제작자에 대해서는 사업수완과 산업 얘기만 묻고. 감독은 영화 전체의 30% 몫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70%인 기획, 작가, 스탭, 제작자에게도 질문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영화를 만든 씨앗이라 할 부분을 놓치고 <씨네21>은 영화의 결과인 열매에만 초점을 맞춘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감독의 어깨에서 짐을 많이 덜어달라는 것이다. 기획 기사라면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제작자, 작가, 촬영감독 얘기도 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기자라면 감독을 칭찬하는 코멘터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영화의 횡적-종적 고찰도 아쉬운 대목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영화가 나왔을 때는 미덕과 악덕을 균형있게 써야 한다. 과거 외국영화와의 상관관계, 우리 영화사와의 상관관계 말이다. 지면이 개봉영화 위주인데, 일정 정도를 할애해서 1년, 5년, 10년 전 한국영화 판도와 비교, 성찰해줄 수 있는 지면을 만들면 좋겠다. 동시성뿐 아니라 과거와의 연대성도 중요하다. 현재 이 잡지에는 오늘만 있고 어제가 너무 멀다. 한국영화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준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사람들이 아는가. 10년 전 각광받던 김의석 감독의 의미 같은 것도 되짚어주어야 하지 않나. 영화산업기사도 마찬가지다. 1, 2년 전 파이낸스 동향에 대해 되짚어보는 재평가가 없다. 과거의 10년을 알면 미래 5년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마디 더하자면, <씨네21>의 비평적 수사는 너무 강하고 자극적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깨달으면서, 독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쓰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