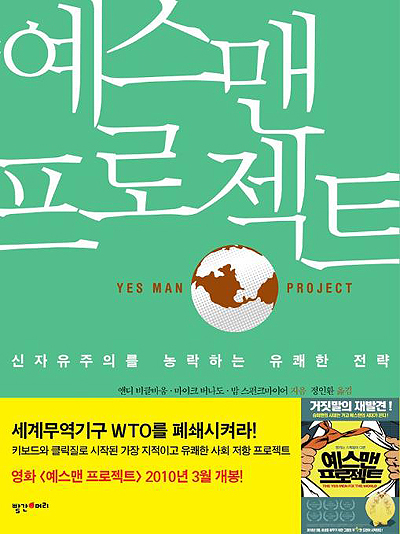피해보상? 예스. 재입주? 예스. 친환경? 예스. 시민운동단체 ‘예스맨’의 세계에서 안되는 일이란 없다. 앤디 비클바움과 마이크 버나노를 주축으로 하는 이 단체는 초국가적 거대기업을 사칭해 그들이 미루거나 외면해온 일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해왔다. 이들을 주연으로 다룬 두 번째 다큐멘터리 <예스맨 프로젝트>가 3월25일 개봉한다. 신랄한 웃음과 진지한 고민으로 무장한 채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웃는 이 다큐멘터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가운 소식이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더 많은 배상액을 받기로 했다. 법원은 56억원 정도의 금액만 배상하면 된다고 했는데,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답게 그 20배에 달하는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삼성쪽 고문변호사는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2009년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이 약 8천억원에 가까웠다. 받은 만큼 돌려드리자는 의미에서 태안 주민들에 대한 배상액을 늘렸다”는 말을 전했다.
물론 이건 가상의 뉴스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 앞으로 일어날 리도 없는 것 같다. 효율 만능주의에 의해 움직이는 대기업이 이런 비효율적인 보상을 선뜻 할 리가 있을까. 그러나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시민운동단체 ‘예스맨’이라면 이 가상의 뉴스를 현실로 포장해 대국민 사기라도 칠 수 있을 것 같다.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든다.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과 인터뷰를 원하는 언론의 연락을 기다린다. 언론이 가짜 사이트에 걸려들면 얼씨구나 대변인 행세를 하며 그들과 인터뷰를 한다. 결국 엄청나게 뻥튀기된 배상액 발언은 인터넷 기사를 타고 널리널리 퍼져나간다…. 이것이 바로 ‘예스맨’이란 단체가 활동하는 방식이다. 시장경제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 단체는, 창립자 앤디 비클바움과 마이크 버나노를 중심으로 거대 기업의 위선을 전세계에 폭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장경제의 진짜 모습을 알려준다 하여 예스맨이 ‘명의 보정’(identical correctness)이라 부르는 이 행동에 전세계 언론과 정치인들은 매번 호되게 당하고 있다. <BBC>의 경우 화학기업 다우의 대변인으로 위장한 앤디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한 뒤 정정보도를 냈으며, 미국의 한 보수연합당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해체된다는 예스맨의 가짜 보도자료를 보고 의회에 질의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덕분에 예스맨은 ‘국제적 악동’, ‘삐딱하고 못돼먹은’이란 수식어를 함께 얻었지만, 이와 같은 세간의 관심은 시민운동단체로서 예스맨의 의제 생산 능력이 합격점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준다.
시장경제의 중심부가 이토록 허술할 줄이야
<예스맨 프로젝트>는 예스맨이 기업을 대신해 시도했던 ‘옳은 일’들을 기록한 두 번째 다큐멘터리다. 예스맨을 주제로 삼은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예스맨>(2004, 사라 프라이스, 댄 모어, 크리스 모리스 연출)은 WTO 대변인을 사칭해 전세계 방송과 회의장을 누볐던 앤디 비클바움과 마이크 보나노의 이야기를 담았고, 이 당시 배우로만 활동했던 앤디와 마이크는 <예스맨 프로젝트>에서 감독의 영역까지 손을 뻗쳤다. 이번 영화에서 예스맨이 위장을 시도했던 기업들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다.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유명한 다우 케미컬, 미국의 군수산업회사 할리버튼, 석유에너지기업의 대명사 엑슨, 미국주택도시개발청(HUD)…. 모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인재들이 모인 회사다. 각종 국제회의와 강연회에서 이들처럼 보이기에 성공했다는 건 예스맨이 명석하면서도 윤리적인 ‘엘리트’ 시민운동단체라는 뜻일까? 그건 아닌 듯하다. 2000년 WTO의 대변인 위장으로 예스맨의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한 앤디와 마이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린 경제학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고, 많이 안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녔다면 우리 상태가 어떤지 곧 파악이 될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강연한 모든 모임에서는 이른바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아넘어갔다.”


실제로 <예스맨 프로젝트>에 삽입된 앤디와 마이크의 강연 영상에는 허술한 구석이 많다. 혹은 관객이 눈치채라고 일부러 헐렁하게 연출한 듯한 대사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보자. “훈남이 훈훈한 것보다 낫고/영계인 것이 노땅인 것보다 낫고/돈을 좀 벌 수 없다면/아예 왕창 벌어야겠다.” 런던의 재무회의에서 다우 케미컬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 구절을 읊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시낭송에 웃을지언정 아무도 대변인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우라는 이름과 대변인이라는 지위가 신뢰라는 프리패스 티켓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경제가 부여하는 지위에 대한 사람들의 맹신은 <예스맨 프로젝트>의 주요한 웃음거리다. 카메라는 금빛 해골이 춤추는 프레젠테이션 영상과 아메바를 닮은 가짜 보호복을 진지한 눈빛으로 주시하는 ‘전문가’ 집단의 얼굴을 종종 아무런 설명없이 클로즈업한다. 이 장면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지식인들의 얼굴이라고. 돈과 시장에 모든 것을 걸고 의존하는 시장경제의 중심부는 이토록 허술하다고.
비록 거짓말일지언정 희망은 남았다
시장경제의 허점은 알았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예스맨 프로젝트>는 ‘시스템을 파괴하자’는 결론을 내린다. 문제는 악한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시장 중심적 시스템에 있으며, 우리 모두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거리로 나가 변화를 요구하자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해결책이 전혀 새롭지 않으며 명쾌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 거리로 나가 변화를 외치자는 건 19세기에도 유효했을 고리짝 발상이며, 시장경제 시스템 붕괴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이상향적 소망에 불과하다. 누구보다 위트있고 명쾌하게 시장경제의 허점을 짚어낼 줄 아는 시민운동단체가 이처럼 추상적인 결론으로 영화를 마무리하는 건 아무래도 아쉽다. <예스맨 프로젝트>의 첫 장면, 양복 차림의 앤디와 마이크는 커다란 수영장으로 다이빙하며 “세상을 고쳐보자”고 외치는데, 이 영화의 모호한 결말은 시장경제라는 넓은 수영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두 ‘예스맨’의 한계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예스맨 프로젝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결책이 아니라 디테일에 있다. 영화는 시장경제가 보듬지 못하는 지역과 사람을 감싸안으려 애쓴다. 다우 케미컬 대변인으로 분해 생방송에서 인도 보팔의 가스 유출 피해자들에게 거짓 보상금을 약속한 앤디와 마이크는 그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피해 지역을 찾는다. 그들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도시개발정책으로 쫓겨난 뉴올리언스의 철거민들의 재입주를 기념하는 가짜 커팅식을 열기도 한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예스맨의 거짓 발표를 듣고) 마치 천국에라도 온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천국에 있을 리는 없겠죠. 지옥이라면 모를까. 그래도 잠시나마 꿈을 꾸게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예스맨이 찾아간 인도 피해 지역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많고, 해결책은 요원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은 건재하다. 하지만 잠깐의 외도로도 인간은 그 다음 싸움을 위한 용기를 낼 수 있다. 어쩌면 처음부터 <예스맨 프로젝트>가 의도했던 것은 시장경제와의 치열한 대결이 아니라, 잠깐의 일탈이 아니었을까. 세계화와 자본주의에 점령당한 이 고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선사하는 달콤한 거짓말. 우리가 <예스맨 프로젝트>에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스맨 프로젝트>
세상을 바로잡고 싶다?
재미있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예스맨처럼-신자유주의를 농락하는 유쾌한 전략-
세계무역기구 WTO를 폐쇄시켜라! 키보드와 클릭질로 시작된 가장 지적이고 유쾌한 사회 저항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