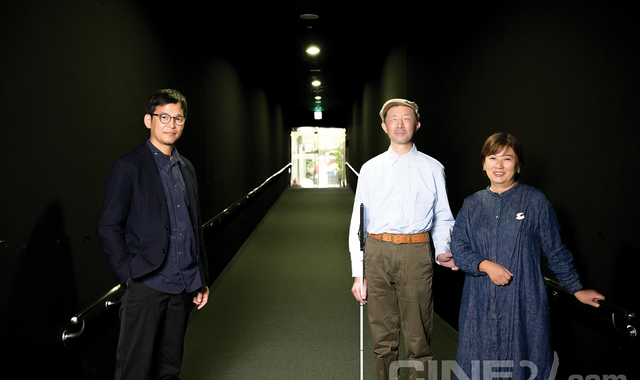문득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 노래방에서 더이상 신곡을 찾지 않고 익숙하게 아는 노래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어느새 오래된 노래만 부르던 삼촌의 예전 표정을 내가 짓고 있음을 깨닫는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었던 시기도 있었다. 하나 이제는 시간에 밀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처지다. 익숙하게 쓰던 다른 사이트들을 잠시 접고 낯선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런 위기감 때문이었다.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려워도 배워야 하는 것, 이른바 살아남기라고 할까. 아직은 내 손의 연장처럼 생각되던 것이 아닌 까닭에 느껴지는 타자의 감각. 나는 여전히 그 위에서 페이스북을 대한다.
그 자식이 친구신청하면 어쩌지
그런 만큼 <소셜 네트워크>의 첫 장면에서 감정이입되는 것은 천재 마크 저커버그가 아닌 그의 여자친구 에리카다. 그녀는 지금의 나처럼 혹은 첫 장면의 폭풍 같은 대사들을 따라가느라 당황하는 당신처럼 마크의 현란하고 정신없는 말의 홍수를 버거워한다. 이 영화의 인상적인 오프닝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의 본질을 그대로 장면화하고 있다. 마크는 머리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도 동시에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사들은 에리카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인맥에 대한 목적과 함께 그녀를 향한 욕망 또한 놓지 않는다.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 테스킹은 사이버 세대에는 익숙한 감각일 테지만, 영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신뢰와 개방을 기반으로 한 배타성의 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욕망이라는 근본적인 것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용자의 편의성은 극대화되게 마련이다. 처음 페이스북을 사용해보고 가장 놀랐던 점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나조차 잊고 있던 친구와 지인들을 찾아주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친구, 그 친구의 친구들까지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페이스북의 개방성에 대한 첫 경험은 신기함과 함께 묘한 불안감을 자아낸다. 나에 관한 정보가 내 통제를 벗어난 채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혹시나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친구가 나에게 친구등록을 하면 어쩌나 하는 일어나지 않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여기서 정보 개방과 함께 배타적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선택을 사용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흥미로운 것은 이같은 배타성은 자신의 정보를 거르지 않고 공유하는 신뢰와 투명성을 전제로 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은 무한한 신뢰의 바다 위에 떠 있다. 그러나 “몇몇의 적을 만들지 않고서는 5억명의 친구를 얻을 수 없다”는 영화 카피처럼 현실에서의 믿음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세상 안에서의 신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천재이자 세상에서 가장 젊은 재벌인 마크 저커버그의 얼굴과 평범한 사람들의 당연한 고민이 겹치는 순간이 여기에 있다. 신뢰를 향한 욕망. 페이스북은 그 결과물이다. 불안과 신뢰의 기묘한 동거.
소통의 욕망과 두려움의 두 얼굴
SNS란 이를테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나름의 규칙 위에 존재한다. 현실이지만 동시에 현실이 아닌, 현실과 겹쳐져 있는 새로운 소통의 장인 것이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의 감각을 요구한다. 감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종종 도구가 인식을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문자 시대의 감각에 익숙한 사람과 영상 시대에 익숙한 사람은 세상을 감각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SNS 역시 손바닥 만한 모니터 위로 실제를 압도하는 과잉현실을 쏟아내며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지방식을 요구한다. 가령 미국 드라마에서 본 한 장면은 오늘날 SNS를 통해 소통하는 우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식탁에서 아버지는 아이패드를, 아들은 닌텐도를, 큰딸과 작은딸은 각각 자신의 모바일 기기만을 쳐다보며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다.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는 이를 보고 모두에게 기계를 끄고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하지만, 그 순간 가족들의 작은 화면 안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서로 문자를 통해 오가고 있다. 이 역설적인 장면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자는 대화를 나누자던 어머니 단 한 사람이다. 사실 나는 저 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 하는 건지도 모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언제나 이와 같다.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욕망과 소통에서 빠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어쩌면 페이스북은 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메우기 위한 발버둥이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양보단 질, 누군가과와 소통하고 싶다면
애플의 성공이 그랬던 것처럼 페이스북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역시 인문학적 관심, 인간에 대한 통찰은 반드시라고 할 만큼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결국 SNS 역시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도구 또는 방법에 불과하며,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는 페이스북이 마크 주커버그의 개인적 욕망을 경유하여 그것을 포착하였다고 말한다(적어도 그렇다고 믿어진다). 사실 SNS는 근본적으로 편지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 중심에는 상대를 알고 싶은, 관심 받고 싶은, 사랑 받고 싶은 욕망이 자리한다. 소통에의 욕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가,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관건이다. 그러나 정보는 아무리 축적되어도 채워지지 않고 도리어 허기를 불러일으킨다. 감정과 교감의 문제에 있어 관건은 양이 아닌 질이기 때문이다. 상대를 알고자 하는 욕망은 정보의 공유로 채워질 수 있지만 소통이란 정보의 축적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며 영화를 마무리한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누군가(누굴까?)에게 친구추가를 신청하고 끊임없이 화면을 새로고침하는 마크의 손길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답문이 올 때까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내 손과 닮았다. 아무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도 느껴지는 결핍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럼에도 나는 오늘도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늘려가고 다른 이의 글을 보고 내 생활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이미 진짜와 가짜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와 또 다른 진짜간의 문제이다. 페이스북의 기술은 오늘도 쉬지 않고 세계를 확장시켜가고 사람들은 SNS의 세상에서 연결된다. 광대한 넷의 바다에서 사람을, 그리고 사랑을 찾아 헤매는 항해는 단 한순간의 멈춤도 허락지 않는다. 그것이 결국엔 마음의 공허를 메워줄 수 있을 거란 환상을 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