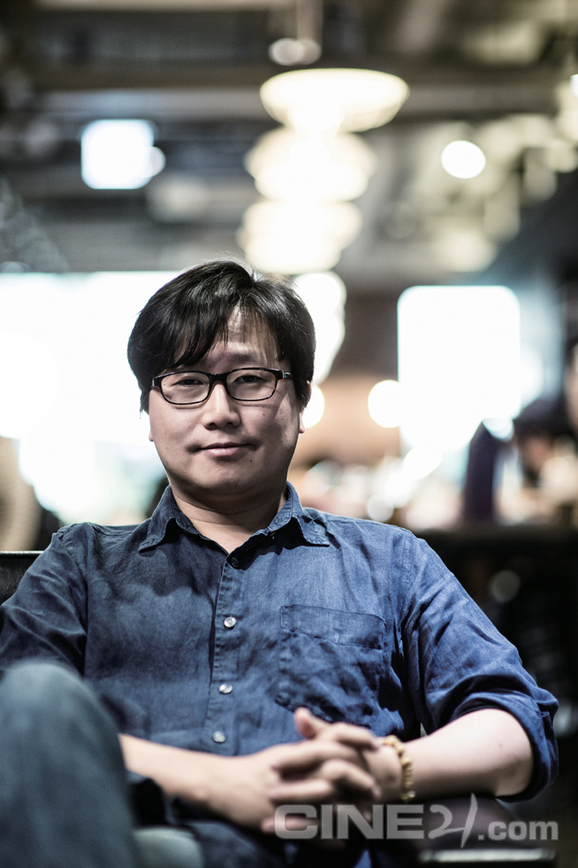
“저는 숨은 엑스트라고나 할까. 주역까지는 아닌 것 같다. (웃음)” 정원조 프로듀서는 인터뷰에 나서는 걸 한사코 거부했다. <아가씨>를 기획한 임승용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프로듀서로서 크레딧을 올리긴 했지만 윤석찬 프로듀서나 김종대 프로듀서에 비하면 그리 고생을 한 것도 아니기에 그들과 같은 자리를 나누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가 했던 업무 비중이 다른 프로듀서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이유는 동의할 수 없어 그를 꾀어내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원작자 세라 워터스와 박찬욱 감독 사이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임승용 대표의 말대로 그는 미국 변호사와 함께 판권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했다. <아가씨>의 판권 계약서에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대목이나 특정 지역을 무대로 고집하는 내용은 없었다. “매력적인 각색 방향이 있다면 원작자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이었다. 계약은 어차피 조율의 문제니까. 예상 범위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협상이었다”는 게 정 프로듀서의 설명이다.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서 영어로 번역된 각본을 감수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각본 번역은 지문과 대사 그리고 각주를 통해 자막보다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전달할 수 있는 까닭에 영화가 가진 흥미와 1930년대 한국과 조선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는 데 특별히 신경썼다고 한다. “가령, 1부 마지막에 등장하는 ‘히데코는 나쁜 년이었다’라는 숙희의 대사는 원작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지 보고, 원작자의 숨은 의도를 최대한 살리려고 했다. 말투가 너무 현대어 같지 않게 전달하려고도 노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번역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워낙 훌륭하게 번역을 해주셔서 감수할 것도 별로 없었다. (웃음)”
‘경영학과 법학을 전공했고,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당시 통역으로 참석하기도 한 천재소년.’ 그가 프로듀서 어시스턴트로 참여한 <남극일기>(2005)가 개봉했을 때 <씨네21>은 이미 그를 이렇게 소개한 적 있다. “몇 가지 정정을 하자면 뉴질랜드에서 법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다가 상대에서 마케팅과 상법으로 졸업했다. 정상회담 통역도 과대 포장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뉴질랜드에 오셨을 때 의전을 담당했던 사무관을 돕는 일을 했을 뿐이다. (웃음)” <남극일기>로 영화계 경력을 시작한 그는 <괴물>(2006)에 참여해 괴물을 디자인하기 위해 뉴질랜드 웨타 워크숍에 방문한 봉준호 감독을 도왔다. 한국 후반작업 업체 세 군데가 VFX를 맡았던 <포비든 킹덤: 전설의 마스터를 찾아서>(감독 롭 민코프, 2008)에서는 감독, 제작자와 후반작업 업체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간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박쥐>로 박찬욱 감독과 인연을 맺은 뒤, <파란만장>(2010)으로 현장 진행 경험을 쌓고, 박찬욱 감독과 함께 할리우드로 건너가 <스토커>(2012)에 참여했다. 특히 <스토커> 때 “박찬욱 감독이 한 말의 아주 작은 뉘앙스까지 할리우드 스탭들에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초등학생 시절, 뉴질랜드로 이민간 까닭에 익힌 영어 실력으로 감독과 외국 스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주로 했던 그이기에 제작의 전 공정을 이끌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원조 프로듀서는 자신의 역할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모호필름의 프로듀서로서 나는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잘 찍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다. 그게 내 역할이다.”
이유정이 꼽는 정원조의 인상적인 순간
“처음 작품 논의가 시작됐을 때 정원조 PD가 내게 일일이 다 확인했었다. 나를 믿지 못해 그러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되돌아보니 그는 이제껏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꼼꼼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서로의 의견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