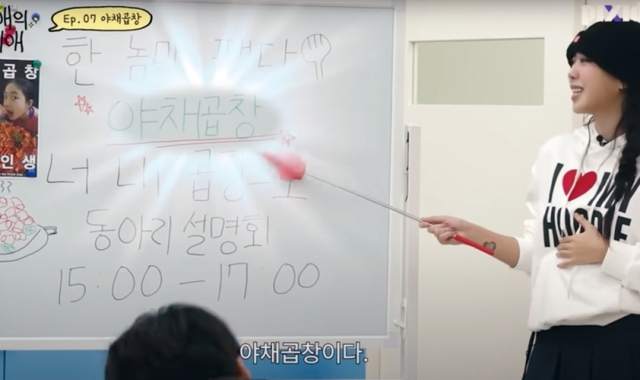2024년 극장가는 ‘기후 위기’다.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겨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말 <서울의 봄>에 이어 2024년 <파묘>와 <범죄도시4>가 연이어 천만 관객을 달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싹텄다. 하지만 여름 시장의 침체 등 기존의 공식과 패턴을 벗어난 흐름이 보였고 결국 2024년 연말을 정리해보니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9400만명이나 감소한 수치에 그쳤다. 요컨대 코로나 이후 마주했던 비상한 위기가 이제 극장가의 기본값이 되어버렸다.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는 진즉 코로나 이전 수치를 회복했고, 북미의 경우에도 어렵다곤 하지만 80%가량 회복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약간의 과장을 보태 한국 영화시장만 아직 한겨울이다. 경고가 반복됐지만 무시당했고,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가 현실이 되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높아진 티켓값에 대한 저항감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묵힌 영화들이 뒤늦게 극장가에 걸리는 사이 경쟁력 있는 다른 여가 활동에 수요를 빼앗겼다는 분석도 일리가 있다. 그사이 제도적인 지원이나 조정마저 전무했다. 수많은 변화 중에도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극장 체험의 산업적, 문화적 의미가 바뀌어버렸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극장에 간 김에 영화를 봤다면 이젠 명확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극장까지 걸음을 옮기지 않는다. 극장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건 단지 물리적, 심리적인 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바야흐로 극장은 새로운 서사를 가장 먼저 소비하는 특권적인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중이다. 한때는 쏟아지는 최신작이 일주일은커녕 2, 3일 간격으로 스크린을 밀어내기도 했지만 어느덧 극장에서 재개봉작을 만나는 게 당연해졌다. 한두편의 영화가 스크린을 통째로 점령하던 풍경은 사라지고, 좁고 깊은 관객층을 다양하게 공략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심지어 공연실황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가 극장의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좋아졌다 혹은 나빠졌다는 식의 가치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이건 (이미) 변해버린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생존을 위한 존재론적 질문이다.
연말 연초가 되면 영화산업을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진다. 다들 올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년에는 얼마나 더 어려워질 것인지를 말할 것이다. 한국 영화산업은 분명 위기에 직면했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다만 명료한 사실과 의미 있는 진실은 구분이 필요하다. 오히려 위기를 건조하게, 반복해서 명시하는 데 정신이 팔려 (예전처럼) 정작 각성이 필요할 때 피로에 무뎌질까 두렵다. 되돌아보니 올해 역시 산업 전체의 위기라는 중압감에 눌려 놓치고 지나간 순간이 적지 않았다. 하여 <씨네21>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2024년을 복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모두가 박수 치고 기억하는 영광의 순간에서 조금 고개를 돌려, 애정을 가지고 말을 걸어야 비로소 보이는 기억을 모아보았다. 2025년의 첫걸음은 그 소중한 가능성의 씨앗에서부터 시작하려 한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영화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