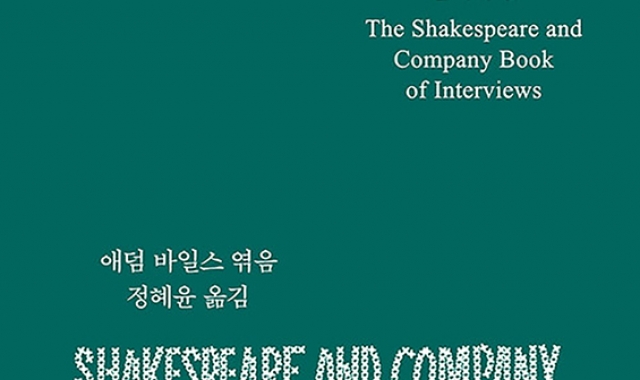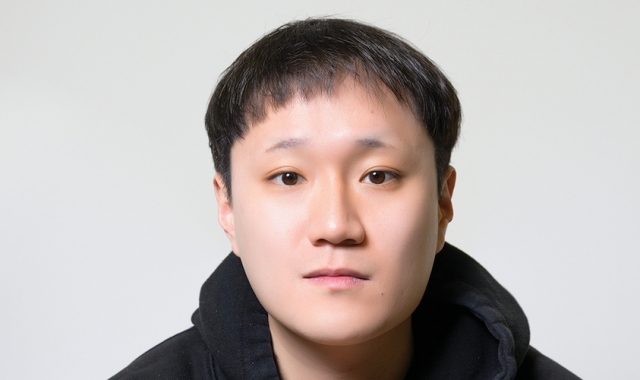깊고 어두운 밤, 이유 없는 불안이 차올라 잠에서 깬다. 실타래처럼 뒤엉킨 마음으로 밤을 지새울 때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줄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한다. 동시에 내 안의 비관과 우울의 싹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꽃을 피워 속삭인다. 답을 알면 진짜 좋을까? 답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닐까 싶다. 또 다른 표현으론 종말. 영화, 드라마, 책, 게임 등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재미있는 건 어쩌면 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긴장과 갈등의 과정을 거치든 결국 마지막 페이지가 찾아온다는 게 분명하기에 아쉬우면서도 안심이 된다.
우리는 대부분 끝을 상상하지 않고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끝이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수락하고 나서야 마침내 찾아오는 선물 같은 순간도 있다. 내 경우엔 주로 영화를 통해 예행연습을 하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 같다. 시국이 어수선한 탓인지, 단순한 우연인진 알 길 없지만 최근 유난히 종말과 끝에 관한 작품들을 부쩍 자주 마주친다. 때때로 의지를 가지고 찾아 나선 것보다 저절로 찾아온 것들에 더 깊고 내밀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최근 두편의 작품이 내게 찾아왔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데드데드 데몬즈 디디디디 디스트럭션>과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를 연이어 보며 우울과 종말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아사노 이니오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데드데드 데몬즈 디디디디 디스트럭션>은 이른바 ‘세카이계’의 명맥을 잇는 작품이다. 작은 종말 앞에 선 두 사람의 관계를 그린 이 작품은 귀엽고 허술해 보이는 캐릭터디자인과 달리 그렇지 못한 심오한 어둠과 무거운 주제를 품고 있다. 언젠가 긴 호흡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볼 기회가 오길 희망한다. 얼핏 과장되어 보이는 상황과 허무맹랑하게 다가오는 세카이계의 설정은 개인, 그리고 관계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대비적인 장치다. ‘나’라고 하는 세계가 ‘너’라는 다른 세계를 만나 충돌할 때 그 눈부신 에너지는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 절대적인 무언가를 자아낸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세계’보다 내 눈앞의 확실한 ‘너’를 선택하겠다는 결연한 각오 앞에서 우울과 고민 따윈 눈 녹듯 사라진다. 종말을 고한다.
반면 처음엔 비슷해 보였던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이 보기 드문 걸작은 우울이 초래한 종말을 탐미한다. 우울이란 ‘상태’를 시청각적인 ‘물질’로 빚어낸 <멜랑콜리아>는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종말을 향해 나아간다. 세상의 끝 앞에서 누군가는 죽음으로 도피하고, 누군가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채 불안과 괴로움에 잠식된다. 반면 우울로 파괴되어가던 저스틴(커스틴 던스트)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평온해진다. 포기와는 다르다. 오히려 냉정하게 자신과 상황을 돌아보는 주체적 시선의 발현에 가깝다.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병리학적 우울을 걷어내니 우울의 또 다른 얼굴이 보인다. 어쩌면 우울은 강요된 정상성에 저항하는 예술가의 본질과도 같다. 부정하고 잘못된 것인 양 제거하는 대신 내 안으로 끌어안을 때 타인의 불안마저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까.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잠시 덮어두고, 바닥까지 꺼질 것 같은 지금의 우울한 기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본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평등한 진실 앞에서 어느덧 다시 고요해지는 밤. 창밖엔 소복하게 눈이 쌓이고 있다. 온 세상이 공평하게 하얗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