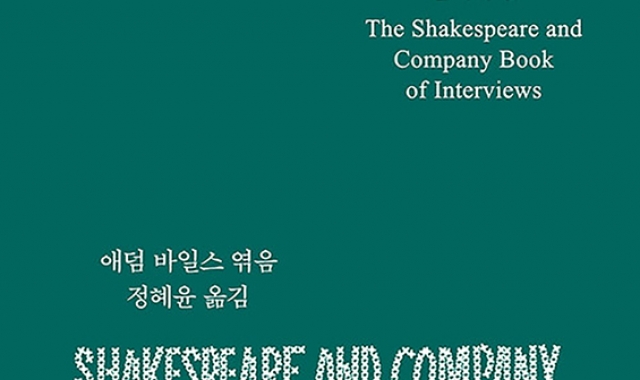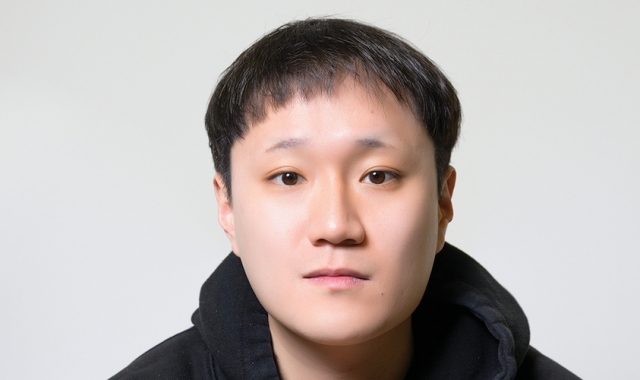배은열, 황근하, 오한영, 조재혁 네명의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INK(Image&Kids)는 대전을 기반으로 청년들간의 관계, 연대를 통한 대안적 영화를 제작하는 동시에 제도권 밖에 놓인 영화를 상영하는 집단이다. 물리적으로 걸어놓은 제약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에서 학교, 직장을 다니는 만 18살 이상 만 39살 이하의 청년들이다. 상영회 및 워크숍 참여 인원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INK의 오픈채팅방에는 현재 95명(2월10일 기준)이 모여 있다. 2021년 출범해 5년차에 접어든 INK를 두고 배은열 집행위원은 “정체불명의 조직”이라고 말한다. 자체 상영회, 영화제를 운영하며 “이상한 광기를 지닌 작품을 상영”하고 매년 여름 진행되는 영화제작 워크숍에선 “예산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작품을 제작”하는 INK에 관해 배은열 집행위원과 대화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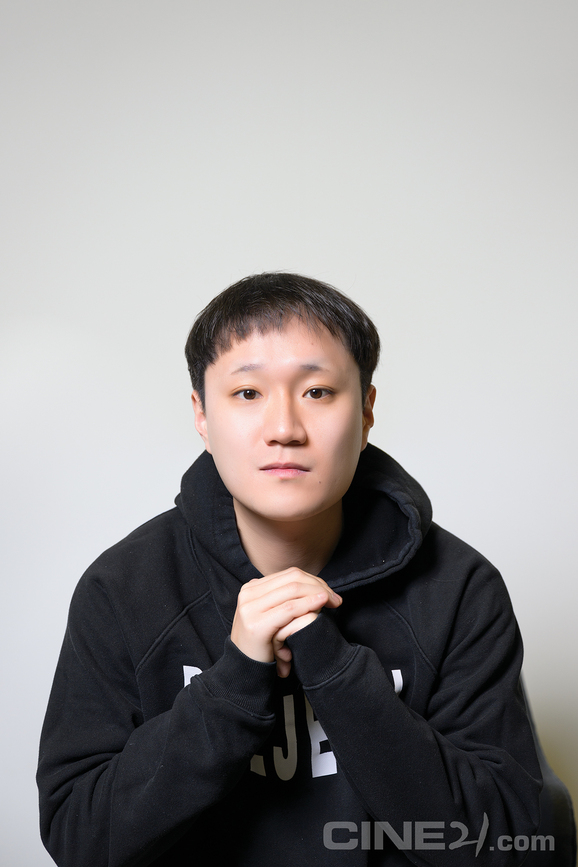
현 INK의 집행위원 중 한명인 황근하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영화·영상과 관련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조재혁, 오한영과는 대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라 자연스레 넷이 모이게 됐다. 당시 조재혁이 대전의 대덕구 청년공간인 청년 벙커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서 첫 상영회를 열었고 60~70명의 관객도 함께 관람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 같더라. 그래서 워크숍을 추가로 열어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 배우, 스태프를 모집한 뒤 그들끼리 장비를 공유하고 촬영 품앗이를 하는 형태로 영화제작 편수를 늘려나가고 상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렇게 1회 상영회가 끝나자마자 INK가 출범했다. 거창한 변화나 혁명을 바라고 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지속 가능할 때까지만 INK를 유지할 생각이고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무언가를 재밌게 하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구나 하는 정도로만 남아도 괜찮겠다고 여기고 있다.
- 네명의 집행위원들은 각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나.
황근하가 공간을 대여하거나 인프라를 연결해오고, 조재혁은 시나리오 워크숍 및 행정 처리를 하며 오한영은 제작팀의 일종의 라인 프로듀서로서 연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나는 황근하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으로 INK 프로젝트를 2년 정도 전담하면서 주요한 일을 맡아왔었다. 주된 업무 중에선 필름 인 대덕(F.I.D) 영화제의 프로그래머 활동, 여름영화 제작 워크숍, 10SF(10만원으로 찍는 SF영화) 워크숍, INK 시네클럽 운영 등이 해당한다.
- ‘INK 2024 시네클럽: NICHOLAS RAY’, ‘INK 2024 시네클럽: MIZOGUGHI NARUSE OZU’ 등의 상영회에서 니컬러스 레이, 미조구치 겐지, 나루세 미키오, 오즈 야스지로 감독 등의 영화를 상영한 바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작품을 골랐나.
시네클럽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됐다. 혹은 저작권이 만료된 영화들 중 골라 상영하기도 했고 영화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와 영화에 관해 대화할 때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야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겠다는 싶어 그에 대항하는 고전을 고르기도 했다. 영화를 관람한 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운영됐다.
- INK에서 가장 주요한 행사 중 하나는 필름 인 대덕(F.I.D) 영화제다. 해당 영화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영화제를 다니면서 몇몇 주요한 영화제들이 상영하는 독립영화, 단편영화들을 나머지 영화제가 공급받아 다시 트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는 게 재미가 없었다. 상기해보면 학창 시절에 제작된 영화들이 조악하지만 나름의 빛나는 지점이 있었고 이런 게 내가 보고 싶은 작품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필름 인 대덕 영화제가 출범했고 다른 영화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화, 적은 금액과 인프라로 제작됐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은 작품들을 해당 영화제에서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름 인 대덕 영화제의 ‘INK’ 섹션에선 INK의 여름영화 제작 워크숍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이 상영되며 지역영화도 꾸준히 소개하려 한다. 필름 인 대덕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은 월드프리미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롭고 신선한 영화를 만날 때의 즐거움이 상당하다.
- 필름 인 대덕 영화제가 열렸던 소소아트시네마를 포함해 행사마다 공간을 옮겨 상영회 및 워크숍을 이어가고 있다.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느낀 적도 있는지.
처음 INK를 시작했을 때엔 한 공간에 정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하지만 상영과 촬영에 필요한 장비, 공간 관리자 등 고민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더라. 반드시 거창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님에도 말이다. 공간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지만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는 아니라는 게 현재의 입장이다. INK는 수익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인 및 집행위원들의 직장을 통해 장소를 섭외하고 있다. 유지비를 낮춰야 오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NK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수익 사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INK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사업이나 청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작은 예산을 가져온 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해보자는 기조를 갖고 있다. 지원금에 너무 휘둘리고 싶지 않고, 학창 시절의 영화제작 경험에 비춰봤을 때 영화를 만드는 즐거움, 완성도와 예산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돈이 없을 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데에서 오는 제작의 즐거움이 있었다. 그건 단순히 영화를 제작할 때 뿐만 아니라 상영회와 워크숍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자유와 즐거움을 굳이 포기하고 싶지 않다.
- INK의 올해 계획에 관해 이야기해준다면.여름영화 제작 워크숍과 필름 인 대덕 영화제, 10SF 워크숍 등의 프로젝트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열릴 예정이고 ‘사각사각 프로젝트’라는 시나리오 워크숍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는 INK의 활동을 대폭 줄이려 한다. 본래 INK를 전업으로 매니징하는 것이 나의 업무였는데 상황상 그게 어려워져서다. 하지만 반드시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강박은 없다. 작게라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게다가 5년차인 현재는 조금만 노력하면 알아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정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