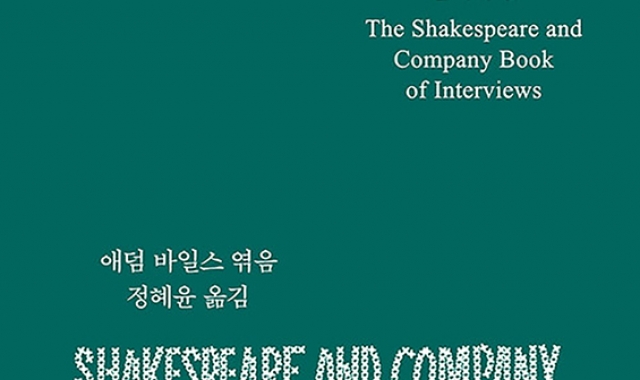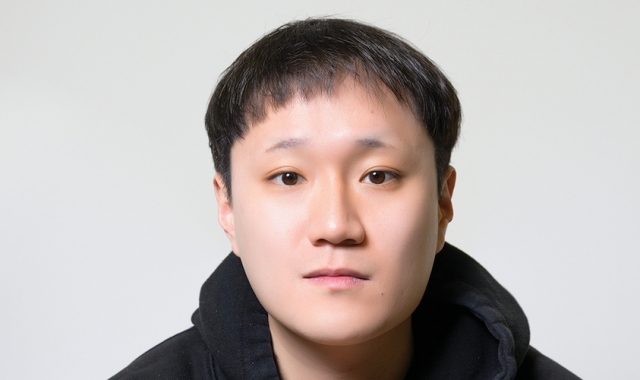짧게 쓰고 쉽게 말하라. 효과적인 소통의 필수조건이다. 나처럼 미디어에서 활동하며 종종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연에 불려나가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원칙이다. 여기서 ‘대중’은 소위 엘리트에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대중이지만은 않다. ‘불특정다수’로서의 대중이다. 내 말을 듣고 글을 읽는 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과 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태에서 말을 걸고 글을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들은 대개 이질적인 집단이다. 각자의 지식수준과 범위 그리고 취향까지 천차만별인 청중을 상대하려면 결국 짧게 쓰고 쉽게 말하는 게 최선의 방책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른바 ‘대중매체’ 시대에는 이 방책이 종종 “시청자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전제하라”는 실천적 금언으로 표현되곤 했다. 비록 미디어 연구자이기는 해도, 또는 오히려 그래선지 나는 이 말이 무척 마음에 안 들었다. 시청자 가운데 하나인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였고, 평균 학력이나 지식수준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신장된 현재의 대중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관습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스스로 연구자의 껍질을 벗고 대중매체의 중심에 들어온 지 어언 7년이 흐르다 보니 현장에서 구른 이들의 통찰과 지혜가 이 금언 속에 ‘짧고 쉽게’ 집약돼 있다고 인정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금언이 ‘관습적으로’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대중은 실존하는 대상이기보단 구성된 대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중이 이미 그곳에 있었기에 대중매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대중매체가 (그런 미디어와 일상적으로 관계 맺는) 대중을 만들어낸 것에 가깝다. 불특정 다수와 그것도 현장에서 실물적으로 마주하지 않은 채 동시적으로 (혹은 일정한 시차를 둔다 해도 사실상 실시간에 가깝게) 소통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방송’(放送; broadcasting) 기술, 즉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라디오와 TV 방송은 진정한 대중매체의 시작이자 본령이었다. 대중은 그 전파가 미치는 거대한 돔 아래에 모여든 이들이었다. 그렇다면 꽤 다른 종류의 미디어 기술이 등장해 있는 지금, 그런 미디어와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대중인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각각의 미디어는 어떤 종류의 청중과 만나고 있거나 만나려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들과 미디어가 지금 맺고 있고 앞으로 맺어가야 할 관계, 즉 소통 형식의 본질을 지목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고 과거보다 더 짧아지고 쉬워져야 하는) 중2일 수도 있으나, 어지간한 ‘덕심’이 아니고서는 상대하기 어려울 극히 마니악한 중2일 수 있다. 학력이 박사라고 해도 실질적인 문해력은 현실의 중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지 모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2라는 단순화로는 도저히 포괄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청중일 테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