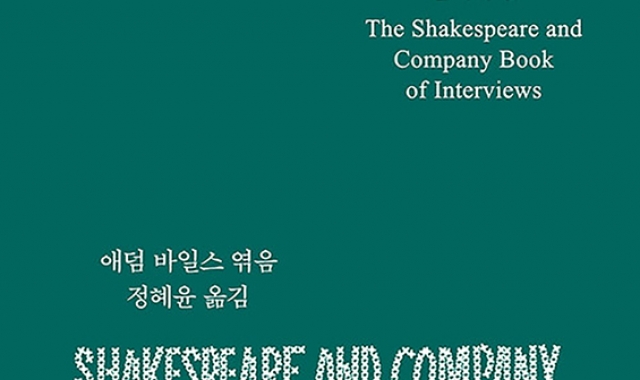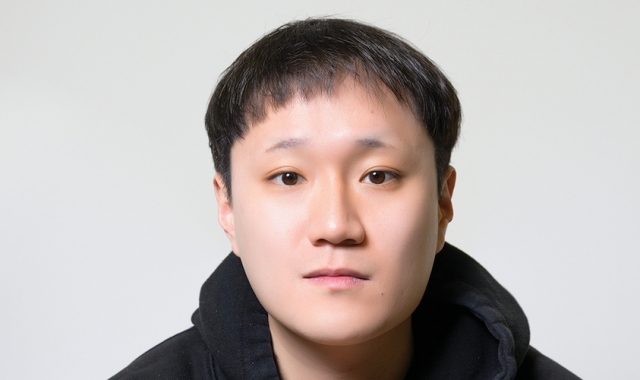영화기자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직업적 사치 중 하나는 아마도 감독과의 인터뷰가 아닐까 싶다. 동시에, 영화를 사이에 두고 감독과 직접 대화를 나눈다는 건 여러모로 곤란해서 외면하고 싶은 작업이기도 하다. 어떤 감독님은 말을 너무 아끼거나 도무지 의중을 짐작할 수가 없어 인터뷰가 이어질수록 우리를 미궁 속에 밀어넣는다. 반대로 너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도 위험하다. 정작 영화에선 보이지 않던 것들마저 부연 설명을 통해 보충될 때 이것이 온전한 감상인지, 아니면 현란한 언어에 설득되어버린 건지 구분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셀로판지마냥 얇디얇은 귀를 지닌 나는 진정성 어린 감독들의 설명에 빠져 시큰둥했던 영화가 사랑스러워 보였던 기억이 적지 않다. 어느 쪽이든 영화를 향한 ‘말’은 애초부터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사족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그런 점에서 봉준호 감독은 매우 희귀한 케이스다. 자신의 영화를 해설하는 봉준호의 언어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대체로 딱 맞아떨어진다. 개인적으로 그 어떤 자세한 분석이나 예리한 평론도 봉준호 감독이 스스로 자신의 영화를 설명할 때의 정확성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만든 영화를 자신이 잘 설명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흔히 영화를 감독의 예술이라 정의하지만 실은 모든 스태프의 종합 창작이기도 한 까닭에 감독의 인식과 통제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 모든 순간을 감독 한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는 건 무모한 일이다. 하지만 정확한 비전으로 자신의 작업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통제하는 종류의 연출자인 봉준호 감독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영화의 부품 하나까지 해설한다. 영화보다 위대한 평론이 존재할 순 있어도 봉준호의 말만큼 스스로의 영화를 정확히 투사할 수 있는 설계도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미키 17> 개봉을 앞두고 봉준호 감독과의 단독 인터뷰가 어렵사리 성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물개 박수가 절로 나왔다. 워낙 빡빡한 스케줄 탓에 일대일 인터뷰는 쉽지 않았지만 김소미 기자가 베를린까지 날아가 기어이 봉준호 감독을 만날 수 있었다. 유명 TV프로그램과 기자회견 등 이미 여러 매체와 다양한 형태로 봉준호의 말을 접할 수 있는 마당에 괜한 유난을 떤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자와 감독이 일대일로 나누는 문답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서로를 자극하여 숨겨진 길을 발견해나가는 작업이자 어쩌면 창작자도 미처 몰랐을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보물찾기다.
애초에 보고 감상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작품을 꺼내, 구태여 다시 말을 보태고 모자란 부분을 메운다는 건 불필요한 행위다. 그럼에도 기자는 묻고, 감독은 답한다. 때때로 찾아오는 곤혹스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하고 반복된 작업을 기꺼이 이어가는 건 의례적인 문답 사이에 가끔 예상치 못한 보석 같은 순간이 선물처럼 찾아오기 때문일 것이다. 준비된 답과 질문이 아닌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지면이기에 허락된) 행복한 오솔길. <씨네21>에서는 <미키 17>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아담한 오솔길로 여러분을 안내할 준비를 마쳤다. <씨네21>의 가이드는 이번주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 관심을 놓지 말고 지켜봐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