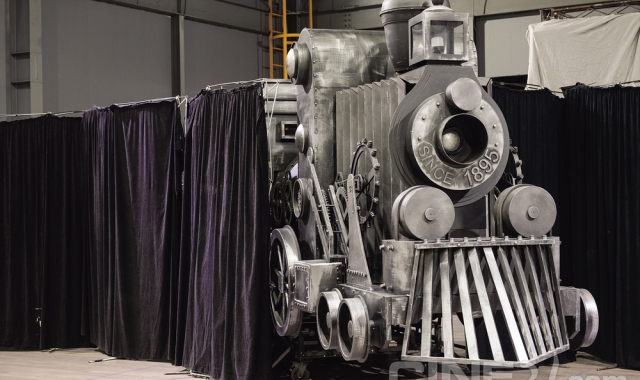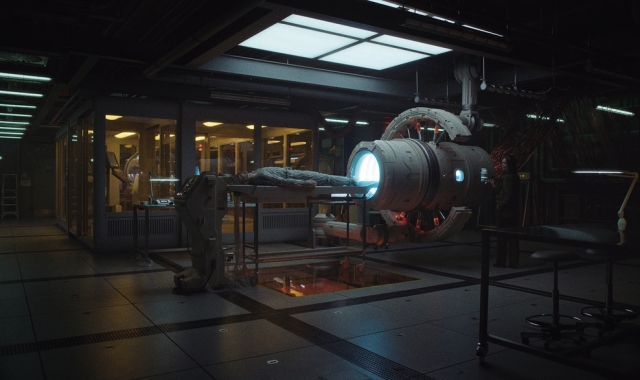<국경의 남쪽> 촬영장엔 감독이 ‘둘’ 있었다. 의상, 소품, 미술을 담당한 스탭들은 안판석 감독의 허락을 맡기 전에 연출부 막내 김철용(32)씨의 ‘오케이’부터 받아야 했다. 북쪽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제대로 묘사해야 한다는 안판석 감독의 고집 때문에 촬영 내내 김철용씨의 힘은 커져만 갔다. “코미디영화였거나 북쪽 사람들을 조롱하는 영화였으면 아예 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김철용씨는 2001년 탈북한 새터민. 안판석 감독은 취재 차원에서 그를 만났다가 당시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다니고 있던 그를 아예 스탭으로 불러들였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이해를 서로 잘 못해서 일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를테면 북쪽에서는 모두 견장이라고 부르는데, 남쪽에서는 견장하고 계급장하고 따로 불러서 오해가 있었거든요.” <국경의 남쪽>에서 그는 선호 가족의 남행을 돕는 가이드로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영상은 한계가 있지요. 두만강을 실제 건너본 사람은 알지만 1m 앞으로 나가는데 몇년 세월이 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동강에서 그 장면을 찍을 때 거센 물살에 두 차례나 휩쓸렸는데 그때는 탈북 당시의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북쪽에 있을 때 그의 꿈은 배우. 리계순대학에서 어문학을 전공했던 그는 한때 유랑극단 기동대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전국적인 배우 공모 때도 최종 엔트리 30명 안에 뽑히기도 했다. “노출된 직업으로는 배우 일이 당 간부 다음 정도 돼요. 일반인들로서 의사나 법관은 넘볼 수 없는 직업이고.” 남쪽에 와서 연극영화과에 진학했던 이유도 배우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말을 바꾸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았고, 진입장벽도 높고. 어느 날 교수님이 저보고 네가 만든 영화에 출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하셔서 그 뒤론 감독을 지망했지요.” 그가 처음 만든 단편영화는 <착각>. 굶주림 끝에 자신의 아이를 먹은 엄마를 소재로 했다. “실제 제가 본 사건인데. 마을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데 언젠가 다시 장편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타짜>에서 백윤식에게 북쪽 사투리를 전수하고 있는 그는 “<국경의 남쪽>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물러나서 현장을 보게 되니까 배우게 되는 점이 또 있더라”면서 “본격적인 남쪽 영화에서 스탭으로 뛰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