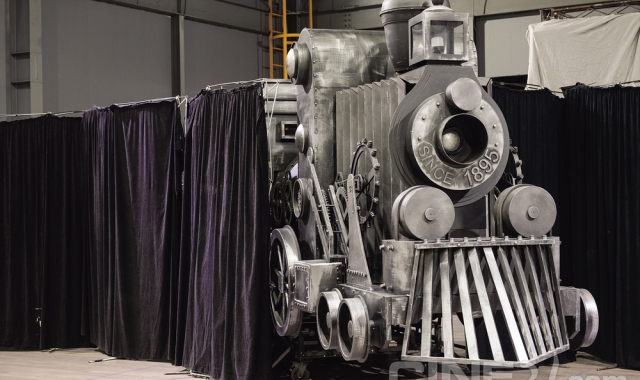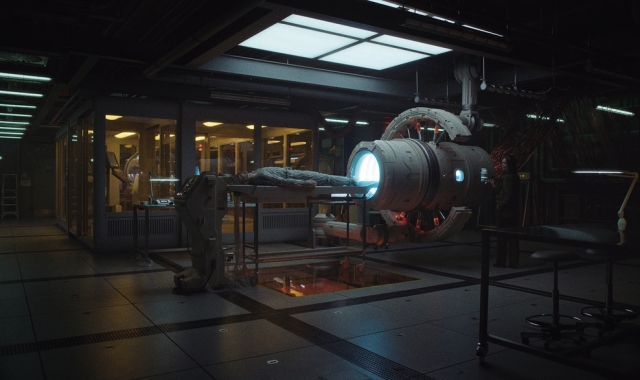일상 속 진부함 깨는 독창적 웃음 제조
백화점 계산원·연극반 경험 큰 자산
“나중에 영화 만들고 싶어”
그런데 콩트 아이디어 좀 주실래요?

강유미(23)의 개그는 ‘생활의 발견’이다. 그는 가장 진부한 단면을 잘라내 무대에 올리는 특별한 눈썰미를 지녔다.
한국방송 〈개그콘서트〉에서 유세윤과 함께 만들고 있는 ‘사랑의 카운슬러’의 인기도 그가 불러일으키는 공감에 기대고 있다. 동대문 쇼핑몰 판매원이 직업인 부인 역만 해도 그렇다. 처음 보는 사람도 ‘언니’, ‘오빠’라고 부르거나 ‘돌아보고 다시 오라’라고 말할 때 드러나는 심드렁함에 “맞다 맞다” 하며 손뼉 치게 된다. 그는 이런 묘사를 손님과 종업원 사이가 아닌 부부의 대화에 끼워넣는다. 익숙하지만 어울리지 않은 상황이 곁들여져 신선한 웃음을 낳는다.
대상이 진지할수록 진부함을 비트는 쾌감은 커진다. 그는 ‘봉숭아 학당’에서 기자 흉내를 내며 목소리를 내리깔고 “시민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따위의 상투적인 문장을 읊었다. 급박하고 중요한 뉴스인 듯하지만 사실 아무 내용 없다. 권위를 우스개로 만드는 재치가 은근히 통쾌하다. 그런 관찰력은 타고나나? 지난 7일 한국방송에서 요즘 숨돌릴 새 없이 바쁜 강유미를 만났다.
“좀 이상한 데서 웃긴 해도 평범해요.” 경험은 아이디어의 밑자락이 돼줬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부터 1년 동안 했던 백화점 계산원 일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일하며 친해진 언니들한테 비슷한 말투와 행동이 보여요.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점심시간은 40분인데 그때 꼭 일 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나간 제품 값과 들어온 돈이 딱 맞아야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머릿속이 항상 복작거려서 계산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딱 떨어졌을 때 쾌감은 생생해요.” 2002년 위성텔레비전의 개그맨 콘테스트인 ‘한반도 유머 총집합’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뒤 개그맨이 되겠다고 서울 고시원에서 보낸 시간들도 만만찮다. “공동 냉장고에서 누가 제 계란 한 개 훔쳐 가면 화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훔쳐 먹을 때도 있었죠.”
관찰과 경험을 살려 표현하는 능력은 연극에 빚졌다.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연극반으로 활동했다.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 하잖아요. 연극이 낙이었죠.”
사실 콩트 짜기 실력은 경기도 광주 고향에서 보낸, “미친 듯 놀았던” 어린 시절부터 다진 것이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장난감이 별로 없었어요. 동네 애들이랑 이야기를 만들어 연극하거나 사극이나 〈600만불의 사나이〉 같은 외화도 따라했어요. 요즘 학원 다니는 애들 보면 불쌍해요.”
풀어놓고 키워준 부모도 그가 개그맨이 되겠다는 데는 반대했다. 그는 고집스레 밀고 나갔다. “자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리 녹록한 길이 아니었다. 2004년 〈폭소클럽〉에서 선보인 ‘여자 이야기’는 들인 공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다. 안영미와 짝을 맞춰 콩트를 짤 때만 해도 여성끼리 한 팀을 이루면 뜨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고고 예술속으로’는 보기 좋게 홈런을 날렸다.
경험도 쌓였지만 개그 콩트를 만드는 건 여전히 버거운 일이다. “사랑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카운슬러’를 시작했는데 매주 2개씩 짜내야 하니 겨우 버티는 기분이 들어요. 세윤 오빠가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데도 그래요. ‘사람들의 연애 고민이 뭘까’ 항상 생각해요.” 그래도 그는 “철은 없어지고 꿈은 커진다”며 “나중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