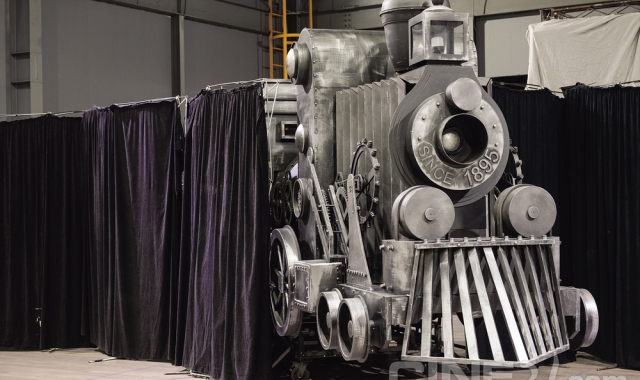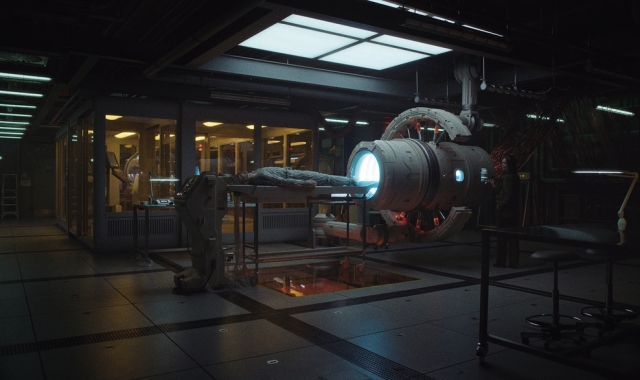“이럴 때 누가 죽어주면 딱 좋은데 말이지.” 동료기자와 이런 말을 예사로 주고받은 적이 있다. 사람들에 대한 작은 기사가 모여 있는 페이지를 담당했던 나와 그는 마땅한 뉴스거리가 없는 날이면 특별히 취재를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 영화계 인사의 부고 소식을 기다리곤 했다. 누군가의 죽음이 먼 이국땅의 기자들에게 그렇게 작은 안도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예전엔 몰랐다. 늘 하는 생각이지만, 기자들은 참 싸가지가 없다.
국내 영화계 인사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정식 취재가 필요하다. 그 취재는 항상 뻘쭘하고 대부분 어색하며, 때에 따라서는 집요할 필요까지 있다. 취재원은 대부분 고인의 지인들. 그 사람과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의 소감 등 뻔한 질문 목록 대부분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처구니없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한 페이지 이상을 할애해야 하는 부고기사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취재할 만한 지인을 물색하고, 조문하고 나오는 이들을 붙잡고 무턱대고 질문을 던지고, 한마디라도 새로운 말을 듣기 위해 묻고 또 묻는다. 스스로의 무례함에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그 과정이라니. 스캔들에 휘말린 연예인의 집 앞에서 진을 치는 연예정보프로그램 리포터라도 된 듯 민망하다. 난감함을 토로하는 나에게 한 선배는 “기사를 써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릴 수 있다”는 식으로 위로했다. 틀린 말은 아니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 마음으로 알아들었던 건 아니다.
입사 이후 한 페이지 이상의 부고기사로 신상옥 감독과 이강산 조명감독을 썼다. 신상옥 감독이 제작한 200여편의 영화 중 단 한편만을 본 상황에서 3일 동안 빈소로 출근했고, 밤샘 마감 이후 늦은 출근을 앞둔 어느 날 아침 이강산 조명감독의 빈소 취재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신상옥 감독의 빈소를 찾은 수십명의 원로 영화인들에게서 옛날이야기를 청하면서 실례를 범하는 건 아닐까 늘 전전긍긍했고, 이강산 조명감독 부고를 위해서는 취재필(必) 인사인 김성수 감독과의 통화가 어렵사리 이루어졌으나 “도저히 지금은 전화를 못하겠다”는 굳은 대답에 어찌할 바 모르게 되어버리기도 했다. 지인들의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나는 그것을 굳이 말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데 신기한 건 신상옥 감독의 장지에서 마지막으로 눈길을 던진 영정사진 속 고인은, 새삼스레 참 멋있었다는 사실이다. 후배들이 전한 그분의 생전 모습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신을 추슬러 다시 전화를 걸어준 김성수 감독은 끝내 울먹이며 말을 잊지 못했다. 무슨 말을 더할 수도 없어 먹먹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데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욕심이 생긴 건 그때였다. 좀더 빨리 직접 인터뷰를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만큼 훌륭하고 좋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으로 느껴졌고, 거짓이 아닌 그 무엇, 혹은 나의 진심만으로 기사를 쓰고 싶었다. 성공여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기사를 쓰는 동안 그야말로 생면부지의 누군가가, 마음으로 그리웠다. 나는 그것이 나의 진심이었다고 믿는다. 읽는 이에게도 그것이 전달되기를 그처럼 간절하게 바란 것은 그 두번을 제외하면 정말 드문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