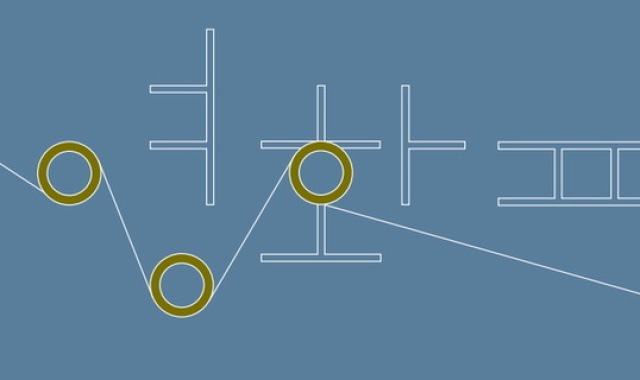마스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설립된 영화 수입사다. 역사는 짧지만 <색, 계>를 시작으로 <포비든 킹덤: 전성의 마스터를 찾아서>를 거쳐 <노잉>과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마스엔터테인먼트는 100만명 이상 흥행작을 네편이나 내놓았다. 수입사 전성시대(혹은 수입사 전국시대)에 풀숲에서 튀어나온 무림 고수라고나 할까. 하지만 마스엔터테인먼트가 화성으로부터 갑자기 떨어진 영화사인 건 또 아니다. 대표인 마이클 김은 이미 지난 20여년간 외화를 구매해온 이 세계의 베테랑이다. 그가 마스엔터테인먼트 설립 이전에 구매했던 영화들의 리스트를 한번 죽 늘어놔보자. 테오 앙겔로풀로스의 <영원과 하루>, 크지슈토프 키에슬로프스키의 삼색 시리즈, 라스 폰 트리에의 <브레이킹 더 웨이브>, 밀코 만체프스키의 <비포 더 레인>, 마티외 카소비츠의 <증오>, 그리고 <브로크백 마운틴>. 게다가 마이클 김 대표는 캐롤코 영화사 출신의 전설적인 제작자 마리오 카사, 홍콩의 빌 콩 같은 세계영화계의 거물들과도 오랜 친구다. 이쯤되면 이 신사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논현동의 마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들어서니 내부 수리가 한창이다. 마이클 김 대표에 따르면 “J엔터테인먼트와 동업으로 회사 규모를 조금 확장하고, 구매와 투자도 앞으로 함께할 예정”이란다. 수입사 전국시대에 맞서는 전열 정비가 한창 치열하다.
-다들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 칸에서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안티크라이스트>의 개봉 여부다.
=심의가 부결되면 돈을 돌려받는 걸로 계약했다. 칸 버전 그대로는 심의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웃음) 보카시(모자이크)를 치면 될 테지만 난 그런 게 싫더라. 지금 라스 폰 트리에가 소프트 버전을 만들고 있다.
-소프트 버전은 경악스러운 맛이 좀 떨어질 텐데.
=그래도 어쩌겠나. (웃음) 샬롯 갱스부르가 자기 성기를 자르는 장면은 나도 도저히 못 보겠더라.
-<색, 계>는 대체 심의를 어떻게 통과했던 건가.
=심의위원들이 보는 스크린은 조금 작은 편이다. 그래서 양조위 고환이 확실히 안 보였나보더라. 개봉 뒤에 화제가 되니까 심의위원들이 그러더라. 우리가 심의 통과하고 나서 그 장면을 따로 잘라서 붙인 거 아니냐고. (웃음)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이하 <터미네이터4>)은 한국에서만 잘되고 미국 흥행성적은 실망스러운 편이다.
=미국에서는 안티도 좀 있었다. 지금까지 시리즈가 모두 R등급이었는데 <터미네이터4>는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 PG13으로 낮췄다. 그것 때문에 여론이 부정적이었다. R등급용 편집본을 봤는데 문 블러드굿과 샘 워딩턴의 러브신도 있다. 다 삭제됐다.
-<터미네이터4>는 소니와 워너가 제작한 영화다. 어떻게 직배가 아니라 마스에서 수입할 수 있었던 건가.
=미국 내 배급은 워너가, 전세계 배급은 소니가 맡았다. 사실 소니가 한국 배급을 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마스에서 빼오기가 쉽지 않은 영화였다. 가져오느라 한 3개월간 싸움을 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 제작자인 마리오 카사와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 덕에 한국시장을 맡았다. 소니쪽에선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웃음)
-마리오 카사라면 전설적인 캐롤코 영화사 출신의 거물 아닌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내가 영화 구매를 시작한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가족 같은 관계다. 집에 가서 식사도 종종 같이 하고.
-그럼 5, 6편도 마스에서 가져오는 건가.
=아직은 모른다. 5편과 6편은 내년에 동시에 찍어서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개봉한다는 말이 있더라. 감독은 여전히 맥지가 맡을 예정인데 이번에 죽은 샘 워딩턴을 어떻게든 다시 합류시키려는 모양이다.
-크리스천 베일보다도 훨씬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터미네이터4>는 막판에 시나리오가 유출돼서 내용이 변경됐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사실이다. 유출이 됐다. 그런데 내가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던 4∼5년 전으로부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크리스천 베일 역할이 아예 없었다. 샘 워딩턴과 문 블러드굿이 주연인 영화였다. 베일이 캐스팅되면서 내용이 확 뒤집어졌다. 지금 대본이 제일 좋긴 하지만.
-어떤 경로로 영화 수입을 시작하게 됐나.
=언제나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미국 살 때 우연히 워너브러더스 부사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날더러 영화쪽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더라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는 내가 좋아하는 예술영화들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미국에는 언제 갔나.
=1976년에 가족 이민을 갔다. 한국에 이민 바람이 불기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해야 할까. 그때 고3이었다. (웃음)
-미국에서 거주한 것이 외화 수입업에 도움이 되나? 결국 그 동네 비즈니스 감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니까 말이다.
=미국 회사든 유럽 회사든 결국 이 세계에서는 인맥이 제일 중요하다. 서로의 인간적인 관계가 별로면 돈을 더 얹어줘도 영화를 안 파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제작사들은 영화를 팔아놓고 계약서를 토대로 은행에서 펀딩을 받는다. 은행에서 돈을 받았는데 계약 진행이 안되면 파는 회사에 손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신뢰다. 어떤 수입사들은 사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만 그들에게 들이밀지만 나는 사건 말건 언제든지 마켓에 들어서 안부인사를 한다. 그런 게 도움이 크게 된다. 그리고 영화가 기획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는 순간 이미 늦었다. 기획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구매해야 한다. 영화사가 특정한 작품의 판권을 샀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비즈니스는 시작이다. 이 세계는 속도와 정보전이다.
-마스엔터테인먼트가 처음으로 대박을 기록했던 건 <색, 계>부터다. 전에 누가 <색, 계>가 없었더라면 마스도 없었을 거라고도 하던데. (웃음)
=홍콩 제작자인 빌 콩과도 돈독한 관계인데, 그가 어느 날 <색, 계>를 강력 추천하더라. 70만달러라는 고가여서 망설이는데 빌 콩이 만약에 한국에서 흥행이 안되면 돈도 다 물어주겠다며 권하더라. 그래서 갬블을 걸어봤다. 처음에 스틸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직원들이 화들짝 놀랐다. 장사 안되는 대만영화에 탕웨이라는 신인배우가 주연이고. 내가 그림은 괜찮지 않냐니까 직원들이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웃음)
-직원들이 고개를 저을 만큼 상업성이 없어 보이는 영화인데 70만달러나 주고 샀을 때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였나.
=나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대본을 읽고 프로모션용 영상을 보는데… 감이라는 게 있잖나. 감이 딱 오더라. 80만명 정도는 될 것 같더라. 200만명이 넘을지는 나도 몰랐다. (웃음)
-그런 ‘감’은 어디서 오는 건가.
=감독. 그리고 시나리오. 스탭들의 면모. 그걸 종합하면 나온다. 보통 좋은 영화라는 감이 오면 기획부터 완성까지 2∼3년은 집요하게 쫓아다닌다. 제작자들과 친분이 있어서 기획 단계에 들어가는 순간 미리 언질을 받는다. 사실 요즘은 프리바잉(Pre-buying)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제는 선전비다. 만약 100만달러를 주고 산 영화라 할지라도 막상 나온 결과물이 별로면 작게 개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작게 하더라도 광고비가 15억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해외 마켓에 나가는 순간 다른 수입사들과의 경쟁도 치열하지 않나.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얻는 편이다. 그래서 결단도 빠른 편이고. 어떤 영화는 한국 수입사 20개가 동시에 몰려서 비딩(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 비딩가도 엄청나게 올랐다. 일본은 수입사끼리 단합해서 가격도 적절히 조절하는데 한국은 그게 안되더라.
-왜 그럴까.
=글쎄. 영화라는 게 원래 가격이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5만달러짜리가 100만달러짜리 영화보다 더 좋고 잘될 수도 있는 게 영화시장 아닌가. 이를테면 <브로크백 마운틴>은 영화를 미리 봤는데 너무 좋더라. 처음 가격은 60만달러였다가 구매자가 없으니 25만달러까지 떨어졌다. 판매자에게 이 영화는 절대 한국에서 잘될 리 없다고 했다. 웨스턴 카우보이 영화에 동성애 코드까지 있는데 잘될 리가 없다고 했다. 많이 줘도 5만달러라고 호언하고 결국 5만달러에 샀다. (웃음) 그런데 한국에서 꽤 관객이 많이 들었다.
-완전 소더비 경매다. (웃음)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던 영화는 뭐가 있나.
=마스엔터테인먼트 창립작인 <비커밍 제인>과 <공작부인: 세기의 스캔들>이다. 시대극이 힘들다. 서울에서는 먹혀도 지방에서 안된다. 영국 시대극 중 장사가 된 건 <오만과 편견>과 <천년의 스캔들>뿐일거다 아마. 오히려 <터미네이터4>처럼 큰 영화가 리스크가 적다. 가격이 2만∼3만달러로 저렴한 예술영화들도 리스크는 적다. 조촐하게 CGV무비꼴라주나 백두대간에서 소규모로 상영시키면 오히려 짭짤하다. 진짜 힘든 건 어중간한 규모의 영화들이다. 만약 영화가 50만달러짜리면 6억5천만원이다. 거기에 선전비 10억원이 들어가면 16억5천만원이다. 10억원. 적은 돈 아니다. 흥행에 실패하면 아파트 하나 날아간다고 봐야지. (웃음)
-그럼 가장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잘된 영화는.
=<포비든 킹덤: 전설의 마스터를 찾아서>다. 영화는 솔직히… 참 아니다. (웃음) 그래도 성룡과 이연걸이 함께 출연하기 때문에 구입했다. 가격도 비쌌다. 그런데 광고를 잘해서 조금 벌었다. 그런 영화는 움찔움찔하면서 광고비 아끼면 더 망한다. 두 배우를 앞세워서 홍보를 밀어붙여야 한다. 한 15억원 정도가 홍보비로 나갔을 거다. 그리고 <어웨이 프롬 허>도 괜찮았다. 영화는 좋은데 10만달러를 달라고 해서 2만달러에 달라고 했다. 결국 5천달러 더 얹어서 2만5천달러에 샀다. (웃음)
-영화 수입이란 도박과 비즈니스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업인 것 같다.
=그래도 영화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웃음) 아까도 말했지만 판단이 중요하다. 50만달러 주고 미리 샀는데 결과적으로 영화가 지나칠 정도로 별로라면 그냥 10여개관에서 홍보없이 상영하고 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될까? 안될까? 될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선전비 투자하면 큰일난다. 나에게 재미없는 영화는 남에게도 재미없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절대 피해야 하는 영화들은 어떤 건가.
=배우는 아니다. 배우를 믿으면 안된다. 알려진 배우가 있어야 티켓파워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배우가 세상없이 좋아도 예전만큼 흥행이 잘되는 시대가 아니다. 배우보다는 제작진과 감독의 퀄러티가 훨씬 중요하다.
-앞으로 기대하는 라인업은 뭐가 있나.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하는 영화가 하나 있다. <생텀>(James Cameron’s Sanctum)이라고, 심해 다이빙에 대한 영화다. 그가 제작하고 배우도 선정하고 편집까지 한다고 들었다. 촬영은 8월 즈음에 들어가서 2010년 개봉예정이다. 뤽 베송 신작도 있다. 프랑스 판타지 코믹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Les aventures extraordinaires d’Adele Blanc-Sec>이다. 올해 라인업으로는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신작 <바리아>(Baaria-La porta del vento)가 있다. 제작비가 3천만달러인 이탈리아 역대 최고의 대작이고 베니스영화제 오프닝작이 될 것 같다. 아톰 에고이얀의 신작 <클로에>(Chloe)도 있다. 리암 니슨, 줄리언 무어, 아만다 시프리드가 나오는 <위험한 정사>류의 드라마다.
-카메론 영화는 가격이 꽤 나가겠다.
=아니다. 가격은 아주 괜찮다. 사실 이걸 구입할 시점에는 이 영화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영화가 기획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빨리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기다렸다가는 다른 한국 회사들이 덤벼드니까 가격도 올라간다.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 두 영화도 각본에 제작자만 정해지는 순간 구입한 거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와서 서구 제작자들과 친분이 돈독하다. 비슷한 가격이면 결국 내가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원하는 외화를 수입해서 개봉시키다 보면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싶은 생각도 들 텐데 말이다.
=여유가 생기면 저예산의 작은 예술영화를 직접 제작할 마음이 있다. 칸, 베니스, 베를린영화제의 집행부에도 인맥은 많다. 그쪽에서도 좋아할 만한 퀄러티에 흥행성도 첨부된 예술영화면 좋을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영상미가 좋은 작품에 끌린다. 한국어로 만들더라도 해외 관객에게 비주얼 자체로 이해될 수 있는 영화를 언젠가는 꼭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