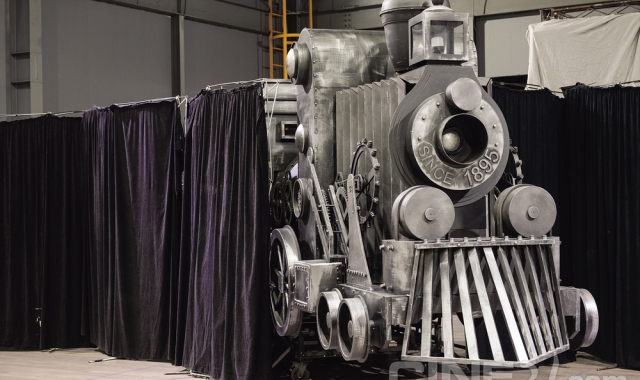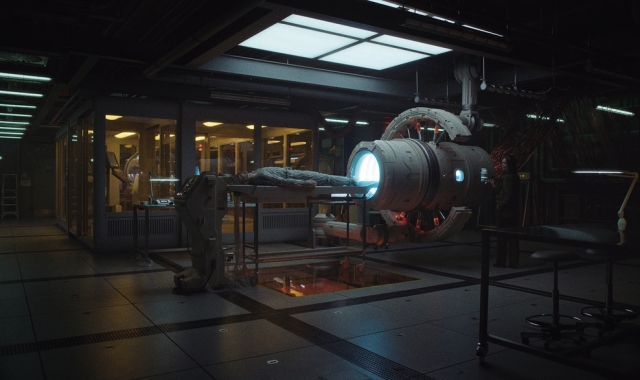홍형숙의 다큐멘터리 <경계도시2>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예상치 않게도 이 영화는 <경계도시>를 훨씬 뛰어넘는 내적인 긴장의 강도가 있었다. <경계도시>에는 없었지만 <경계도시2>에는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체를 가늠해보려 한다. 두 영화 모두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남과 북 어느 체제에도 속하지 않고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송두율 교수의 삶에 대해 <경계도시>에서의 카메라가 겸손하게 숙이고 들어가 응시한다면 <경계도시2>에는 그런 송두율 교수를 바라보는 카메라가 수평적인 대치와 긴장의 강도를 버텨내기 위해 힘겨워한다는 인상을 준다. 관람하는 이에게는 거꾸로 그 긴장이 굉장한 에너지로 전이되어 송 교수와 카메라와 관객이 수평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한다.
인물과 수평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카메라
<경계도시>에서 그토록 당당했던 송두율 교수는 <경계도시2>에서 감격의 귀국을 한 뒤 국정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혹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사방의 추궁에 고통받는다. 그가 노동당 서열 상위에 오른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은 일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송두율 교수의 명확하지 않은 해명 때문에 삽시간에 그는 거짓말쟁이로 몰린다. 그에 대한 도덕적 음해과정은 좀더 집요해지고 언론의 선동으로 조성된 이른바 국민여론이라는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 그를 보호하던 국내의 진보진영도 보수진영과 똑같은 입장으로 그를 몰아세운다. 송두율 교수와 그의 부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경계인’이라는 말이 갈수록 연약한 울림을 띠고 강퍅한 현실에서 책상물림 학자의 팔자 편한 개념 놀이처럼 들리게 되는 순간들이 이어진다.
나는 송두율 교수의 경계인 개념을 잘 모른다. <경계도시>를 보고 그의 철학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생기지는 않았다. 뭐랄까, 이 영화에 담긴 입장은 미리 우리 편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카메라의 우호적 위치가 반영하고 있었다. 거꾸로 그것은 우리 편이라고 전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부유할 뿐이다. <경계도시2>를 본 뒤 나는 그의 경계인 개념에 담긴 철학적 입장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졌다. 이 영화에서 그와 그의 부인이 경계인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도덕적 결격사유를 만들어낸 한국사회의 지배블록의 음모, 국정원과 검찰과 언론의 합작공모에 대해 송두율의 친구들은 송두율의 편에 서지도, 심지어 객관적으로 조망하지도 못한다. 독일 시민권을 지닌 학자에게 독일 국적을 포기하라고, 노동당 가입을 사과하라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그게 남한에 들어와 고향땅에서 살기 위한 의무라는 명분을 달고서 말이다.
이쯤해서 <경계도시2>에서 가장 놀라운 긴장이 생겨난다. 카메라를 연출하는 홍형숙 감독의 입장에도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그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회의한다. 카메라 자체가 어떤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버티기하는 때부터 우리는 송두율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 다음, 또 다른 맥락, 외부에서 보면 당연한 맥락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송두율이 설령 사회주의자라 하더라도 그는 그 신념을 그냥 지키며 이곳에서 살면 안되는가, 라는 물음 말이다. 빨갱이란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우리에게 내재된 레드 콤플렉스는 전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른바 진보진영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에게도 있고 우리 세대에도 있으며 심지어 더 젊은 세대에도 있다. 한국에서 관성화된 생각들, 삶의 형태가 독일 시민이자 한국인이었던 송두율에게 가해지자 그는 졸지에 온갖 고난을 겪어낸 철학자에서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는 기회주의자가 된다.
경청하는 인내로 만들어낸 공감의 장
이런 한국사회의 삶의 상투형, 종국에는 억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투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없는 것인지 이 영화는 직설적으로 묻지 않는다. 화면에 보여진 것, 말해진 것 외에 남아 있는 틈으로부터 우리가 재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이게 <경계도시2>가 보여준 호소력이다. 피해자의 편에 서지도 않고 가해자의 편을 공격하지도 않으면서 충실히 경청하는 인내로 이 영화는 그런 틈을 만들어낸다. 영화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부재하는 현존의 효과로 드러나는 것이 한국사회의 삶의 상투형이다. 분단구조 아래서 고착된 국가보안법이라는 암덩어리가 번식하고 있는 그 상투형의 시스템 아래서 우리가 피해자인 척 가해자였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경계도시2>는 경계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을 추방시키고 남은 괴물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경계인을 배제하고 경계 안에 남은 우리의 삶은 그럼 어찌할 것인가.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지는 않지만 <경계도시2>는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주관적인 다큐멘터리 영역에서 내적 파열을 겪으며 도달한 이 경지는 놀랍다. 다른 한편에서 정작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무시무시한 침묵의 정체는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성찰만으로 세상을 바꿀 것인가. 영화 매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지만 어떤 위로도, 감정적 동화도 허락하지 않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의 부재의 흔적과 틈이 지닌 깊이에 반비례하는 한국사회의 성숙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감독 홍형숙은 <경계도시2>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이클 무어가 하는 식으로 공세적으로 좌충우돌하는 엔터테인먼트와 계몽성을 조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송두율 교수의 가족들을 끌어들여 정서적 동일화를 조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가 찍은 테이프 분량은 한달 동안 봐야 할 만큼 방대한 것이었고 그는 긴 시간 동안 추리고 추려 거리두기의 공간이 허용되는 만큼만 추려 구성했다. 선동과 감상과 대리만족의 찌꺼기들이 부유하는 정치와 대중문화의 공간에서 <경계도시2>가 마련할 공감의 장은 그리 넓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영화의 성찰적 입장에 공감하는 관객이 소수일지 아니면 예상보다 더 많을지 어느 때보다 궁금해진다.
때로는 헛된 희망보다 단호한 체념이 낫다고 생각한다. 더 절망하고 체념할수록 새로 시작하는 순간도 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도시2>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내 식으로 제멋대로 받아들인 그런 입장 때문이었다. 이 영화는 세상이 잘 되어갈 것이라는 희망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사건을 축으로 우리의 생각을 묻는다. 한 개인의 평생의 철학적, 이념적 신념이 망가지고 그의 말년의 운명을 불우하게 만든 사건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돼버린 것을 굳이 슬퍼하지도 않는다. 영화가 우리에게 군림하지 않고 주제넘게 위로하지 않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것, 심지어 송두율에게도 질문하지 않았던 그 윤리적 태도를 나는 존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