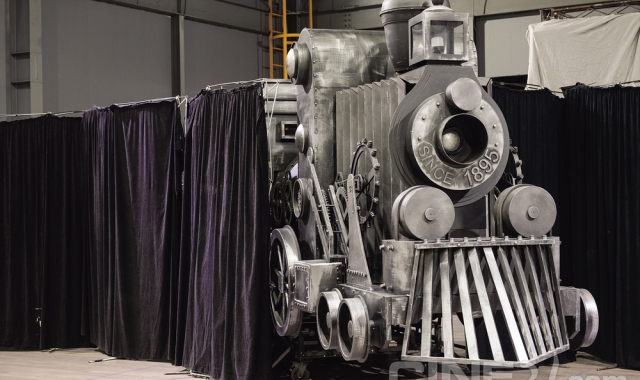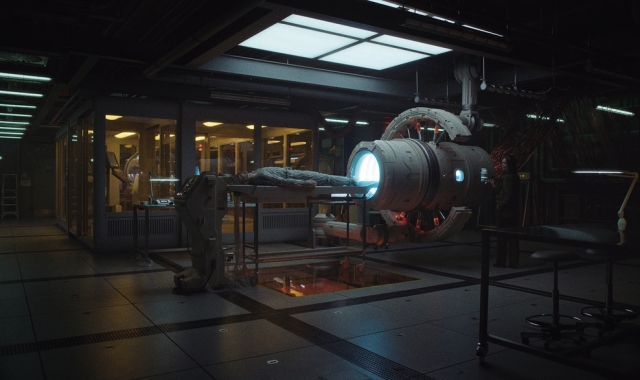수많은 범작 대신 단 한편의 영화로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가 있다. 그 영화는 교본으로 삼을 만한 걸작도 아니었고, 당대를 휩쓴 대중적인 성공작도 아니었다. 다만 다른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을,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영화였다. 1996년 태흥영화사에서 제작된 <미지왕>은 그간 한국 영화사에서 한번도 찾아볼 수 없는 실험정신으로 가득 찬 괴작이었다. 그렇다. 괴작.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것. 혹은 정체를 알기에는 너무 빨리 왔던 작품. 사람들은 이 영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컬트’라는 낙인을 찍었다. 당시 유행어였던 ‘미친놈, 지가 왕자인 줄 알아?’의 줄임말을 보란 듯이 영화 제목으로 달았던 이 작품 한편으로 컬트영화계에 지워지지 않을 족적을 남긴 김용태 감독은 그렇게 서서히 잊혀져갔다. 그리고 16년이 흐른 지금, 그는 지난 12월28일, 49살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났다. 황망한 이별. 다음 작품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가능성으로 남은 채 떠나 더욱 안타까운 이별이다.
단 한편이었건만 왜 사람들은 그의 다음 작품을 기다렸던 것일까. <미지왕>을 시대를 앞서간 감각의 안타까운 작품으로 그저 치켜세우는 건 너무 손쉬운 결론이다. 빈말로도 <미지왕>이 걸작은 아니지 않은가. 분명 이 작품은 컬트적인 감수성과 악취미, 지적인 장난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비단 그 때문만은 아니다. 이 영화의 행간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관습에 매몰되지 않았던 도전정신이다. 영화 곳곳에서 시도되는 거리두기는 수많은 대중문화로부터 ‘인용’된 전통과 결별하고 대중문화란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주변의 저속한 것들과 결속한다. 오로지 영화에 대한 애정만을 신념처럼 믿고 있는 이 영화는 관습에 젖어 있는 영화계 모두를 향해 그렇게 일갈을 날린다. 한번 놀아보자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발견한 가능성은 바로 그 지점 아닐까. 주류에 저항하는 과감하고 즐거운 창의성. 결론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에 좌절된 영화로 기억되고 말았지만, 이른바 위대한 실패란 이런 것이다. 시대를 앞서갔다는 그리 달갑지 않은 수사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놓치고 만 우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그가 지닌 영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애정은 고스란히 주위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간다. 김용태 감독과의 갑작스런 이별이 유난히 안타까운 것은 비단 그에게 기대했던 미지의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단 한편의 작품으로 사라져갔다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다. 비록 오랜 시간 그의 작품을 볼 수는 없었지만, 성균관대 부교수로 재직하며 영화교육 일선에서 예비 영화인들과 함께 호흡했기에 한번도 영화와 멀어졌던 적은 없었다. 지인들이 기억하는 김용태 감독은 한마디로 열정과 진심,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박찬욱 감독과 함께 당시 영화과가 없던 서강대에서 서강영화공동체를 발기하여 후배들과 함께 공부했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동시에 따뜻한,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선배였다. 그의 가능성은 꺾인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피어나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단 한편의 작품으로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든 한편, 수많은 가능성들을 키워낸 영원한 가능성의 상징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와 게임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던 영화의 정신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누가 감히 이 꽃이 채 피지 못했다 하겠는가. 그를 떠나보내는 건 아쉽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한 가능성에서 지워지지 않을 시금석이 된 그를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