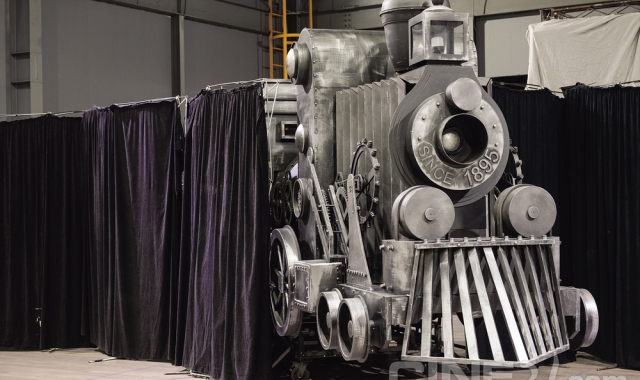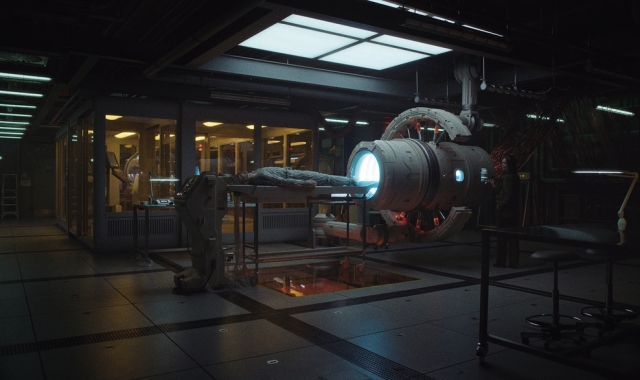1930년대, 소녀, 기숙사 미스터리. 세 가지 키워드로 어떤 상상을 하든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이하<경성학교>)은 그 예상을 비껴간다. 1938년. 산속에 자리한 요양학교에 폐병을 앓는 주란(박보영)이 전학을 온다. 엄격한 교칙과 동급생들의 냉대에 주눅들어 있던 주란은 급장 연덕(박소담)과 가깝게 지내게 된다. 학교에 적응해가던 주란은 어느 날부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도쿄 유학을 꿈꾸며 학생들은 우수 학생이 되기 위해 애쓴다. 뜻밖에도 전학생 주란이 우등생인 연덕과 유카(공예지)를 제치고 우수 학생으로 선발된다. 소녀를 중심에 놓은 호러영화로서의 무드를 착실히 쌓아오던 <경성학교>는 이때부터 기이한 탈주를 시작한다.
<행잉록에서의 소풍>(1975), <캐리>(1976), <서스페리아>(1977) 등 1970년대의 대표적인 고전 호러영화들,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신카이 마코토 유의 장르물이나 ‘소녀병기’를 소재로 삼은 일본 SF 등 <경성학교>에는 다종다양한 레퍼런스가 넘친다. 주란이 각혈을 하거나 지도교사가 주란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는 장면 등은 <캐리>를 명백하게 연상시킨다. 주어진 설정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징들도 빠짐없이 놓여 있다. 기숙학교의 소녀들답게 주란과 연덕의 화학작용에서 생겨나는 섹슈얼리티도 선명하다. 하지만 어느 지점부터 영화는 클리셰의 대로를 벗어나 샛길로 마구 내달리기 시작한다. 탈주 중 발이 엉켜 쓰러지거나 분명한 함정을 대강 건너뛰어버리는 지점도 존재하지만 영화는 익숙한 상징과 레퍼런스들 위에 묘한 오리지널리티를 피워내는 데 성공한다. 운동장을 달리는 소녀의 이미지, 다국적 언어의 혼재 등 이해영 감독만의 뉘앙스도 선연하다.
<페스티발>(2010)에서처럼 <경성학교>에서도 엄지원의 철두철미한 매력이 잘 드러난다. 다만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교장 캐릭터가 퇴장하는 지점과 방식은 어정쩡하다. 박보영의 새로운 시도만큼은 인상적이지만 의도한 만큼의 에너지를 전달하기엔 역부족이다. 캐릭터가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점도 흥미를 떨어뜨린다. 일본군 장교 켄지를 연기한 심희섭과 키히라 역의 주보비 등 보조 인물들도 제 역할을 다한다. 무엇보다 노련한 배우들의 파워에 밀리지 않는 신인 박소담과 공예지의 호연이 놀랍다. 소녀들이 멀리뛰기를 하는 운동장 장면, 도약하는 공예지의 모습은 이해영 감독의 모든 영화에 등장하는 소녀들 중 단연 힘있고 어여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