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 디스패치>는 20세기 초 프랑스에 위치한 가상의 도시 블라제를 배경으로 하지만, 영화에 영감을 준 실제 매체와 저널리스트들이 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고등학교 때부터 <뉴요커>를 즐겨 읽으며 잡지가 인도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웨스 앤더슨이 사랑했던 <뉴요커>와 멋진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타국의 문화(특히 프랑스)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프렌치 디스패치>는 잡지 제작 시스템과 당시 시대상을 이해할 때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헤밍웨이, 샐린저, 하루키가 글을 쓰는 잡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앤드리아 삭스(앤 해서웨이)가 궁극적으로 입사하고 싶었던 곳 역시 <뉴요커>였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뉴요커>는 1925년 창간 이래 매해 47권의 잡지를 만드는 미국의 주간지다. 처음엔 맨해튼을 중심으로 한 15센트짜리 만화 잡지로 시작했고, 지금도 사진이 아닌 삽화로 커버를 장식하는 것이 100년 가까이 지켜온 전통이다. ‘뉴요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뉴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뉴욕 맨해튼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면 전세계를 알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매체다. 개성 강한 문화 크리틱과 유머 넘치는 에세이, 르포르타주, 당대 최고 작가들의 단편소설 등을 선보이며 미국에서는 <뉴요커>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지성인으로 대우받는다. 그동안 어니스트 헤밍웨이,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트루먼 카포티, 필립 로스, 무라카미 하루키 등 유수의 작가들이 <뉴요커>에 글을 실었다.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며 전설적인 매거진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뉴요커>의 공동 창간자이자 매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장본인 해럴드 로스 그리고 그의 승계자 윌리엄 숀의 힘이 컸다. 이들은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빌 머리가 연기한 아서 하위처 주니어 편집장의 캐릭터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해럴드 로스는 26년간 무려 1399권의 잡지를 만든 열정으로 유명하다. 그를 포함한 많은 작가들에게 바치는 헌정을 <프렌치 디스패치>의 엔딩 크레딧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68혁명을 닮은 ‘선언문 수정’

정치와 섹스에 대한 자유를 외치는 젊은이들, 옅은 콧수염에 폭탄 맞은 듯한 머리를 한 남자, 짧은 머리를 하고 바이크를 타는 여자, 결정적으로 프랑스의 60년대. ‘정치와 시’ 섹션의 특종 기사 ‘선언문 수정’ 에피소드를 보며 프랑스 68혁명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제피렐리는 낭테르대학(현 파리 10대학)에서 연설하며 혁명을 이끌었던 다니엘 콘벤디트에서 영감을 얻었다. 영화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집회는 남자가 여자 기숙사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은 부조리하다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됐다. 이에 파리 당국이 학교를 임시 폐교하자 청년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지사를 습격하는 등 거리로 뛰쳐나갔고, 68혁명은 섹스와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판과 노동운동으로 확장되며 대대적인 사회변혁 운동으로 번졌다. 당시 파리 남부에 있는 몽파르나스에서 청년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68년 5월의 사건에 대한 글을 썼던 <뉴요커>의 마비스 갤런트는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연기한 루신다 크레멘츠에게 영감을 줬다.
예술 작품으로 갑부가 된 전설의 미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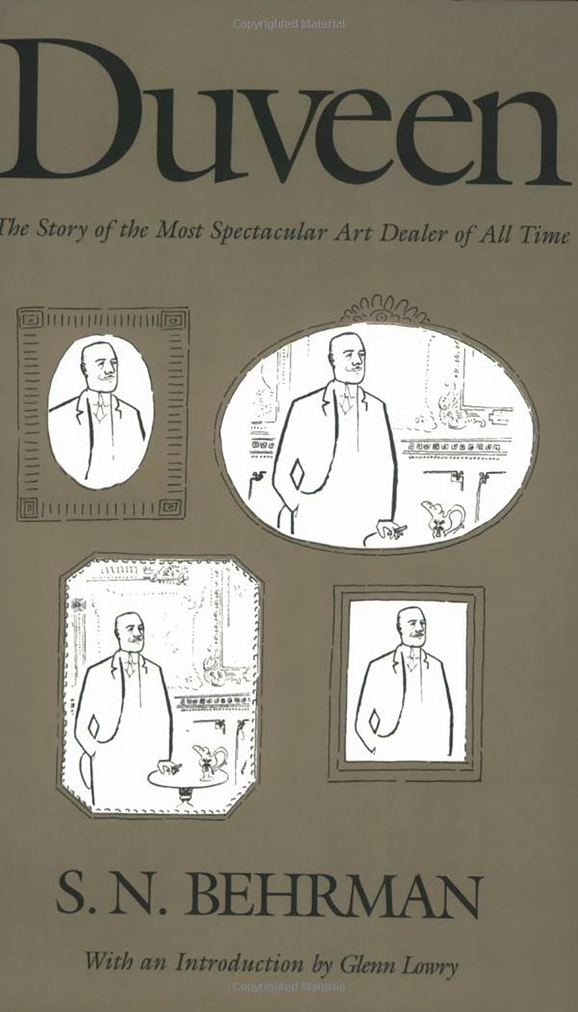
영화에 등장하는 4가지 특종 기사는 웨스 앤더슨이 사랑했던 <뉴요커>의 실제 기사에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이중 ‘예술과 예술가들’ 섹션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걸작’ 에피소드는 미술품 수집가 조셉 두빈에 관한 S. N. 베어먼의 기사에서 출발했다. 조셉 두빈은 젊은 시절부터 대담한 거래를 했던 미술상이다. 그는 몰락하는 유럽 귀족들로부터 예술 작품을 산 뒤 미국의 부자들에게 팔아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고, 테이트 갤러리와 대영박물관에 건물을 기증했다. 극작가와 영화 시나리오작가로도 유명한 S. N. 베어먼은 <뉴요커>에 조셉 두빈에 관한 칼럼을 연재했고, 글을 모아 <두빈>이란 제목의 전기를 따로 출간하기도 했다. ‘콘크리트 걸작’에는 에밀 드 안토니오의 다큐멘터리 <화가의 그림>이나 영화 <뉴욕스토리>에서 마틴 스코세이지가 단편 연출한 <인생 수업>도 영향을 미쳤다.
제임스 볼드윈과 A. J. 리블링
‘맛과 냄새’ 섹션의 기사 ‘경찰서장의 전용 식당’에는 해외파 기자와 낯선 땅에서 살고 일하는 동양인 셰프가 보여주는 감정적 연대 그리고 날카로운 풍자가 녹아 있다. 해당 특종을 담당한 로벅 라이트는 제임스 볼드윈, A. J. 리블링을 섞어 탄생시킨 캐릭터다. 흑인이자 게이였던 제임스 볼드윈은 차별의 고통과 정체성 혼란은 물론 뜨겁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생존했던 자신의 삶을 생생하게 담은 자전적 소설 및 에세이를 발표했던 작가다. 영화 <아이 엠 낫 유어 니그로>가 제임스 볼드윈에 관한 다큐멘터리이며, 그가 70년대에 발표한 소설 <빌 스트리트가 말할 수 있다면>은 최근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제임스 볼드윈은 미국에서 프랑스로 넘어가 여러 예술가와 교류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중 볼드윈 자신이 호텔에서 이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며칠 동안 수감됐던 이야기를 담은 <파리의 평등>(Equal in paris)이 <프렌치 디스패치>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 로벅 라이트의 유머러스한 풍자는 A. J. 리블링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리블링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보장된다”, “사회에서 언론의 기능은 알리는 것이지만, 그들의 역할은 돈을 버는 것이다” 등등 지금까지 회자되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저널리스트다.






